등록 : 2005.07.14 16:31
수정 : 2005.07.15 0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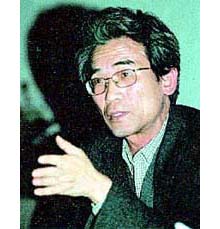 |
|
김종철/ 녹색평론 편집/ 발행인
|
한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그 때문에 사랍답게 살 수 없게 됐다
우리 삶터는 전쟁터로 변했다. 끝없이 이기심을 자극하는 경제성장 논리 활개친다
삶의 행복이란 사람사이 어울림에 있다는 지혜에서 갈수록 멀어진다
최근에 나온 <대화-한 지식인의 삶과 사상>은 리영희 선생이 자신의 인생역정을 평론가 임헌영 씨의 도움을 받아 회고하고 있는 흥미로운 구술기록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반독재,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온 이 뛰어나게 양심적인 지식인의 회상록 속에서 우리는 한 시대에 대한 귀중한 역사적 증언 이외에 리영희 선생 개인의 신상에 관한 허심탄회한 술회를 풍부하게 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그가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했던 여러 벗들을 언급할 때마다 고(故) 장일순 선생에 대한 깊은 흠모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퍽 인상적이다. 그는 장일순 선생이 한마디로 자신의 아호(雅號)처럼 무위의 삶을 실천하신 분이며, 애증을 초월한 너그러운 아량과 밑바닥 사람들에 대한 헌신과 보살핌에 있어서 “옛 성현들의 원리를 터득한” 분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리영희 선생은 자신이 장일순 선생을 “벗으로서 사귀게 된 것을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고까지 생각한다.
나는 운 좋게도 그 장일순 선생을 생전에 잠시나마 뵌 적이 있다. 이미 그때는 선생이 위중한 병으로 요양 중이었음에도 한나절이나 많은 자상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를 회상하면 나는 지금도 행복해진다. 선생의 생전의 육성이 담긴 녹음기록을 정리해서 펴낸 <나락 한알 속의 우주>라는 책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히 좋아하는 것은 선생의 조부님에 관한 이야기다.
선생의 조부님은 일찍이 젊은 시절 “당나귀 한 마리를 사서” 원주와 서울을 왕래하며 장사를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나중에 돈을 꽤 모아 땅도 좀 마련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학교를 짓는 데 기부도 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었다. 근검절약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던 이 조부님에게 특기할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몹시 중하게 여기셨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돈을 꿔간 사람이 갚지 않을 경우에도, 절대로 채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조부님의 말씀으로는, 빚을 갚지 않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거나 돈이 있어도 갚을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갚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하면 돈은 받지도 못하면서 “사람만 잃게 되고,” 갚을 마음은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을 채근하면 “그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빚 독촉 같은 “슬기롭지 못한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자손에게 가르쳤다는 것이다.
나는 처음 이 이야기에 접했을 때, 내심 무척 놀랐다. 이런 비상한 지혜가 이름없는 시골 범부의 것이라고는 얼른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게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라(無住相布施)”는 금강경의 가르침보다도 더 감명적이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아끼는 게 제일이라는 이 윤리적인 이야기는 좀더 구체적인 사람 냄새가 나면서도 극히 과학적인 논리이기도 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보면, 이 ‘구체적 과학성’에 기초한 윤리는 실제로 오래 밑바닥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어온 체험 속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은 시골장터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범부’에게나 가능하지 소위 출세한 엘리트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지혜라고 해야 옳을지 모른다.
따지고 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이러한 생활의 지혜는 그다지 예외적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오래된 공동체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온 민중적 지혜의 반영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전통적 민중문화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언제나 사람 사이의 ‘관계’였기 때문이다. 상부상조와 협동이라는 인간관계는 어디서나 건강한 풀뿌리 민중생활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원리였다. 오랜 세월 권력에 의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호혜적 관계의 그물 때문이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고아들과 버림받은 아이들을 돌보며 살아온 스위스 여성이 있다. 마가레트 닝게토라는 이 여성이 한국에서 살게 된 것은 1970년대에 처음 서울을 방문했을 때 “아이스크림 하나를 어린이 열명이 나눠먹는다는, 서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을 판자촌에서 보고 너무도 큰 감명을 받은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 충청도의 한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에게 한국은 더 이상 “가난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눠먹던” 그때의 한국이 아니다. 그는 지금과 같았으면 자기가 한국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그가 보기에 한국은 “자기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빠진,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사회로 변해버렸다. 지난 5월 5일치 <한겨레>에 실린 이 기사는 우리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한다.
한국이 그동안 놀랄 만한 경제발전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음을 의심해온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사회는 바로 그 경제적 발전의 결과, 도리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실제로 총탄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이지 우리의 삶터가 전쟁터로 변한 지는 오래되었다.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경제적 발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끝없이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경제성장 논리가 활개치는 상황에서, 삶의 행복이란 원래 사람 사이의 어울림, 우정에 있다는 옛 사람들의 지혜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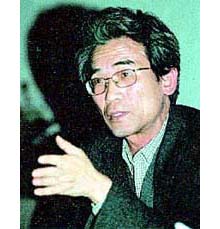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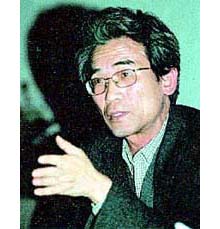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