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8 17:37
수정 : 2005.07.28 17:41
인터뷰/ ‘제노사이드’ 지은 최호근 교수
“인종이나 종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제노스(genos)’와 살인을 뜻하는 라틴어 ‘사이드(cide)’를 합해 유대인 학자 라파엘 렘킨(1900~59)이 1944년 처음 제안한 합성어 ‘제노사이드(집단학살)’는 20세기에 등장한 국가 중심의 신종 범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살에만 그런 잔혹한 제노사이드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에서도 제노사이드의 범죄조건에 해당하는 흔적들은 발견됩니다.”
최근 종족을 절멸시키고자 했던 세계사의 제노사이드 범죄 사례들과 그 논쟁적 개념을 찬찬히 다룬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책세상 펴냄)의 저자 최호근 부산교육대 연구교수(39·서양사학)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우리의 동족상잔 역사도 제노사이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 책에서 제주 4·3과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을 한국의 제노사이드 사례로 다뤘다. “제주 4·3은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 ‘인간 같지 않은 존재’라는 이미지로 만들고 무차별 절멸시키고자 군경과 관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섰던 제노사이드였습니다.”
그가 제주 4·3과 보도연맹원 사건을 세계적인 반인도 범죄인 ‘제노사이드’의 반열에 올려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제노사이드의 범죄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는 국제 인권단체·학계의 목소리와 무관하지 않다. 또 제노사이드를 나치의 ‘홀로코스트’ 정도로 ‘강 건너 불 보듯’ 여겨왔을 뿐, 정작 우리가 뼈아프게 겪은 비극의 세계사적 의미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국내 지식인들의 현대사 재해석 움직임의 연장선에 서 있다. 역사·사회·정치학 등 분야 학자들이 참여한 ‘제노사이드연구회’가 국내에서도 지난해 생겨나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사건들을 국가
 |
|
최호근 교수의 제노사이드
|
중심의 ‘정치적 학살’ 또는 ‘제노사이드’로 재조명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식민지시대 이후에 나타나는 제노사이드 범죄의 개념을 수정하려는 작업이 국제사회에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1948년 유엔은 제노사이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엔 ‘국민·인종·민족·종교 집단 전체 또는 부분을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된 행위’만을 제노사이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세계 분쟁지역들에서 벌어지는 국가 내, 민족 내, 종교 내 학살은 ‘내정의 문제’일 뿐입니다. 제주 4·3도 반인도적 제노사이드 범죄가 되지 않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강경한 제노사이드’뿐 아니라 ‘부드러운 제노사이드’도 범죄로 규정해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제노사이드의 개념이 좀더 확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집단의 구성원 전체에 대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물리적 절멸을 시도하는 강경한 제노사이드를 포함하면서도, 한 집단의 존재 기반 자체를 ‘서서히’ 와해시키는 방식의 ‘부드러운 절멸’의 사례도 신종 제노사이드로 포함돼야 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노사이드 기술이 21세기에 더욱 더 자주 등장하는 수법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확장된 개념을 따르면, 집단학살이나 강제 불임시술, 강제수용소 이주, 식량배급 차별 등 ‘씨를 말리는’ 강압정책 외에도 창씨개명이나, 모국어 사용 금지, 민족종교 탄압 등도 제노사이드에 포함된다.
국내에서는 제노사이드가 아직 생소하고 관심도 끌지 못한다. 우리 정부는 한국전쟁 중인 1950년에 제노사이드 협약에 가입했으나, 아직 후속 시행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또 학계에선 제주 4·3과 보도연맹원 사건은 물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도 제노사이드의 사례로 재조명하려는 해석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유엔 협약의 문구 해석을 따라 국내에 제노사이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공식입장을 택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런 양쪽의 시각을 유연하게 풀어 논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게 이 책의 집필 동기였다”며 “우리나라의 역사 비극이 세계사 차원에서 이해되고 논의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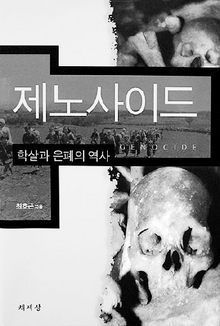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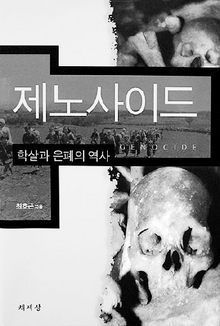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