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8.11 16:41
수정 : 2005.08.11 16:47
빛나는 4월이 가져온 전후 최대 문제작
<광장> (최인훈, 정향사, 1961)
최인훈은 ‘전후 최고의 작가’, <광장>은 ‘전후 최대의 문제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 작품은 <새벽> 10월호에 실린 원고지 600장 분량의 중편이었지만, 작가는 나중에 200여장을 덧붙여 장편으로 개작했다. 1961년 정향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뒤 신구문화사, 민음사, 문학과지성사로 거처를 옮겼다. 다섯 번에 걸쳐 문장을 가다듬었고, 1973년에는 김소운 번역으로 일어판이 출간되었다. 문학지성사판은 1997년에 100쇄를 돌파했다. ‘작가의 말’에서 밝힌 것처럼 이 작품은 “저 빛나는 사월이 가져온” 작가적 상상력의 자유로 빚어졌다. 철학도 이명준이 해방 직후 자진 월북하고, 전쟁포로가 된 후 중립국을 택하다 바다에 투신자살한다는 설정은 당시 독서계에 충격적이었다.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강박을 일거에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1960년대 문학의 한 사건이었다.
농촌떠나 도시로 온 호스티스 경아
<별들의 고향> (최인호, 예문관, 1973)
1970년대 초반, 문단에서는 이상한 풍문이 떠돌았다.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서운 신예작가가 한 명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의 정체는 곧 밝혀졌다. 첫 번째 장편소설 <별들의 고향>으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최인호였다. 그의 나이 고작 스물일곱 살이었다. <별들의 고향>은 1973년 출간 뒤 3년 만에 40여만 부가 팔렸다. 전대미문의 기록이었다. 셋방살이를 하던 작가는 영동에 2층 양옥을 사들였다. ‘글쟁이는 가난하다’는 통념이 깨졌다. 1974년 최인호가 시나리오를 쓴 이장호 감독의 영화 <별들의 고향>은 그해 서울 개봉관에서만 관객 46만 명을 동원했다. 소설의 주인공 경아는 농촌을 떠나 비정한 도시로 몰려든 ‘시대의 여성’을 상징했다. 여성 독자들은 경아와 자신을 동일시했고 남들에게 뒤질세라 경아를 자신의 가명으로 내세웠다. 이 소설은 우리 문단에 ‘호스티스 문학’이라는 신종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시와 대중의 거리 좁힌 민중시의 전형
<농무> (신경림, 월간문학사, 1973)
<농무>의 시작은 초라했다. 초판은 1973년 초 월간문학사에서 나왔다. 고작 300부를, 그것도 무허가 출판사에서 자비로 펴낸 것이었다. 이 시집의 가치가 발견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듬해 신경림은 제1회 만해문학상을 거머쥐었다. 그 다음해 1975년에는 창작과비평사의 ‘창비시선’ 첫 번째 권으로 증보판이 나왔다. 민족문학의 나아갈 길을 미리 가늠하는 하나의 척도가 된 셈이었다. 문학평론가 백낙청은 이 시집의 미덕으로 “단편소설과 같은 정확한 묘사와 압축된 사연들, 민요를 방불케 하는 친숙한 가락”을 꼽았다. 이 시집에는 난장 뒤의 파장에 가까운 농촌의 세목이 생생하고, 농민적 감수성에 뿌리를 둔 전통적 운율이 살아 있다. 한마디로 민중시의 한 전형을 제시한 것이었다. 1960년대까지 한국 시단을 지배했던 모더니즘 계열의 난해시에서 벗어나 시와 현실, 시와 대중 사이의 거리를 좁힌 것도 이 시집의 공이었다.
냉전의 우상을 이성으로 허물다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창작과비평사, 1974)
리영희는 유신시대와 불화한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 그는 박정희 정권 때 두 번 구속되고, 언론사와 대학에서 해직당했다. <우상과 이성>(1977), <8억인과의 대화>(1977)는 금서 목록에 올랐다. <전환시대의 논리>는 사회비평적 에세이의 전범이었다. 서슬 퍼렇던 냉전의 논리를 이성과 진실의 언어로 뒤집음으로써 한 시대의 정신에 깊고 넓은 영향을 끼쳤다. 한 지식인은 “냉전시대의 기이한 신화·우상·권위에 메스를 가하고 그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적 현실과 자신의 삶을 근저에서부터 고민하게 했던 책”이라고 평했다. 이 책은 발간 후 2년 만에 13쇄를 찍었다. 사회과학 도서로는 경이적인 판매고였다. 이 책은 1980년대 들어와서야 뒤늦게 금서가 되었다. 공안검사가 시위현장에서 연행된 대학생들을 심문할 때 너나없이 이 책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털어놓자 정확한 수사를 위해 단체로 이 책을 주문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전환시대의 논리>는 ‘시대의 양심’이었지만, 체제측에는 ‘의식화의 원흉’이었다.
난쟁이 가족은 일그러진 70년대 자화상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문학과지성사, 1978)
일명 ‘난쏘공’으로 인구에 회자하는 이 작품은 스테디셀러의 대명사이자 현대판 고전으로 손꼽힌다. 1978년 초판이 나온 이후 대학가에서 사회과학도들에게 먼저 손때를 타기 시작했다. 80년대에는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다. 2000년 7월에는 출판사를 옮겨 150쇄를 돌파했다. 그때까지 60여만 부가 나갔다고 한다. 밀리언셀러가 흔한 세상에서 뜻밖의 판매부수이지만,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어 살아남았다는 점에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 작가는 훗날 가만히 있기에는 너무나 긴급한 당시 시대 분위기가 이 책을 쓰게 했다고 증언했다. 당시는 압축성장의 그늘에서 뿌리 뽑힌 자들이 생존의 경계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무허가 판자촌에서 몰락해가는 난장이 가족들은 1970년대의 일그러진 초상화였다. 독자들은 이 작품에서 자신의 시대와 역사의 비극을 읽어갔다. 환상적인 세계와 비의적인 문체는 독자들에게 폭넓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비결이기도 했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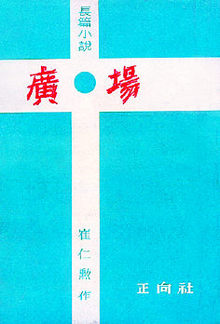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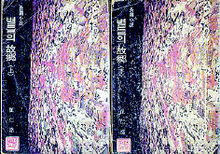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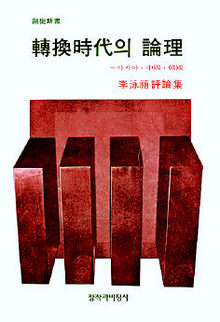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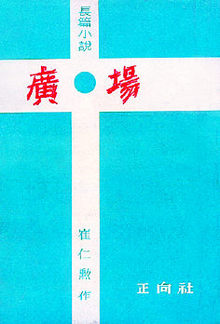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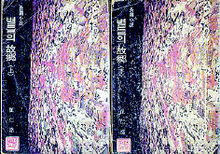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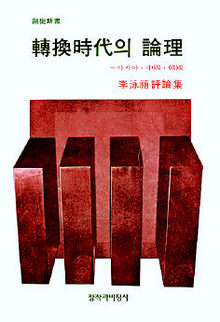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