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9.29 19:18
수정 : 2005.09.30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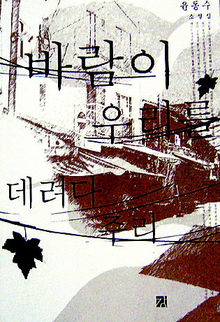 |
|
윤동수 첫 소설집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리>
|
1990년 계간 <사상문예운동>에 중편 <새벽길>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윤동수(45)씨가 그로부터 15년 만에 첫 소설집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주리>(강)를 묶어 냈다.
윤동수씨는 이번 책에 발문을 쓴 친구 안재성씨나 방현석씨, 김한수씨 등과 함께 ‘노동소설’로 한 시대를 풍미한 작가에 속한다. 그의 등단 연도는 비록 90년대에 턱걸이를 했지만 그의 습작과 작가 수업은 온전히 80년대에 속한다고 해야 옳았다. 그런 의미에서 90년대 이후 펼쳐진 그의 소설세계를 ‘80년대적’이라 할 수도 있겠다. 책의 후기에서 작가 자신 “작품을 썼다 하면 80년대로 돌아가는데 참 갑갑했다”면서도 이제는 “비로소 그 시절이 힘이 된다”고 고백하는 데에 그 나름의 진정성이 깃들어 있음이다.
이란 감독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에서 제목을 빌려온 표제작은 작가 윤동수의 어제와 오늘을 두루 담은 ‘자전적’ 소설로 읽힌다. 소설은 작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시골 움막집에 틀어박혀 있는 소설가 ‘나’에게 어느 날 문득 예전에 알았던 노동자가 찾아와 “소설 한 편 써주셔야겠소”라고 명령에 가까운 부탁을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노동자의 주문인즉 현재 집을 나가 단란주점에서 일하고 있는 아내의 마음을 돌릴 길은 소설로써 예전의 행복했던 시절을 되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다. ‘나’는 “소설은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텔레비전이 아니오”라며 거절한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소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노동자라고 그 말을 듣고 물러서지는 않아서 “소설은 왜 쓰쇼?”라는 힐난이 몸싸움으로 이어지는데, 밑에 깔린 소설가의 “나라고 왜 안 쓰고 싶겠어?”라는 외침은 고스란히 작가 자신의 ‘비명’으로 다가온다. 그 비명은 그러나 ‘써지지 않는다’는 절망만이 아니라 ‘쓰고 싶고 써야 한다’는 의지를 함께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설집은 그 비명의 승화인 셈인데, <내 안에 든 짐승> <바람 속의 거미집> <깊은 샘> <불에 구운 영혼> 등이 80년대 (노동)운동의 체험을 다양하게 변주했다면, <식욕식당>과 <개꾼>은 시골 소읍을 무대로 민중의 건강한 생명력을 해학적인 어투에 담은 작품들이다. 최재봉 기자 bong@hani.co.k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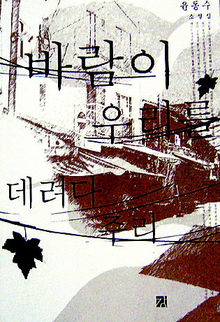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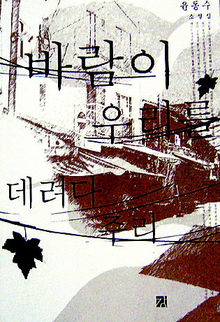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