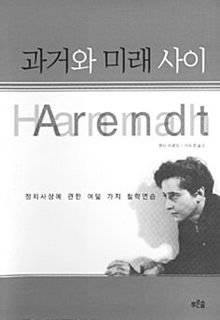 |
|
과거와 미래 사이
한나 아렌트 지음. 서유경 옮김. 푸른숲 펴냄. 2만4000원 |
정치인의 거짓말은 왜 당연한 것이 됐나
자유·문화란 도대체 무엇인가
전통과 역사, 권위, 진리는 어떤 실체로 남았나
근대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답하다
“우리의 유산은 유서 없이 우리에게 남겨졌다,”
1940년대 프랑스 레지스탕스 단원이 남겼다는 이 말은 갑작스런 프랑스공화국 전통의 붕괴 뒤에 새로운 사유의 틀을 찾지 못한 서구 지식인의 정신적 방황을 드러낸다. 잊혀진 이 경구는 유대인, 망명자, 여성으로서 독특한 20세기 정치철학을 개척했던 한나 아렌트(1906~1975)의 역저 <과거와 미래 사이>(푸른숲 펴냄)에서 첫 글의 첫 문장에 인용됐다.
아렌트는 정치철학자로서 이 경구에 진지하게 귀기울이며 ‘잃어버린 전통과 완성하지 못한 근대’를 반성하는 철학적 사유를 이 책에서 보여준다. 우리한테 유산은 남겨졌으나 거기에 담긴 ‘보물’의 이름은 알지 못하니, 아니 기억하지 못하니, 오늘의 상속자가 느끼는 당혹은 당연하지 않을까. “과거가 미래를 비추기를 중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르네 샤르, 14쪽).
아렌트의 물음은 근본적이다. 우리에게 전통과 역사, 권위, 자유, 문화, 진리,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떤 실체로 남아 있는가? 그 보물은 ‘신기루’나 ‘허깨비’가 아닐까.
1954년에 처음 출간돼 지금도 세계 여러 언어권에서 널리 읽히는 이 책은 이처럼 전통이란 무엇이고 근대란 무엇인지부터 되물으며 오늘의 시민·정치 영역에서 주요한 담론을 이끄는 개념들의 본래 의미를 추스리고 있다. 또 이런 말들의 기원조차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삶을 이끌어가는 근대 정치철학의 당혹스런 위기상황을 사유의 깊숙한 심연에서 끄집어낸다.
과거에서 불려오는 ‘철학연습’
여덟 장으로 이뤄진 이 책은 아렌트가 스스로 표현했듯이, 전통과 근대, 역사, 권위, 자유, 교육, 문화, 진리와 정치,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해 그가 벌이는 “철학연습”이다. 아스라하게 기억 저편으로 잊혀져버린 이런 핵심개념들의 기원을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사상사를 통해 발굴해내어 그것의 현재적 쓰임새를 다시 생각한다.
‘과거에서 불러오기’라는 아렌트의 기획은 왜 필요했을까? 그것은 당당하게 출현한 근대사회가 20세기에도 여전히 철학과 사유의 위기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근대사회의 위기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과거와 미래 사이’에 낀 우리의 모습, 곧 새로운 사유의 연습과 철학 없이 옛 전통과 권위의 단절을 경험했던 우리가 느껴야 하는 당혹과 혼란이다. “보물의 상실이라는 비극은…파괴했을 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보물을 계승하고 문제시하고 숙고하고 기억하는 정신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작되었다.“(13쪽)
아렌트가 보기에, 서구 정치사상의 전통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시작됐으며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확실히 종결됐다. 정치사상의 전통은 ‘플라톤의 이데아’가 그랬듯이 정치(활동적 삶)보다는 철학(관조적 삶)을 더 높은 자리에 둔 데에서 비롯했으나, 마르크스에 이르러 사유와 행위, 관조와 노동, 철학과 정치의 전통적 지위는 뒤바뀌었고 그것은 ‘전통의 단절’이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아렌트는 “20세기의 도식적이고 강제적인 사유“가 등장한 것은, 전통의 활력과 기억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 낡아빠진 개념과 범주의 영향력”만이 전제화했기 때문이라고 바라본다.(41쪽) 전통은 혁명가의 선언을 통해 부정됐으나 새 세계에 걸맞는 사유의 틀을 갖추지 못한 우리의 정신은 활력 없고 낡음만이 남은 전통의 틀에 갖혀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뼈대일 듯하다. 마르크스는 “전통을 전통의 틀 내에서 뒤집었기 때문에 플라톤의 이데아를 실제로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59쪽)
 |
|
근대는 철학적 진리가 우위를 차지하는 오랜 전통과 단절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나, 전통은 잃어버리고 새로운 사유의 틀은 찾지 못해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나 아렌트는 진단했다. 사진은 1930년대를 배경으로 한 채플린 영화 <모던 타임즈>의 한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