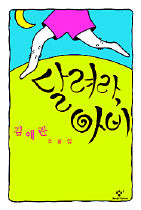 |
|
김애란 소설 <달려라, 아비>
|
어느날 사라지고 있어도 무능한 또다시 사라지거나 죽어 돌아오는… 때론 풋풋하게 때론 노련하게 20대 작가, 아버지를 거듭 말하다
김애란(25)씨의 소설집 <달려라, 아비>(창비)는 하나의 징후 혹은 이정표와도 같다. 이 작고 귀여운 책은 바야흐로 80년대산 작가의 탄생을 보고하고 있음이다. 어느덧 문단의 중심으로 진입한 70년대산들의 뒤를 이어 80년대산 작가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김애란씨는 그 선두에서 달리고 있는 셈이다. 광주학살이 저질러진 해에 태어난 이 신예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를 졸업했다. 2002년 대산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회 대산대학문학상 소설부문을 수상했고, 수상작인 단편 <노크하지 않는 집>이 이듬해 봄호 <창작과 비평>에 실리면서 정식으로 등단했다. 첫 소설집을 펴낸 직후인 24일 최연소 기록으로 제38회 한국일보문학상을 받음으로써 겹의 기쁨을 맛보았다. 3년 동안 발표한 단편 아홉을 묶은 소설집은 젊은 작가의 풋풋함과 뜻밖의(?) 노련함을 아울러 보여준다. 등단작과 <나는 편의점에 간다>가 2003년에 나온 ‘초기작’들인 셈인데, 이 두 작품에서 작가는 현대적 삶의 획일성과 비인간성을 고발하며 인간적 온기의 회복을 염원한다. 등단작은 화장실을 함께 쓰는 다섯 여자가 서로에게 철저히 타인이자 익명으로 남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끔찍할 정도로 닮은꼴의 삶을 영위하는 모습을 폭로한다. “하나의 오차도 없이 징그럽게 똑같은 네 여자(=사실은 화자 자신을 포함해 다섯 여자)의 방”(242쪽)이라는 구절은 <나는 편의점에 간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년에 의해 이렇게 변주된다: “손님, 죄송하지만 삼다수나 디스는 어느 분이나 사가시는데요.”(51쪽) 청년이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주인공 ‘나’가 늘 같은 종류의 생수와 담배를 사간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별성을 주장하려는 데에 청년 자신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나’가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기 위한 증거로 제시하는 것들이 거꾸로 획일성과 익명성의 우군이 된다는 사실은 쓰라린 역설이다. 삶의 획일성 속에서 ‘나’를 찾다
 |
|
김애란 소설 <달려라, 아비>
|
그런 점에서 <누가 해변에서 함부로 불꽃놀이를 하는가>는 시사적이다. 소설 주인공인 아이는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묻는다: “아버지, 나는 어떻게 태어났나요?”(170쪽)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다른 버전으로 대답하지만, 그것들 중 그 어느 것도 진실로 믿을 만하지는 않다. 복어국을 먹고 잠들면 죽게 된다는 말에 속아 졸음을 쫓고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재촉했던 아이는 끝내 잠에 빠져 들면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놓치고 만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죽게 되는가. 아니, 죽는 것은 ‘아버지’이고 아이는 이야기꾼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는 스스로 이야기하려 한다.”(190쪽) 아버지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이가 이야기꾼으로 재탄생한다는 설정은 상징적이다. 모호한 대로 ‘작가 김애란’의 탄생 설화로 읽을 만한 부분이다. 첫 소설집을 손에 든 작가는 “독자들이 ‘내’ 책을 한 장 한 장 손으로 넘겨 가며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책읽는 일이 참 에로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도 말했다. “새로운 소설보다는 좋은 소설을 쓰고 싶다. 진정 새로운 건 문학이 아니라 인간이 아닐까. 수천 년 간 고민의 대상이 돼 왔음에도 여전히 새로운 매혹과 상처를 낳는다는 점에서 말이다.” 80년대산 작가의 선두주자로 때로 어색하거나 치기어린 대목이 없지 않지만, 만만찮은 내공을 엿보게 하는 문장들이 그것을 너끈히 상쇄한다. 예컨대 이런 문장들: “모든 부드러움에는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잔인함이 있다.”(40쪽) 또는 “세계의 소란스러움을 등지고 가로등 아래서 홀로 스카이 콩콩을 타는 나의 모습은 고독하고, 또 우아했다. 스카이 콩콩을 타는 나의 운동 안에는 뭐랄까, 어떤 ‘정신’이 들어 있었다.”(65쪽) 특히 <스카이 콩콩>에서 주인공 소년이 느끼는 모종의 페이소스는 순수에서 경험으로 넘어가는 무렵의 박민규 소설 주인공들을 떠오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글 최재봉 문학전문기자 bong@hani.co.kr, 사진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