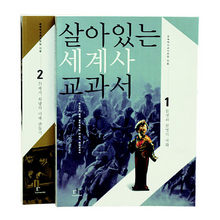 |
|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1·2>전국역사교사모임 지음. 휴머니스트 펴냄
|
한겨레가 전문가와 함께뽑은 2005 올해의 책 50
한국·아시아·여성의 눈으로 읽은 세계사 중고등학교의 세계사 교육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일이 그렇듯, 여기에도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 대표적인 외적인 요인이란 세계사가 독립 교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계사는 사회과의 10개 과목과 함께 선택 과목에 포함되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암기해야 할 낯선 이름으로 가득 찬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계사는 다른 과목에 비해 선택 비율이 극히 낮다. 그 결과 요즈음의 많은 고등학생들은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에 있는지, 제1차 세계대전이 몇 세기에 일어났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세계화의 시대에 다른 나라의 역사에 관한 무관심의 대가를 머지않아 톡톡히 치르게 되리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물론 그 책임을 외적 요인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세계사와 관련된 전공 분야의 학자들이 세계사 교과서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쓰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내적 요인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주도로 발간된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들과 직접 마주치는 교사들이 3년 6개월에 걸쳐 논의를 거듭하며 세계사 교육의 부실을 넘어서기 위해 기존 교과서의 결함과 단점을 넘어서려는 꿈을 실현시킨 것이다. 두 권으로 엮어진 이 책에서 집필진이 시종 유지하려는 관점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서구를 중심으로 역사를 보는 방식을 넘어서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결과는 기존의 세계사 교과서에서 거의 생략되었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문명권의 역사에 더 많은 공간이 배분되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세계사를 서술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은 역사 속에서 소외되었던 여성들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삶을 부각시키는 한편, 과학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환경과 생태의 파괴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공존과 연대에 기반을 둔 삶의 방식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세 번째는 세계사의 흐름을 한국의 역사와 관련지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의 역사가 세계사에서 더 큰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근대 이후 세계 질서의 변화에 기존의 교과서보다 더 큰 무게가 실렸다. 바꾸어 말하면 이 책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집적으로 세계사를 보지 않는다. 이 책에는 세계 속의 한국 국민으로서 평화공존하면서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세계사의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가치관이 강하게 담겨 있다. 그러한 가치관을 제대로 더 널리 전달하기 위해 집필진은 서술의 형식에도 큰 배려를 했다. 이를테면 24개에 이르는 각 단원은 쉽게 읽히는 본문과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충하는 사진, 도판, 지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을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여러 사건이나 인물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며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를 쓴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원들. 사진 휴머니스트 제공
|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이 책이 갖는 수많은 장점에 비교할 때 사소하다. 또한 집필진 역시 그러한 문제로 지속적인 고민을 하며 단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짐작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출발점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세계사에 관심을 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더 깊은 독서와 연구로 나아가게 되기 바란다. 또한 이 책이 출발점이 되어 교사들뿐 아니라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같이 참여하여 더 충실하고 더 많은 세계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게 되기 바란다. 조한욱 한국교원대학 교수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