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08 06:00
수정 : 2019.03.08 20:01
세계적인 독서가 알베르토 망겔
유럽 문학·문헌으로 호기심 탐구
금지된 것을 알려는 ‘금단의 염원’
샛길로 빠지는 것도 즐거운 여정
왜?-호기심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알베르토 망겔 지음, 김희정 옮김/위즈덤하우스·3만5000원
아이들이 부모를 미치게 하는 데는 한 글자면 충분하다. “왜?”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것에 대고 묻는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들어서게 된 이 신비로운 세상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세상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두 함축하는 한 마디다.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장이며 3만권이 넘는 장서 보유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독서가 중 한명인 알베르토 망겔은 그 “왜?”라는 질문에 다시 “왜?”라고 물었다. <왜? 호기심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는 호기심을 다룬 책이다. 소수의 승리와 수많은 실패의 순간들을 관통하는, 상상력으로 가득한 위대한 질문이 “왜?”라고 생각해서다. 호기심은 무엇이며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을까. 망겔은 독서가답게, 수많은 책들에 질문한다.
망겔은 가장 먼저 호기심이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그 뒤 우리는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어떻게 추론하는지,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나는 누구이며 언어는 무엇인지, 이 다음은 무엇일지, 종내는 무엇이 진실인지를 묻는다. 이 과정이 지극히 유럽 문학과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호기심이란 무엇인가? 1611년 간행된 <코바루비아스 스페인어 어원 사전>에 따르면 ‘쿠리오소’(curioso)는 무엇인가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쏟으면서 성실하게 다루는 사람을 뜻한다. 거기서 호기심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단어인 ‘쿠리오시다드’(curiosidad)가 유래한 것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끊임없이 왜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럴까 하고 질문하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코바루비아스는 ‘쿠리오소’에는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모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호기심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든 성실하게 다룬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그가 애써 탐구하는 대상이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고 감춰진 것들이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인데 필요 이상으로 면밀히 다룬다는 점은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개신교에서는 <성경>의 외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집회서>의 한 구절이 라틴어로 덧붙여져 있다고 한다. “자신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 밖의 것을 발견하려고 하지 말라.” 호기심은 금지된 것을 알고자 하는 금단의 염원이기도 하다.
 |
|
<신곡> 천국편 20곡에 곁들여진 조반니 디 파올로의 삽화. 정의로운 영혼들로 만들어진 독수리를 묘사했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
단테의 <신곡>,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탈무드>와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글을 통해 글을 만들어가는 망겔의 글쓰기는 독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자체가 황홀경을 제공하는 낙원과도 같다. 무려 460쪽짜리 낙원이다. 읽어도 읽어도 끝내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 단테의 <신곡>은 책 전체에서 특히 중요하게 언급되는데(망겔은 환갑이 되기 직전에야 이 책을 ‘처음’ 읽었다), 결말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흥미롭다. <신곡>의 집필을 계속하는 동안 단테는 한 번에 6곡 내지 8곡 정도를 쓴 다음 그것을 후원자에게 보냈다. 후원자가 천국편의 마지막 13곡을 제외한 <신곡> 전체를 받았을 즈음 단테가 세상을 떠났다. 몇 달에 걸쳐 단테의 아들들과 제자들은 작품이 마무리되었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단테의 서재를 뒤졌으나 찾지 못했고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아주 조금의 시간을 더 허락하지 않은 신에 대해 격분했다.” 어느날 밤 셋째 아들이 꿈을 꿨는데, 단테가 나타나 “집필을 끝냈다”고 하고는 자신의 침실로 아들을 데려가 “여기에 네가 오래도록 찾던 것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고. 잠에서 깨 그곳을 찾아보니 단테의 마지막 원고가 놓여 있었다. <데카메론>을 쓴 보카치오는 신곡의 결말과 관련된 이 일화를 글로 남겼는데, 망겔은 ‘찬양하는 마음에서 나온 전설’이리라 추측한다. 그런데 왜 굳이 길게 언급하는가? 뒤에 단테가 <신곡>을 쓰는 20여년간 ‘실제로’ 겪은 우여곡절을 강조하기 위해서인 동시에, 그 자체로 재미있는 이야기여서다.
이 책이 재미있어지는 대목은 바로 이런 우회로에 있다. “왜?”라는 질문으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해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구체적이기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나오는 “왜?”는 수많은 우회로를 허용한다. 샛길에 빠지는 일은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즐거운 여정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게는 낙원이 될 이러한 탐구는 분명 누구에게는 지옥이리라. 읽다 보면 ‘답’이라고 부르는 게 나오긴 하려나 의구심이 들 텐데,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다. 제5장 ‘어떻게 질문을 할까’는 일견 인간의 지성을 일깨우는 ‘잘 질문하는 법’을 알려줄 듯해 보이지만, <탈무드>부터 <시편>까지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이야기는 통역이 불가능한 조상들의 관습적 상징들로 가득한 ‘신의 말씀’의 기록을 다룬다.
 |
|
산드로 보티첼리가 그린 단테의 초상화. 알베르토 망겔은 단테의 <신곡>이 쓰인 당대의 상황부터 책 속의 내용이 후대의 사람들을 매혹적인 호기심으로 이끈 과정을 이야기한다. 위즈덤하우스 제공
|
호기심이 왕성한 애서가에게 이 책은 보르헤스의 단편소설 ‘두 갈래로 갈라지는 오솔길들의 정원’과도 같다. 책의 숲은 미로와도 같으며, 누군가는 그 안에서 매번 새롭게 발견되는 즐거움 속에 기꺼이 길을 잃는다. 제16장 ‘일어나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가’에서 아우슈비츠에 보내진 유대인이었던 프리모 레비가 <이것이 인간인가>에 쓴 <신곡> 관련 대목이 인용된다. 레비는 수용소에서 만난 프랑스인 청년 진을 수프를 받기 위해 선 줄에서 빼냈다. <신곡>의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내일이면 둘 중 한 사람이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에 관해, 너무도 인간적이고, 너무도 필요하면서도 예상치 못하게 시대착오적인, 그러나 그 이상의 것, 나 자신도 이제야 잠깐의 스치는 듯한 통찰력으로 겨우 보게 된 커다란 그 무엇, 어쩌면 우리의 운명의 이유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설명해야 했다고. 아우슈비츠에서 수프와 <신곡> 중 무엇이 더 당장의 필요가 되는가. 허상이 유일한 현실일 수 있다면.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공상 혹은 망상. “왜?”라는 질문이 유일한 이정표인 이곳은 당신에게 천국인가 지옥인가.
이다혜 작가, <씨네21> 기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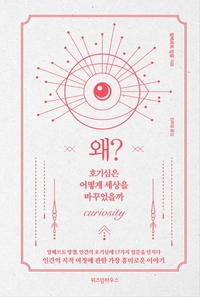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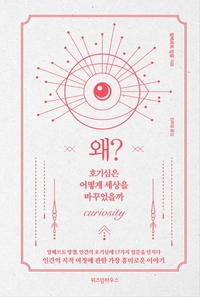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