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29 06:01
수정 : 2019.03.29 19:49
나의 끝 거창신용목 지음/현대문학·8000원
신용목의 소시집 <나의 끝 거창>은 시인의 고향 거창에서 보낸 고교 및 대학 시절을 20편의 시로 되살려낸다. 그 시절은 “야간자습 마치고/ 교원노조 사무실 몰래 들어가”(‘렛미인’) 영화 <파업전야>를 보던 시절이고, 선배가 운영하는 전통찻집“에서 먹고 자며 새벽엔 한겨레신문을 돌렸”(‘나의 끝 거창’)던 시절이다.
“우리들의 꿈 모리재에서/ 우리는 인생이 적힌 책을 두터운 밤으로 찢으며 진로에 대하여, 노동과 혁명에 대하여/ 떠들었다. 단 한 줄로 씌어지는 인생을 갖고 싶다고,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고.”(‘모리재’ 부분)
어느새 20년 남짓한 세월 저편으로 훌쩍 지나가버린 시절을 돌이키며 시인은 착잡한 심사를 숨기지 않는다. 시집 뒤에 실은 에세이에서 그는 그 시절을 두고 “해지고 버려져 더는 유효하지 않은 이야기”라며 일단 깎아내린다. “그러나 유효하지 않다면 그것은 시의 일. 해지고 버려진 것이라면 그것은 시의 말.” <나의 끝 거창>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교조가 발족했고 그 여파가 고교 시절까지 이어졌어요. 대학 시절에도 학생운동을 했는데, 96년 연세대 사태를 계기로 저희 세대가 운동을 말아먹었다며 죄인 취급하는 분위기가 생겼죠. 전교조와 거창이 제 삶과 문학의 출발인데도 그동안 그에 대해 쓰지 못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
|
신용목 시인
|
27일 오후 전화로 만난 시인은 “그렇지만 한번쯤은 그때 일을 시로 써야 한다는 생각을 숙제처럼 지니고 있었다”며 “막상 쓰고 나니 후련하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에게 새삼 고맙고 미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리의 생활은 체념 그러나 그 체념의 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박동학./ 전사도 투사도 필요 없어서 우리가 써야 할 사람은 박동학.”(‘모리재’ 부분)
박동학은 대구공전 재학 시절 학원민주화투쟁 중에 분신했다. “생일과 기일이 같”(‘기념일’)은 그의 23주기가 올해 5월이라서, “시집에 등장하는 당시 친구 및 선후배들이 그때 다 같이 모이기로 했다”고 시인은 밝혔다. 박동학의 생일이자 기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한데, 올해 어버이날 즈음 거창에서는 “제 몸의 불을 빨갛게 안으로 켜둔/ 사람들”(‘경부고속도로’)이 한데 모일 모양이다.
최재봉 기자, 사진 신용목 시인 제공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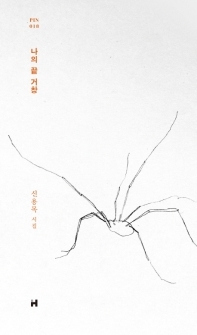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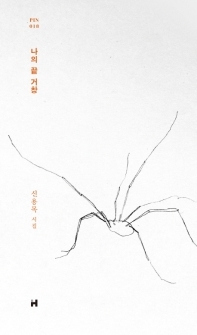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