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4 06:00
수정 : 2019.06.14 19:42
나는 매일 뉴욕 간다한대수 지음/북하우스·1만5800원
월세를 못 내서 한두 번은 쫓겨나봐야 한다. 10년을 살면서 100년의 고독을 느껴봐야 한다. 이혼도 한번쯤. 노숙자 경험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다. 이것이 바로 뉴요커의 조건. 5년차 유학생 정도는 그냥 관광객일 뿐이다.
‘한국 포크 록의 대부’라 불리는 한대수가 40여년을 터 잡고 살아온 뉴욕의 구석구석을 글과 사진에 담았다. 10살 때부터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맨해튼을 누빈 저자는 한국보다 오랜 세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에게 뉴욕은 단지 ‘복잡하고 분주한’ 대도시였을 뿐,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매력은 눈곱만치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3년 전에 다시 돌아간 뉴욕은 그야말로 신세계. ‘제2의 고향살이’를 다시 시작하며 틈틈이 글을 썼다고 한다. ‘한국 최초의 히피’는 반짝이는 자본주의 천국의 모습과 함께 거리의 노숙자들, 테러, 마리화나 같은 도시의 문제들도 카메라에 담았다.
책은 70대 노장이 쓴 일기이자 뉴욕을 위한 헌사로 읽힌다. 여행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역할도 톡톡히 한다. 일상에서 만난 앤디 워홀, 에드거 앨런 포, 데이비드 보위, 구사마 야요이, 스탠리 큐브릭 등 예술가들의 삶과 그에 얽힌 이야기가 재치 있게 풀어진다. 총기 사건 같은 어두운 속살도 넘어가지 않고 드러낸다. 집을 나섰다가 단체기도를 하는 수천 무슬림을 보고 깜짝 놀랐던 일, 딸 양호의 학교생활 등을 통해 뉴욕의 문화도 살짝 보여준다. 마지막 장에 쓴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나이 든 뉴요커의 고독, 추억은 진지하고 진솔하다.
김세미 기자
abc@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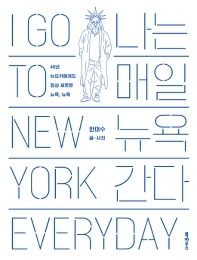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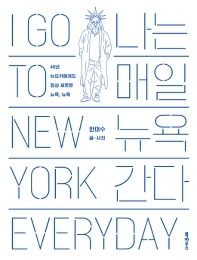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