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9 17:34
수정 : 2006.02.22 19: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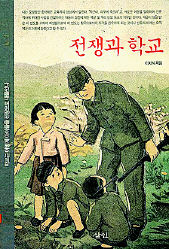 |
|
삼인 ‘전쟁과 학교’
|
아깝다 이책
지금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련’이라는 교과목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쯤은 교련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에 나가, 합성수지로 주조한 모형 M1을 들고 총검술, 제식훈련 등을 했었다. 당시 나에게는 답답한 교실에 앉아 골치 아픈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거기에 예비역 대위로 기억되는 교련 선생이 짬짬이 들려주는 허풍 섞은 군대 이야기는 재미가 짭짤했다. (지금 같았으면 차라리 수학 문제를 풀겠다.) 그 무렵 같은 반에 있던 어떤 녀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육군사관학교에 갈 것이다”라고.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거였다.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일단 육사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고 녀석은 굳게 믿고 있었다.
<전쟁과 학교>는 프랑스 혁명 이후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국민교육이 걸어온 역사를 추적한 결과물이다. 프랑스 혁명기 근대 공교육의 이상이 좌절되면서 군국주의적 국민교육이 탄생하게 된 배경부터,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강조한 1차대전기 유럽의 학교 교육, 2차대전기 파시즘 교육체제, 일제시대의 황국신민화교육, 한국전쟁 이후의 반공교육 등을 차례로 짚어가면서 국민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쟁 폭력을 저질러 왔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분열시켜 왔는지를 밝힌다.
지은이는 놀랄 만한 자료들을 통해 일제 천황을 위한 병사 양성을 목적으로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된 국민학교가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서는 국민을 살해하고, 남한에서는 인민을 살해하면서 그 체제의 장벽을 높이 쌓는데 충실한 역할을 지금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18세기 말에 출현한 국민국가의 건설과 보존을 목적으로 시작된 국민교육이 현재까지 그대로 복제되고 있음에 경악한다. (1차대전 당시 적군에게 용감하게 저항하다 처참히 죽은 ‘영웅 어린이’의 신화 만들기는 우리의 ‘이승복 어린이’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지은이 이치석 선생은 이 책이 학교사(學校史)가 아닌 자신의 반성문이라고 서문에 썼다. 할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20년 동안 자신이 가르친 아이들을 직접 만나 깊이 속죄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태평양전쟁 시기 학병 권유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교사들에 대해 생각한다. ‘과연 그들은 정말 죄의식이 없었을까?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심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라고 스스로 답하면서, 1914년 벨기에에서 양민을 학살한 자국군을 옹호한 독일 교사들의 속내를 헤아려 보기도 한다. 양심의 거울 앞에 서서 한 개인이 던지는 이 반성과 질문들은 곧 지금 우리의 교육 현실과 시대에 던지는 절실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새삼 생각해 본다. 동네 변두리를 돌아다니며 주운 삐라를 파출소에서 갖다주고 공책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박정희가 죽었을 때 교무실에 모여 통곡하던 선생들에게서 나는 무엇을 보았나. 도대체 나는 그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 (육사에 가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녀석은 고교 체육교사가 되었다). ‘교육을 못 받은 자는 교육받은 자의 노예가 된다지만, 잘못된 교육은 교육받은 자도 노예로 만든다’고 한다. 국민교육의 문제점에 대해 오랫동안 천착해온 지은이의 값진 결과물인 <전쟁과 학교>는 현대사 뒤에 숨은 그림으로 남은 학교의 맨얼굴을 보여주면서 끝없는 질문을 부른다. 한 단체의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음에도 이 책이 널리 읽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책을 펴낸 출판사 사람이라서일까.
최낙영/도서출판 삼인 주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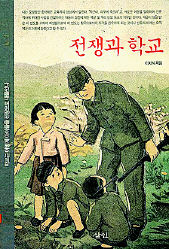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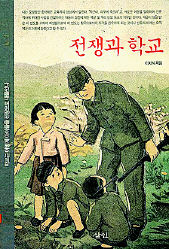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