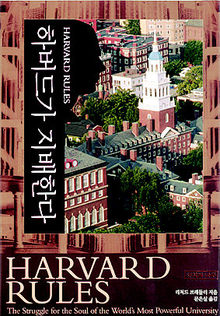 |
|
<하버드가 지배한다>
리처드 브래들리 지음. 문은실 옮김. 생각의 나무 펴냄. 1만9500원 |
“서울 창녀 100만” “여성 수학 못해” 막말 장본인 서머스, 하버드 총장 취임하자 인문학 외면하고 캠퍼스 확장 ‘신자유 신보수의 전당’ 미국 축소판 개조 상대편 제거 드라마틱한 전말 추적
<하버드가 지배한다>(Harvard Rules)(생각의 나무 펴냄)는 로렌스 헨리 서머스의 하버드 대학 평정기다. 그냥 단순한 평정기는 아니다. 서머스가 이룩한 하버드 대학의 세계화, 신보수주의(네오콘) 버전으로의 획기적인 재편에 관한 탐사보도 쯤으로 요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는 어떻게 하버드를 장악했던가? 그 전에, 서머스는 누군가? 지난 7월1일 하버드대 여름학기 개강 환영식에서 그는 “1970년대 서울엔 미성년 창녀 수가 100만명에 달했는데,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며 “이는 경제성장이 가져다 준 놀라운 기회 때문”이라는, 사실이 아닌 ‘막말’로 한국인들을 흥분시킨 장본인이다. 말썽이 나자 그는 보좌관을 시켜 ‘간접’ 사과했다. 그가 한국을 진짜 격동케 한 사건은 따로 있다. 1997년 외환위기로 한국이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 들어갔을 때 미국 재무부 차관으로, 그리고 장관으로 그 모든 과정을 총지휘하면서 거의 생살여탈권을 쥐다시피 했던 사람이 바로 그다. 이는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이 확인해준 사실이다. 올해 초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전미경제연구국(NBER) 회의에서 그는 하버드대 총장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여성비하 발언으로 세계를 또 한번 술렁이게 만들었다. 1월17일 <보스턴글로브>는 이렇게 전했다. “(서머스는) 과학·공학 분야 고위직에 여성 숫자가 적은 이유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여성이 1주일에 80시간씩 일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고교 때 과학과 수학 성적 최우등생중 여성이 남성보다 적은 점을 들고, 이는 남녀간의 선천적인 차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97년 IMF 지휘 한국과 악연 1954년생인 서머스는 유대계 명문 학자집안 출신이다. 1970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새뮤얼슨은 그의 큰아버지이고, 72년에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탄 켄 에로는 외삼촌이다. 수학에 재능을 보이며 ‘천재’ 소리를 들었던 그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수학공부를 했으나 하버드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따고 거기서 교수생활을 하다가 일찌감치 워싱턴으로 가, 헨리 키신저 이래 학자출신으로는 정계에서 가장 출세한 인물 중 한사람이 됐다. 세계은행 수석 경제연구원 등을 거쳐 빌 클린턴 정권 때 루빈 재무장관 밑에서 차관을 지내고 그의 뒤를 이어 99년 장관이 됐다.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의 패배로 정권이 공화당에 넘어가자 물러났으나, 2001년 하버드대학 27대 총장자리를 차지한 그는 거침없이 정적들을 제거하며 삽시간에 하버드 역사에서 보기 드문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했다.그가 세계은행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문건이 돌았다. ‘가난한 나라는 오염산업을 받아들여 필요한 국고를 확충할 수 있을 것이고, 질병이 증가한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그다지 없을 것이다.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수명이 짧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립선암을 야기할 확률이 기껏해야 100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폐기물에 대한 쓸데없는 우려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된 것이다. 전립선암에서 살아남는 투병기는 이제 그들의 몫이 돼야 한다. …가장 돈을 못 버는 나라에 독성 폐기물을 내버린다는 경제논리에는 허점이 전혀 없다.’
 |
|
2004년 6월10일 로렌스 서머스(앞 오른쪽) 하버드대 총장이 취임한 뒤 세번째 맞은 졸업식에서 사람들과 얘기하고 있다. 생각의 나무 제공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