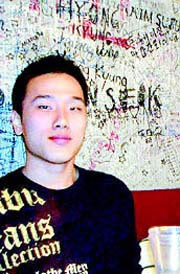 |
|
정진환 <연세춘추> 기자
|
2005대학별곡
많은 대학에는 운동부가 있다. 매년 대학은 선수등록된 고교 3년생들을 특기생 자격으로 선발한다. 과거 대학들은 이들 대학생 선수들을 법학, 경영 등 ‘생뚱맞은’ 학과에 배정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신문방송학 학사인 차두리(축구선수), 법학과를 졸업한 우지원(농구선수) 등은 바로 여기서 기인한 것. 다행히 요즘 대학들은 이들에게 사회체육과, 체육교육과 등 체육 관련 전공을 배정하는 추세다. 건장한 체격과 그라운드 위에서 뿜어내는 카리스마. 학교를 대표하며 적잖은 학생들에겐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일반 학생들과는 벽이 있다. 서로 허물지 못한 선입견, 거리감이 있다. 아주대 권영준(의대 2년)씨는 “운동부 선수들은 각종 대회에서 학교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면서도 “그들 자신만의 사회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생각? 궁금해진다. 연세대학교 축구부의 왼쪽 수비수 이완(22)씨. 체육교육학과 3년생이다. 운동선수 전용 기숙사에서 생활한다. 평일 외박이 허용되지 않는다. 밤 10시50분께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어야한다. 주말에도 중요한 경기가 있다면 외출이 힘들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고된 전체 훈련과 스스로 강제해야하는 개인훈련은 ‘전공필수’다. 촉망받는 선수 경우, 고교 졸업 후 돈과 더 나은 경험을 위해 프로로 직행하는 최근의 추세와 달리 대학으로 진학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된 생활이 불 보듯 뻔한데도. “돈보다는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 공부나 인간관계 등 여러 면에서 성숙해질 수 있어요. 프로 진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제 전공이 체육교육학인만큼 나중에 체육 지도자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운동선수에 대한 흔한 편견과는 달리 시간이 나면 도서관으로 달려가 책을 탐독한다. 어학공부에도 열심이다. 현지적응 문제로 인해 해외 진출 실패를 경험한 선배들을 보아온 탓이다. 또한 다음해엔 모교인 중동고에서 한 달간 교생실습을 할 계획이다. ‘교양필수’로 이씨는 더 나은 프로생활을 준비중인 셈이다. 그러나 이들의 학교 생활에 빛만 있지 않다. 훈련, 경기 등으로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쉽지 않다. 들어가도 잠만 자다 가는 경우가 적지않다. 때문에 훈련 일정 등에 맞춰 운동선수들만 따로 모아 수업이 이뤄지기도 하고 심지어 시험문제도 따로 출제한다. 하지만 성취도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연세대 사회체육학과 원영신 교수는 “운동부 학생들의 출석도나 성적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며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보다는 운동을 우선시해온 관성이 작용한 것”이라며 그 원인을 분석했다. 장래에 대한 고민, 조기 프로무대 진출 문제 등은 학교 중퇴로까지 이어진다. 허다하다. 연세대 축구부는 매년 9명 정도가 새로 들어오지만, ‘무사히’ 졸업하는 이는 4~5명에 지나지 않는다. 비인기종목은 더 심각하다. 고려대 럭비부 정대관 감독은 “럭비는 국내 실업팀이 3개에 지나지 않아 선수들이 졸업 뒤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적지않다”며 “군대 문제 등으로 중퇴하는 이들도 있다”고 털어놓는다.이에 고려대 럭비부는 학기중 훈련이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저녁 7시로 못박고, 출석여부를 해당조교로부터 확인받게끔 해 호평을 받고 있다. 럭비부 정 감독은 “럭비가 비인기종목이라 운동 때문에 자칫 공부가 소홀하면 미래가 불확실해진다”고 말한다. 대학교 내의 또 다른 사회, 운동부. 선수가 먼저냐, 대학생이 먼저냐는 질문은 옳지않아 보이지 않는다. 일반 학생들과 목표가 다를 뿐, 그들 또한 엄연한 교정의 주인이다. 운동장에서 흘리는 구슬땀이 무엇으로 피어날지 기대한다. 정진환 <연세춘추> 기자
◇ 바로 잡습니다= 지난 <대학별곡>(6월23일치)에 실린 ‘교수님 교수님 성적 고쳐주세요’ 기사에서, 연세대 법대 조교 김아무개씨는 기사 내용처럼 언급한 바가 없고, 실제 취재된 바도 없다고 기사 작성자인 정진환씨는 밝혀 왔습니다. 김씨는 현재 법대 조교도 아니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