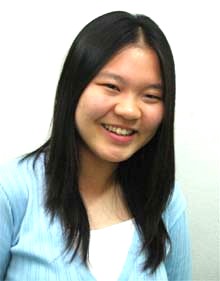 |
|
김강지숙 <이대학보> 기자
|
2005대학별곡
털 거뭇거뭇한 남자 대학생들끼리만 과묵하게 둘러앉은 자리에서 불쑥 나온 ‘기름 종이’. 네 명이 함께 닦는다. 새 상품의 성능이 더 좋다며 열변을 토하는 학생. 맞장구를 치는 또 다른 학생. 2005년 대학가 풍경이다. “이제 남자들끼리도 옷 어디서 사느냐, 머리 잘 어울리느냐, 서로 묻고 평가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서울예대 이상성(문예창작 1년)씨는 “남자도 외모를 관리해야 하는 게 사회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이씨는 기미, 주근깨를 방지하는 팩과 약을 사용하고 있다. 남자 대학생들이 예뻐지고 있다. 아니, 아직은 ‘멋있다’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1990년대 중반부터 화장하는 남학생들이 간간이 화제가 되더니, 이제 당구장 대신 피부 클리닉에 다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고려대 박용우(기계공학 1년)씨는 “남성을 겨냥한 화장품이나 옷이 많이 나온 만큼 이런 흐름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아직은 대놓고 이런 얘길 하는 게 좀 민망하고 팩을 사용하는 일 따위는 더 어색하다지만, 그래도 기름종이로 ‘남자의 두 번째 눈물’ 개기름을 닦아주는 정도의 ‘센스’는 있다. “효과가 좋아서 자꾸 쓰다 보니 이젠 남들 앞에서도 그냥 꺼내 쓸 정도로 습관이 됐다”는데, 팩과 기름종이도 그저 습관의 차이이지 않을까. 연세대 유체현(법학 2년)씨는 일주일에 두 번, 클리닉에 여드름을 치료하러 다닌다. “돈 많이 들지 않냐”고 묻자, “그래도 자기관리가 중요한 시대인데 투자해야죠”라고 말한다. “뒷거울과 왁스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로 기자를 감탄시킨다. 그러자 “눈썹을 밀거나 가벼운 화장, 심지어 쌍꺼풀 수술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귀띔해준다. 1, 2학년 신세대만의 트렌드는 아니다. “여자 후배들이 자기네 집에도 똑같은 옷 있다고 농담하던데요.” 홍익대 김의재(영어교육학 3년)씨가 입은 허리선이 들어간 쇼트 재킷을 본 후배들의 반응이란다. 요즘 유행스타일을 묻자 “나시티에 짧은 재킷, 버클이 큰 벨트에 발리 스타일의 흰 가방”이라고 거침없이 설명한다.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다는 소리에 요즘 클리닉에서 마사지도 받고 있다. 멋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복학생이다. 한 코미디 프로의 ‘복학생’은 이제 허구다. “팩하고 마사지 받는 남성에 대한 시각은 아직 보수적이지만, 피부 좋은 남성에게 호감을 갖지 않느냐”는 김씨의 주장에서 예뻐지려고 남몰래 애쓰는 ‘여자의 고충’이 발견된다. 개의치 않는다. 그는 “멋은 글이나 말과 다를 바 없는 하나의 표현수단”이라고 말한다. 서울 신촌의 한 네일 숍 네일 아티스트 이지연(25)씨는 “여자친구랑 오다가 익숙해져서 혼자서도 오는 남자 대학생들이 꽤 있다”며 “하루에 한 명씩은 꼭 찾는데, 케어 받은 남자 분들 반응이 무척 좋다”고 말한다.자기관리가 중요한 시대에 이들이 멋 부리는 이유는 ‘다양당연’하다. 젊은 남성을 소비의 주대상으로 삼으려는 상품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하지만 이런 진단 이전에 ‘멋’이 여성의 영역이란 전제 자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다만 여성처럼 멋을 부리면서도 안으로는 근육을 키우는 ‘배용준식 메트로섹슈얼’을 재생산하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하는 목소리는 솔깃하다. 여성성을 교묘히 착취하고 이용하면서도, 근본적인 남성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외국과 달리, 자신의 경제력으로 가꿔지는 멋이 아니란 점도 아쉽다. 하지만 분명 환영할 점은 여성과 남성의 멋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남녀의 획일적 구분, 이로 인한 차별도 그만큼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그들이 30대가 됐을 때, 남녀가 서로 새로 나온 쇼트 재킷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부모가 아들의 눈썹을 밀어주는 그런 날이 올까? 궁금해진다. 김강지숙 <이대학보>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