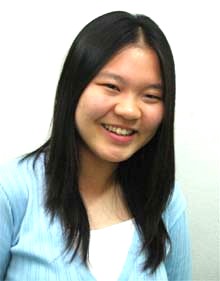 |
|
김강지숙 <이대학보> 기자
|
2005대학별곡
집을 떠난 청춘들이 모여 산다는 것만으로 대학 기숙사는 낭만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젠 많이 달라졌다. 최근 한 시트콤처럼 매일 즐거운 사건들로 북적대는 기숙사는, 거짓에 가깝다. 문을 걸어잠그는 순간 얼마든지 고립될 수 있는 곳, 오늘날 기숙사의 이면이다. 기숙사의 변화=기숙사가 커진다. 대학들이 경쟁한다. 내년 7월 완공 예정인 건국대 기숙사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오피스텔 급이다. 전용면적도 2평 정도 늘어 개인생활이 강조되고, 2000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단지는 흡사 아파트 단지다.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역시 1700여명을 수용하는 기숙사 2개 동을 새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화여대는 1999년, 800명 가량 수용 가능한 규모의 기숙사를 새로 지었다. 4명이 한 방을 쓰던 것이 이제 2인 1실로 바뀌었다. “이전 기숙사는 워낙 작았고, 4명이 붙어있는 옷장을 쓰다보니 거미줄처럼 엮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숙현(2002년 법학 졸)씨는 그때를 회상하는 반면, 새 기숙사에서 올 6월까지 생활했던 이혜나(국제학부 2년)씨는 “함께 야식을 먹거나 기숙사 야경을 보면서 낭만을 쌓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맘만 먹으면 혼자 지내는 것도 가능한 게 기숙사”라고 전한다. 생활의 변화=‘밀실 생활’은 더욱 자연스럽다. 이숙현씨는 “옛날에는 방 전화를 많이들 써서, 청춘사업이라도 할라치면 방 사람들이 다 알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복도에 나가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고 예의다. 층마다 한 대씩 설치된 티브이에 온 사생이 달라붙지 않는다. 학생들은 각자 방에서 제 노트북으로 실시간 TV를 본다.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과 직접 대거리를 할 필요도 없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불만을 토로하면 된다. 신구 기숙사에서 모두 생활했었던 이숙현씨는 그 경계를 “대가족이 핵가족 된 것”에 비유한다. 이혜나씨도 덧붙인다. “아파트랑 비슷해요. 문만 닫으면 끝이니까.” 서울대 최규화(경영학과 2년)씨는 “기숙사가 사람 사귀는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설명한다. “사람 수도 많은데다 각자 과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미라(고려대 심리학과 2년)씨는 “룸메이트와도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는 아이들도 있다”고 전한다. 사라지는 점호=기숙생활의 상징이었던 점호도 사라진다. 신세대의 좀더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상이 반영된 탓이다. 서울대는 통금, 점호가 아예 없다. 기숙사를 오가는 시간은 더욱 들쑥날쑥이다. 점호가 없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숙사의 이남의(미술원 2년)씨는 “새벽에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도 많은데 밤이라고 해서 다 큰 성인들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다른 학교들도 차차 점호를 없애는 쪽으로 변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2000년 즈음 들어 마주하는 풍경이다. 물론 ‘단체생활’이 여전히 강조되는 곳도 있다. 최대 8명이 한 방을 쓴다는 중앙대 남학생 기숙사(현암학사)는 사생들 간의 위계질서나 유대가 유별난 곳이다. 현암학사 제 44대 자치회장인 강경모(경영학부 4년)씨는 “사회에 나가려면 남들과 섞여 지내거나 함께 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며 “그러는 와중에 기숙사에 대한 애착이 생기기 마련”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 역시 군대 갔다온 전후로 기숙사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실감한단다. 사실 너무 메말라 가는 건지도 모르겠다. 신재훈(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4년)씨는 “기숙사는 자거나 쉬러 오는 최소한의 거주공간”이라고 잘라 말한다. 하지만 단지 몸을 누이는 곳이 아니라 영혼을 쉬게 하는 곳이 또한 주거공간일 것이다. 편리와 낭만 사이, 기숙사가 서있다.김강지숙 <이대학보> 기자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