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09 22:01
수정 : 2006.01.09 22:01
2006 문화계 샛별 ⑨ ‘아트인컬처’ 편집장 이정우
“미술계란 ‘업자’들끼리 만든 상상의 공동체 아닌가요. 업계잡지는 안 만들 겁니다. 당대 문화정신을 살린 교양지가 목표지요. 미술언론에서 잃어버린 기자 정신을 되살리는 건 기본이겠고요. ”
자신의 직함을 미술 디자인 평론가로 붙여온 글꾼 이정우(35)씨의 대답엔 냉소와 의욕이 섞여있었다. 지난달 5일 미술 월간지 <아트인컬처>의 편집장이 됐다는 취임사(?)를 개인홈페이지(crazyseoul.com/)에 띄운 이래 그는 올해 주목받는 미술 언론인이 됐다. 물론 적지않은 미술인들은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여느 미술인들의 행동 반경과 극단적으로 다른 ‘원리 원칙’을 지켜온 문화 운동가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갈수록 업계지 성격만 강조되는 미술잡지들을 보며 아쉬운 놈 우물 판다는 심정으로 덜컥 편집장을 수락했다”고 말한다.
“저는 직업 수집가예요. 학부생(서울대 산업디자인과 90학번) 때 이미 웹 디자이너로 돈을 벌어봤고, 군대 시절 사고로 의가사 제대하면서 ‘사회에 무언가 좋은 일을 해보자’는 결심에 95~2000년 커밍아웃해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로 싸웠지요. 2000년 이후 아트선재센터 등의 전시 기획자, 출판사·공예잡지 편집장, 커피회사 이사, 무용판 시나리오 작가 등도 해봤습니다. 국내 현대미술가 20여명의 연구프로젝트를 오는 3월 출간하고, 지난해 비평동인지 디자인 텍스트 발간에도 관여했습니다. 만화와 현대무용, 음악 평론도 줄곧 썼지요. 잡다해보이지만 이 시대 사회를 관통하는 시각 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들을 하나같이 반영한 것들입니다.”
천상 전위적 사건을 만들고 뜯어봐야 하는 이 젊은 평자가 학맥 파벌 얽힌 제도권에서 잡지를 짠다는 건 어색하지 않을까. 그는 즉답 대신 80년대 이후 국내 현대 미술의 전개과정과 한계를 한달음에 풀었다. “우리 현대미술은 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90년대 초중반부터 국제 흐름과 접속되어 본 궤도에 들어섭니다. 대안공간, 소수자 예술, 신세대 작가군의 등장 등이 징후였지요. 그 성장동력들이 90년대 중반 이후 정체되면서 새 힘을 잃어버렸어요. 평단, 작가들 상당수가 출세와 권력구도에 집착한 탓이라고 봐요.”
3월호 재창간을 준비 중이라는 그는 <아트…>를 시각문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교양 저널로 바꾸겠다고 했다. 잡다한 미술계 소식은 되도록 덜고, 비슷한 맥락의 신·구간을 한데 분석한 종합 서평과 건축, 무용 등의 시각 장르, 뇌과학 등의 흐름을 읽는 연재물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취임 첫 작품인 <아트…> 신년호에서 ‘희대의 예술가’ 황우석 박사 파문의 전말기를 티브이 뉴스, 일간지들의 보도내용을 짜깁기한 이미지 콜렉션으로 편집한 것도 그런 의도다. “감놔라 배놔라 식의 당위적 담론은 질색입니다. 70년대 최고의 문화정신들을 모았던 <공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정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잡지가 목표지요.”
달변 속 그의 구상이 젊은 치기로 끝날 것인지, 미술 저널의 새 전망을 제시하는 물꼬가 될 것인지는 연말께 얼추 윤곽이 잡힐 것 같다. 이씨가 좋아한다는 독일 전기작가 츠바이크(1881~1941)의 독백은 이씨를 불온한 도전으로 내달리게 하는 격려처럼 비친다. “…나는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시대는 내게 불쾌하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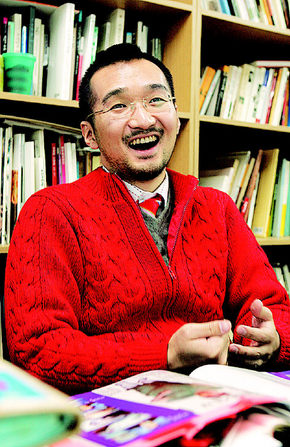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