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31 15:01
수정 : 2006.07.31 15:48
지난 28일에 <한겨레신문>에서 흥미로운 서평 기사
<손오공아 ‘드래곤 볼’ 그만 찾아라>를 볼 수 있었다.
이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일본만화의 '발전'에는 군국주의 가치관이나 일본의 전통적인 가치관 ‘잇쇼겐메이(一生懸命 : 한가지 일에 목숨거는, ‘장인정신’과도 연관있는)’ 사상을 ‘주입’시키려는 국가정부의 개입과 지원이 있었으며, 그러면서 <나루토>나 <원피스>와 같은 소년만화들도 일본 주류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일정 부분 부응하는 만화가 됐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시사만화의 형태로 군국주의 가치관에 부역했던 원죄가 있는 일본만화는, <망가 켄간류>의 악령과 일본만화 특유의 여전한 '색채' 때문에 역사를 지워버릴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옳은 부분이다. 하다못해 <미스터 초밥왕>만 하더라도, 남성은 자기 분야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고 노력하며, 여성은 그 뒤에서 말없이 기도하고 응원하며 지켜보는 수동적인 위치를 고수한다는 일본 사회의 전형성이 엿보인다.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일본만화는 ‘일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 목욕문화의 잦은 등장은 기본이고, ‘오다 노부나가’와 ‘신센구미(신선조)’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개구리 중사 케로로>는, 군국주의에 대한 풍자와 ‘키덜트 문화’나 ‘오타쿠 문화’에 대한 고찰이 신선하게 와닿는 가운데, 부모의 사전 교육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 이해할 소지가 있다.
하나의 잣대로만 이야기하기엔 너무 다양한 일본만화
그런 면에서 이 기사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전체적인 논지로 봤을 때는 일본만화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해하지 못한 기사인 것 같다.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많고 많은 일본의 만화들을 지나치게 한가지 잣대로만 단정짓는 것 같다.
일본만화는 <나루토>와 <원피스>같은 만화가 있고, 심지어 <망가 켄간류>같은 만화가 있는 반면에, <괴짜 가족>이나 , 이토 준지의 공포만화 컬렉션도 있다. <괴짜 가족>이나
는 ‘엽기’ 문화에 대한 고찰과 함께, 아이들(혹은 중학생)의 눈으로 어른 사회(혹은 학교)의 문제점을 우스꽝스럽게 비판한다. 이토 준지는 여전히 허를 찌르는 심리 묘사를 선보이고 있으며, 폭주족 출신의 다카하시 츠토무는 <폭음열도>라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 서린 자화상을 남겼다.
이 만화들은 일본 사회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만화들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저마다 다른 성향의 '허영만'이 있고, ‘이현세’가 있다. 그런 반면에 일명 ‘공장 만화’라는 형태, 그리고 허술한 내용과 그림체 탓에 비판받는 ‘김성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의 색깔을 드러내는 넓은 분야를 한가지 면으로만 단정짓는 일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게다가 만화 장르는 예민한 감각과 상상력이 중요한 장르다. 낡은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목적만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운 장르다.
일본정부의 지원이 영향은 줬겠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러기엔 일본만화의 개성은 저마다 다른 면이 많다. <나루토>와 <원피스>같은 소년만화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화들이라면, 그런 만화들을 특성에 따라 묶어서 비판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 잘 이끌어가다가 결말에서 코미디가 된 <묵공>이나 <삼국지연의>를 어이없게 뒤집어버리는 <신삼국지>같은 만화들을 비판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이런 만화들은 기본적인 재미가 있어, 어처구니없는 일본 미화나 역사 왜곡의 문제점을 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와 더불어 일본만화의 치밀한 발전은 역으로 한국의 어른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들은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만화를 보는 아이들에게도 공부에 방해되는 나쁜 일이라고 강요해버린다. 일본이 만화 장르의 장점과 효율성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로 전파시키는 사이에 어른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일본이 '만화'를 주목할 때, 우리 어른들은?
아쉽게도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역사만화를 보여주기는커녕, 제대로 된 역사 교과서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뿐일까? 일본 극우들이 망언을 하고 엉터리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도,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어렵다. 실천에 옮기지 못할 증오만 순간 퍼붓다가 며칠내로 사그라든다. 이런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 “만화를 보지 말라”고 강요할 자격이 있는 것일까?
어른들의 잘못된 행태를 배우느니, 어른 사회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일본만화’ <괴짜 가족>을 보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차라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일본은 잘못된 군국주의와 주류 이데올로기 홍보 차원으로 만화를 활용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극우가 판치는 사회가 되면서 그런 문제점을 국제적으로 노출시키는 사회가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점을 비판하면서, 다양함이 생명인 ‘일본만화’ 자체까지 확대해서 규정짓는다. 전형적인 ‘일반화의 오류’다.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받아들일 점은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가 아닌 다양한 힘이 숨어있는 분야와 사회, 그것을 어느 하나로만 규정짓는 것은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이다. 일본 사회는 지난 역사와 요즘 논란이 되는 '극우'의 준동 탓에 군국주의와 지나친 자문화 중심주의에 따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회지만, 우리가 보고 배울만한 긍정성 역시 존재한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도 이따금씩 "한국인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일반화의 오류’의 피해자가 됐다. 우리부터 자제해보자.
(*이 기사는 네티즌, 전문필자, 기자가 참여한 <필진네트워크> 기사로 한겨레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겨레 필진네트워크 나의 글이 세상을 품는다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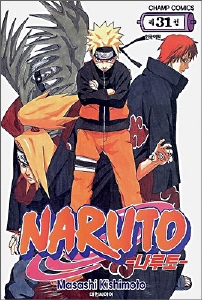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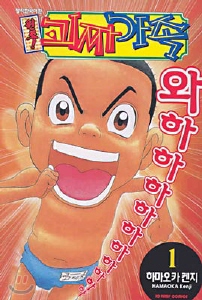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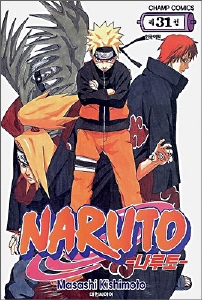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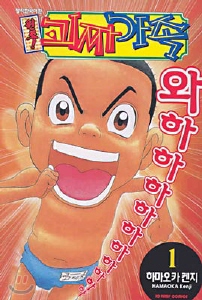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