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1.05 17:56
수정 : 2007.01.05 17: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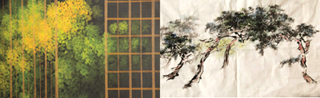 |
|
오광해·임택준· 박남준씨 그림전
|
오광해·임택준· 박남준씨 그림전
“우리 전시도 비엔날레라니까요.”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행사의 이름을 자기네 전시에 턱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 화가 오광해씨와 퍼포먼스 작가 임택준씨, 시인 박남준씨. 57년생 동갑나기로 20여년 간 전주 완산벌에서 우정탑을 쌓은 이들이다.
이제 50줄에 들어선 세 명이 전북 전주시 경원동 전북예술회관에서 5일 시작한 자칭 비엔날레급 3인전에는 공식 명칭이 없다. 이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를 두고 흔히 ‘세 사람이 걸어왔다’전으로 부른다.
이 전시회는 세 친구들이 전주 문화판에서 한 10여년 같이 놀다가 각지로 흩어졌으나 느꺼운 인연을 끊을 수 없어 2002년부터 2년마다 한번씩 그림 들고 모이는 마당이다. 박씨는 지리산 기슭의 경남 악양골에서, 임씨는 전주 모악산에서, 소나무 화가 오씨는 강화도 석모도 작업실에서 끙끙거리며 엮어낸 그림들을 들고 ‘걸어 왔다’. 글과 그림, 사람들에 부대낀 셋의 2년 무량세월이 스며든 작품들. 2002년 전주 얼화랑에서 첫 전시를 한 이래 2004년 서울 이오스갤러리를 거쳐, 전주로 돌아왔다. 서로 다른 장르에서 활동하되, 소통의 매개를 겸해 그림을 그려 들고오기로 한 사연이 흥미롭다.
박씨는 무심한 문인화풍의 3~4호짜리 소품을 걸었다. 소담한 매화, 경남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지리산 기슭의 자기집을 추사의 <세한도>풍으로 흉내내듯 그렸다고 한다. 동쪽 매화 동네 마을의 풍경? 그는 “명색이 비엔날레 격이라 다른 두 친구는 성심성의껏 그렸는데, 나만 화다닥 그림을 그렸다”“창피하니 다른 두 작가만 신문에 소개해 달라”고 했다.
강화 석모도에 칩거하며 줄곧 소나무만 그려온 푸른 작가 오광해씨는 조금씩 파격을 꾀했다. 작품 절반 이상은 예의 그 소나무지만, 붉은 소나무를 색연필로 그리기도 하고, 다른 나무들도 등장시키는 등 소재와 재료를 바꿨다. 어둔 화면 좌우쪽에 놓인 창문살과 그 사이에 감나무, 은행나무 잎들과 가지가 아롱거리는 환상적 구도가 새롭다.
퍼포먼스를 해온 작가 임씨는 이목구비 흐릿해진 반추상 인물들의 실루엣 유화 등을 내걸고 퍼포먼스 영상물도 틀어줄 참이다. 오씨는 “한공간에서 서로 다른 개성을 확인하며 안도한다. 다만 서로 한동안 몰랐던 나이와 세월을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12일까지. (063)284-4445.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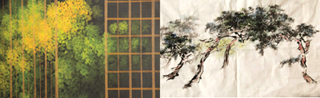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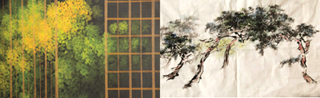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