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07 09:00
수정 : 2019.10.04 14:02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① 글 쓸 때도 사람이 먼저다
②‘대한’을 대하는 자세
③‘의’와 전쟁을 선언하라
④‘빵들과 장미들’이 어색한 이유
⑤ 갖지 말고 버리자
⑥ ‘것’을 줄여쓰라
⑦ 주어에 서술어를 응답하라
⑧ 쌍상에 맞춰 ‘응답하라’
⑨ 동사가 먼저다
⑩ 좋은 글은 ‘갑질’하지 않는다
글 쓸 때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영어와 한자를 중복한다. 이 경우에는 단어가 달라 무심코 넘어가는 일이 흔하다. 읽어도 문제없다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송송 커플은 웨딩마치를 울리며 백년가약을 맺었다.” 웨딩마치는 결혼행진곡이란 뜻으로, ‘웨딩마치를 울리다’는 ‘결혼한다’는 뜻이다. 백년가약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이다. ‘결혼한다’는 뜻이다. 이 문장은 결혼했다는 걸, 영어식 표현과 한문식 표현으로 거듭 썼다. 중복이다. “송송 커플은 웨딩마치를 울렸다” 또는 “송송 커플은 백년가약을 맺었다”로 고쳐라.
“선거를 앞두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졌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견해와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인기영합’과 같은 뜻이다. 물론 표퓰리즘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설명해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 오히려 그때에는 이 문장 다음에 사전에 나오는 뜻을 풀어주는 게 좋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바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정치 형태를 뜻한다.” 이렇게 말이다.
“책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링크 역할을 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설명해주는 말과 영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 ‘이어주다’와 ‘링크’는 같은 의미다. 같은 단어를 중복해 쓰면 문장이 지루해지듯, 같은 뜻의 내용을 겹쳐 써도 문장이 헐거워진다. “책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로 바꿔라.
이렇게 중복해 많이 쓰는 문장은 영어뿐만 아니라 한자어도 있다. “한전은 하루 평균 3만∼4만㎾ 전기를 송전했다.” 이 문장에서 중복 표현을 찾아보자. 힌트는 ‘송전’에 있다. 송전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변전소로 보낸다는 뜻이다. 송(送)은 ‘보내다’, 전(電)은 ‘전기’를 뜻한다. ‘송전했다’에 ‘전기를 보냈다’는 뜻이 들어 있다. “한전은 하루 평균 3만∼4만㎾를 송전했다.” 이렇게 고쳐야 한다. ‘송전’이라는 단어 뜻을 알고 있으면 좀더 친절하게 풀어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이다. “한전은 하루 평균 3만∼4만㎾ 전기를 발전소에서 만들어 변전소로 보냈다.”
 |
|
이미지투데이
|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이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은 얼마일까?” 이 문장에서도 중복이 나온다. ‘벌어들이는 것’과 ‘수익’은 같은 뜻이다. 수익(收益)은 ‘이익을 거두어들인다’는 뜻이다. 한자를 살리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의 1년 수익은 얼마일까?” 우리말을 살리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버스커버스커 <벚꽃엔딩>은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일까?”
“12월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선물을 주고받는다.” ‘12월달’이 문제다. ‘월’은 한자어(月), ‘달’은 우리말이다. 두 개 모두 쓸 필요가 없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어 선물을 주고받는다”로 써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반수(過半數)는 ‘절반이 넘는 수’라는 뜻이다. 이상(以上)은 ‘수나 정도가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을 경우’에 쓰는 말이다. 과반수 안에 이상이 포함됐다. 한자어 두 개 가운데 하나만 써야 한다. “국민 과반수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는 “국민 반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로 쓰자.
이런 중복 표현을 왜 자꾸 쓸까? 한자어 뜻을 정확히 모르면서 쓰니 문장이 엉켰다. 중복 표현은 의미가 반복되기에 불필요하게 문장이 늘어진다. 중복 표현을 쓰지 말자. 좋은 글쓰기의 첫걸음이다.
조사를 반복하지 말자
조사는 체언이나 부사, 어미에 붙어 다른 말과 문법 관계를 보여주거나 뜻을 도와주는 품사다. 명사와 동사를 겹치지 않게 써야 하듯 조사도 겹치지 않게 쓰는 게 좋다.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이 문장을 한번 보자. 조사 ‘를’을 반복했다. 거듭 나온 조사를 지워보자. ‘이사를 하면서’는 ‘이사하면서’로, ‘공부를 하기’는 ‘공부하기’로 고쳐주면 된다. “서울로 이사하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을 했다.” 이 문장 역시 마찬가지다. 조사 ‘를’과 ‘을’이 반복해 나온다. ‘사랑을 했다’는 ‘사랑했다’로 간결하게 처리해주면 된다. “나는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다.”
“그 학교가 교실이 크다.” 주격조사 ‘이’와 ‘가’가 연이어 나온다.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자. 쉽게 고치려면 ‘의’를 넣어주면 된다. “그 학교의 교실이 크다.” 하지만 우리 문장에 일본어투 ‘의’가 너무 많이 보인다. 되도록 안 쓰는 게 좋다. 이 표현보다 “그 학교 교실은 크다”가 더 우리말답다.
“그가 눈이 참 예뻐.” 이 문장도 마찬가지다. “그의 눈이 참 예뻐” 이렇게 고치기보다는, “그는 눈이 참 예뻐”로 고치는 게 낫다.
“그 학교는 교실이 크다”와 “그는 눈이 참 예뻐”는 문장에서 공통점이 있다. 문장 주어가 2개란 점이다. 이것을 ‘이중주어’라고 한다. 보통 문장은 주어 하나, 서술어 하나다. 그렇지만 가끔 우리말에는 이렇게 주어가 2개인 문장이 있다. 우리말 특징이다.
“그는 팀장에게 받은 지원금으로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다.” 한 문장 안에 ‘으로’가 두 번에 걸쳐 나온다. 같은 조사를 반복하면 문장도 쉽게 읽히지 않는다. 겹쳐 나오지 않게 다른 표현으로 고치는 게 낫다. “그는 팀장에게 지원금을 받아 미국 출장을 떠났다.”
“나는 초등학교까지는 혼자 있을 때는 책은 읽지 않았다.” 한 문장 안에 ‘는’과 ‘은’이 세 번씩이나 겹쳐 나온다. 굳이 안 써도 되는 건 빼는 게 낫다. “나는 초등학교까지 혼자 있을 때 책을 읽지 않았다.”
조사는 단어 관계를 정의해준다. 하지만 한 문장 안에서 같은 조사를 거듭 쓰는 건 피해야 한다. 문장이 어색하다. 읽어보면 그렇다는 걸 느낄 수 있다. 문장 안에 나오는 같은 조사를 다른 걸로 바꿔라.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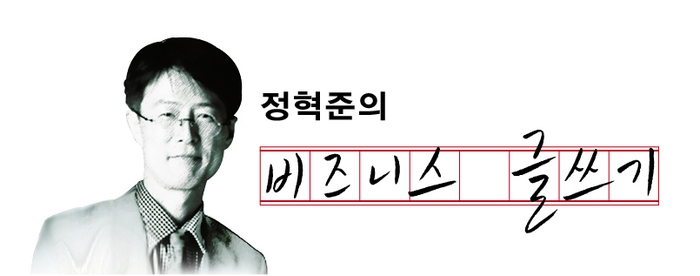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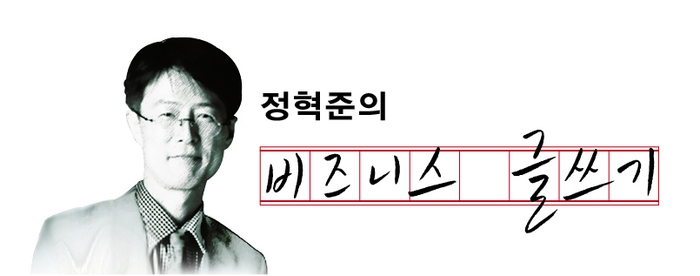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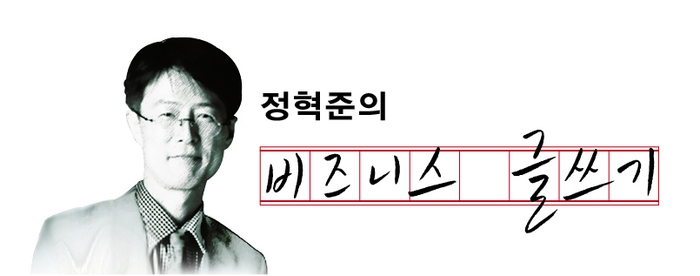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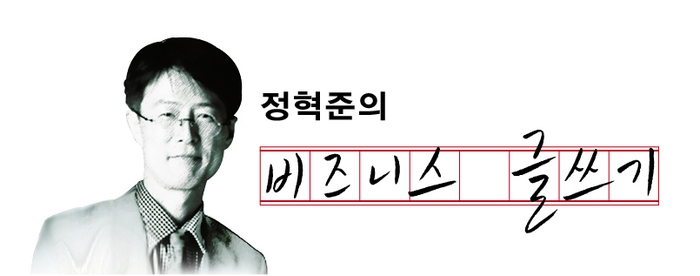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