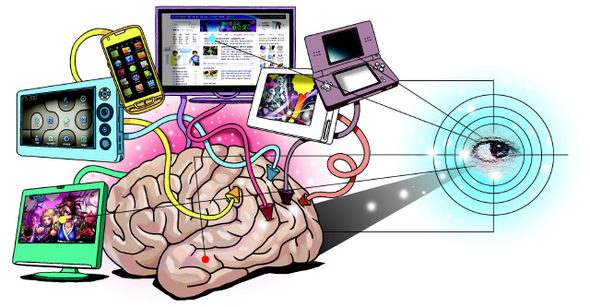 |
|
‘바보상자’ 인터넷에 상상력 얄팍해진다?
|
정보습득력 향상됐지만 비판적사고·분별력 약해져
디지털 의존이 ‘치매’ 낳기도…최신연구 결과 소개
니컬러스 카가 펴낸 ‘인터넷이 뇌에 끼친 영향’ 논란
# 40대 회사원 이영식씨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있다.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것을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한 세상을 산다. 대중교통을 탈 때는 트위터와 이메일에 접속해 무한한 정보를 쉼없이 받아들인다. 하지만 잠시라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는 곳에 있으면 머리칼 잘린 삼손처럼 무기력해짐을 느낀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덕분에 많은 정보를 이용하지만 낯익은 전화번호나 집주소도 기억나지 않을 때면 ‘디지털 치매’라는 것도 실감한다.
김병천씨는 자동차가 필수인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사는데, 차량에 내비게이션 대신 수십개의 권역별 지도를 갖춰놓고 운전한다. 비용도 시간도 더 많이 들지만 김씨는 지도로 길을 찾는 방식을 좀체 바꾸지 않고 있다. 길찾기의 재미인 오리엔티어링을 넘어서, 공간에 대한 감각과 인지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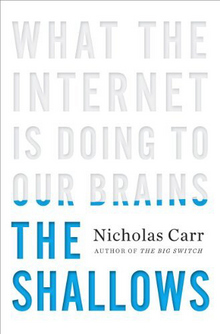 |
|
<얄팍함: 인터넷이 뇌에 끼친 영향>
|
코넬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시간에 학생 절반은 노트북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 학생은 컴퓨터를 쓰지 못하게 한 결과, 인터넷을 사용한 그룹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시험에서 훨씬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린필드는 “화면 미디어 사용은 항공기 조종처럼 동시에 수많은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공간인지 능력을 개선시켰다”며 “하지만 이는 추상적 어휘, 반성, 연역적인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상상력과 같은 고도의 인지 구조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사고가 ‘얄팍’해졌다는 것이다. 스탠퍼드대 상호작용성 미디어랩의 클리퍼드 나스 교수는 101명을 대상으로 ‘동시 다중작업수행(멀티태스킹)’의 효과를 실험했다. 멀티태스킹을 많이 하는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주의력이 산만하고 사소한 것들에서 중요한 정보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애초 멀티태스킹의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신경과학자 마이클 머츠니히는 갈수록 늘어나는 인터넷과 정보기기 사용이 우리의 두뇌 구조를 개조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는 수십년간 영장류에 대한 일련의 실험연구를 통해 외적 자극이 뇌구조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는 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인한 주의력 분산과 사고 단절이 인간 지적생활에 끼치는 장기적 영향은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 인간 두뇌의 능력을 외부의 보조장치를 통해 연장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논란거리였다. 플라톤의 <파에드로스>에는 소크라테스가 글쓰기의 발달을 탄식하는 장면이 나온다. 머리에 생각을 넣어두는 대신 문자에 의존하게 되면 기억력 훈련을 하지 않고 더욱 잘 망각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제대로 된 훈련 없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리석으면서도 정작 스스로는 많은 지식을 갖췄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 당시에도 출판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있었고, <논어>엔 ‘배우되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어리석다’(學而不思則罔)는 구절이 있다. 유한한 인간 지적 능력이 디지털기기와 기술의 도움으로 크게 확장되었지만 심층적 사고력이 훼손된다는 이런 주장은 인간 인지능력과 정보화 기술 간의 딜레마적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