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7.09.30 14:53
수정 : 2017.09.30 17:16
 |
|
2007년 6월 모나코에서 열린 몬테 카를로 텔레비전 축제에 참여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휴 헤프너(왼쪽 두 번째). EPA 연합뉴스
|
휴 헤프너에 ‘성 해방자’ 추모 잇따르자
‘누구를 위한 성적 자유인가’ 반박 봇물
플레이보이 맨션 여성 ‘9시 통금’ 등 제재
“여성에 권력? 헤프너의 방식대로였을 뿐”
 |
|
2007년 6월 모나코에서 열린 몬테 카를로 텔레비전 축제에 참여해 여자친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는 휴 헤프너(왼쪽 두 번째). EPA 연합뉴스
|
남성용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를 창간한 휴 헤프너가 9월27일 숨지면서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그를 회상하고 추모하는 기사며 트위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수 게재됐다. 헤프너가 성적 자유를 추구했고, 인종 차별을 타파하는 실천을 했으며, 유력 인사들이 그의 잡지와 인터뷰했고 <플레이보이>는 나체 사진만 즐비한 잡지가 아닌 지적인 글이 실린 잡지라는 점이 언급됐다.
하지만 추모 분위기는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많은 언론이 기사와 칼럼을 통해 헤프너가 ‘성 해방의 표상’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나섰다. 헤프너가 <플레이보이>를 통해 추구한 ‘성적 자유’가 ‘누구의 자유’였냐는 것이다.
<플레이보이>가 여성의 나체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여성의 성적 자유’를 증진시켰다는 주장은 잡지가 처음 출판된 1953년 당시 미국의 성별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 그 무렵 여성은 정숙한 처녀, 혹은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둘 중 하나의 이미지에 고정되어야 했다. 몸을 드러내고 성적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 규범에 도전하는 일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다.
하지만 <비비시>(BBC) 방송은 28일 ‘플레이보이 혁명은 여성에게 좋은 일이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엑서터대학에서 성 고정관념을 연구하는 테클라 모르겐로스 박사를 인용해 “휴 헤프너는 몇몇이 주장하는 것처럼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여성 해방자도 아니다. 그와 그의 제국은 1950년대의 규범을 바꿨지만, 그의 묘사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모르겐로스 박사는 “그는 여성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 선택할 수 있는 제한적인 역할을 하나 더 부여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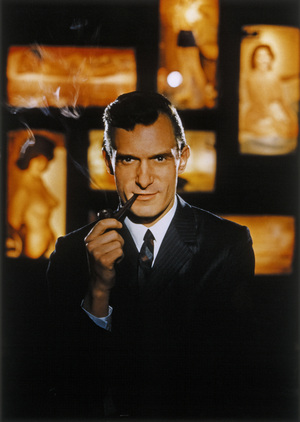 |
|
휴 헤프너. 플레이보이 엔터프라이즈 제공
|
1960년 수영복에 가까운 의상에 토끼 귀와 꼬리 모양의 장식을 착용한 ‘버니’(토끼) 복장을 한 여성 종업원들을 배치한 클럽을 열고,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여러 명의 ‘여자친구’와 함께 생활한 헤프너의 ‘공개된 사생활’은 그가 주창한 ‘성적 자유’가 여성이 아닌 그 자신과, 이를 즐기는 남성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심증에 확신을 더해줬다. 이 안에서 생활한 여성들이 그들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1963년 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플레이보이 클럽에서 버니 복장을 하고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을 담은 잠입 취재기를 발표했다. ‘버니’들은 외모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고, 어떤 정체성도 노출되지 않는 ‘버니’ 이미지만을 요구받았다. 메이크업실에 늦게 도착하거나, 속옷이 보이거나, 근무시간에 무언가를 먹으면 감봉됐다.
플레이보이 맨션에서 헤프너와 함께 생활하던 여성들도 자유롭지 않긴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 맨션에서 생활했던 홀리 매디슨은 맨션의 여성들이 잠옷 규제와 밤 9시 통금 등 많은 규제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가디언>은 28일 게재한 ‘나는 휴 헤프너를 포주라고 불렀고, 그는 나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저게 바로 그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맨션의 여성들이 콘돔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28일 ‘휴 헤프너는 페미니스트다, 만일 당신이 페미니즘이 예쁜 여자가 당신과 섹스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헤프너의 남성성에 대한 관념은 영원히 10대 시절에 머물러 있다”고 적었다. 헤프너는 생전 언론 인터뷰에서 “만일 당신이 여전히 소년이라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삶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위해 발명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칼럼에서 <플레이보이> 창간호에 실린 마릴린 먼로의 나체 사진이 먼로의 허락을 얻지 않은 것이었지만 이후 그 사진이 먼로의 이미지를 규정해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것이 헤프너와 여성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여성에게 권력을 주되, 헤프너의 방식 안에서여야 한다. 여성을 유명하게 만들되, 그들을 나체로 유지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july@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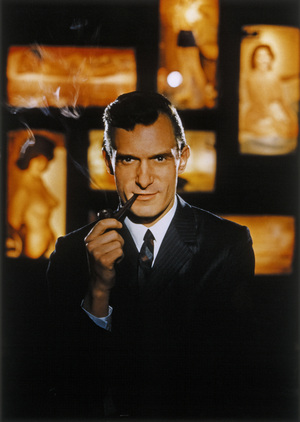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