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07.18 19:23
수정 : 2012.07.18 1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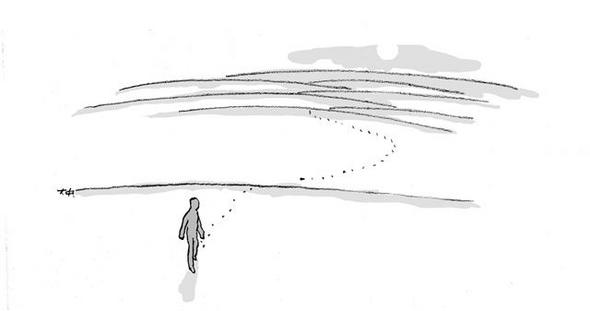 |
|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
프랑스의 화가 고갱은 타이티에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나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 미래의 운명을 묻는 것은 비단 철학자와 예술가들만의 몫은 아니었다.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바로 진화생물학이다. 그러나 진화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과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만인의 만인을 상대로 한 투쟁’으로 잘못 인식돼온데다 나치가 진화론에 입각한 우생학을 빌려 유태인 600만명을 가스실로 보내면서 악명으로 오도되기도 했다.
우리 인류는 어디서 왔는가? 생물의 종은 어떻게 생기는가? 150여년 전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을 내면서 우연한 변이체들에 자연선택이라는 필터가 가해져 환경에 적합한 자만 살아남으며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말하였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기독교 도그마에 억눌렸던 ‘소심’한 다윈은 인간의 기원은 말하지 않았다.
그가 본격적으로 인간을 다룬 것은 12년이 지난 뒤 <인간의 유래>에서다. 인간이 형태와 발생 과정뿐 아니라 감정에서도 유인원과 비슷하고, 더욱이 사람에게 있는 충양돌기, 꼬리뼈, 귀를 움직이는 근육 등 흔적기관들은 그 조상대에서는 정상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아 인간의 이성과 동물의 본능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물에게 언어가 없다는 점도 큰 차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뒤에 진화생물학은 해부학·발생학·유전학·행동학·고생물학과 분자생물학을 통해 인간이 침팬지와 가장 가까운 것은 물론 인간과 침팬지의 공통조상은 인간과 원숭이의 공통조상보다 더 가까운 과거(약 600만년 전)에 살았으므로 결국 침팬지는 다른 보통 원숭이들보다 사람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리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이 먼 조상에서 토끼와 설치류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나온 <네이처>는 캘리포니아대학의 분자고생물학자 피터슨의 연구로 ‘진화 다시쓰기’를 대서특필하고 있다. 뒤늦게 발견된 마이크로 아르엔에이(RNA)를 분석한 결과 인간이 코끼리와 개, 소에 더 가까운 유연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인간의 기원에 관해서도, 종래엔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현생 인류가 유럽의 네안데르탈인을 절멸시키고 전 지구에 퍼진 것으로 이해되었으나 최근 중국과 시베리아에서 나온 화석을 연구한 결과 아시아인과 아프리카인의 혼합으로 현대인이 출현하였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처럼 과학은 새로운 방법론과 기술의 적용에 따라 검증되고 퇴출되고 또 정립된다.
일본의 우주선 하야부사호는 7년간 외계를 탐험하였고 미국의 보이저2호는 1977년에 발사된 이후 목성·토성·천왕성·해왕성에 대한 사진과 자료를 많이 보내왔다. 우주의 시초물질 힉스입자가 발견되고 인공 염색체로 디엔에이(DNA) 복제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은 인터넷 등도 모두 과학적 방법의 산물이다. 우리는 이제 과학의 본질과 진화생물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 인간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통찰을 심화하고 과학적 생명관과 우주관을 확립해야 한다. 마치 이슬람 여인이 쓰는 부르카의 눈구멍을 차츰 넓혀 시야를 더 넓혀가는 것처럼 말이다.
이병훈 전북대 명예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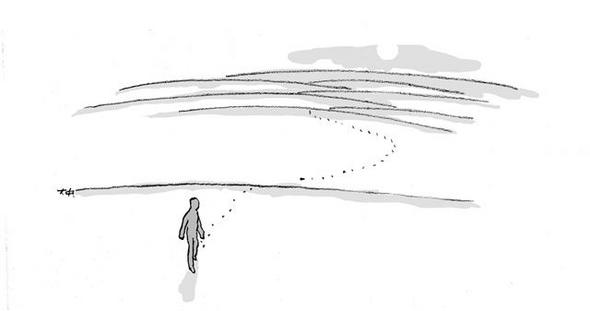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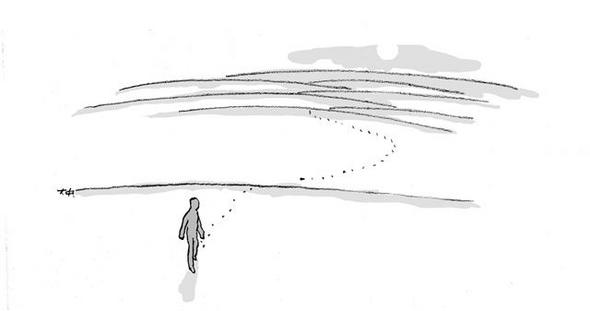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