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3.04.10 19:41
수정 : 2013.04.10 1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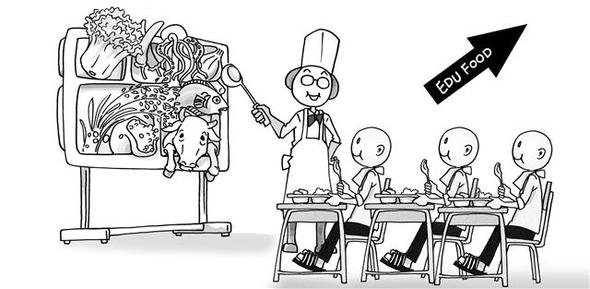 |
|
일러스트레이션 김선웅
|
학교 급식은 ‘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이라는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이 단순히 교육비 무료만을 뜻하는가. 무상급식은 ‘학교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학교 급식은 도시락을 대체하는 것이고, 단순히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도구라고 인식하는 관리자와 학부모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교육감이나 정치인도 급식을 ‘교육’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 ‘교육 정책’에 학교 급식은 없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실질적인 급식 교육 정책이 없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교육 급식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아무리 ‘학교 급식은 교육이다’,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떠들어도 급식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 정책이 없어서 현장에서의 급식이 교육 활동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급식 담당자가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다면 모두 어불성설인 것이다.
학교 급식으로 교육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학교 급식이라는 ‘텍스트’에 의해 가르침과 배움을 일으키려면 우선 담당자(급식자)와 학생(피급식자)이 ‘수업’ 등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교육 급식은 그들의 만남에 의해 서로를 구체적으로 앎으로써 그들과 소통 구조를 만들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교육은 학습자와 교육자의 주체적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교과에는 담당 교사가 있는 것이리라. 그런데 학교 급식 상황은 이런 기본적인 필요충분조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급식’이 교과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교는 급식 담당자를 교육의 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교과를 가르치는 것만이 교육의 다가 아니지 않은가. 또한 비교과에는 학교 급식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 급식은 1981년 법제화되어 32년의 긴 역사를 갖는다. 그리고 학교 급식을 수행하는 실무 주체는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로 이분화되어 있다. 교원 수급 정책 등에 따라 전국에 1만개가 넘는 급식학교에 모두 영양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의 극복은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문제는 급식이 비교과라는 것과 영양사가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생들과의 교육적 만남이 차단되는 것과 그런 구조에 문제의식이 없는 교육 관계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 급식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러나 담당자의 이원화가 교육 급식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매일 한끼 이상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누가 만들어서 자기 앞의 밥상이 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서는 결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에서 해마다 시달하는 학교 급식 기본방향은 급식 담당자로 하여금 다양한 교육 활동을 요구하지만 정작 학교는 이러한 교육 활동을 뒷전으로 미룬다. 따라서 기본방향에 열거된 일련의 교육 활동은 형식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되는 게 현실이다.
먹을거리란 인간이 자연을 만나는 매개물이다. 인간에게 밥이란 자연 순환의 원리, 생명 영속성의 원리, 서로 살림의 원리, 더불어 사는 지혜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신성물’이다.
교육은 개인을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길러내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따라서 교육이 사회적 관계, 역사적 맥락과 단절되어서는 실체가 없는 피상적인 교육이 될 뿐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려면 미래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학교는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와 영양교사를 교육의 한 주체로 세워야 한다. 학교 급식 담당자는 또다른 어머니, 즉 사회적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사랑과 감수성으로 학생과 소통하게 하라.
정명옥 경기 안양서초 영양교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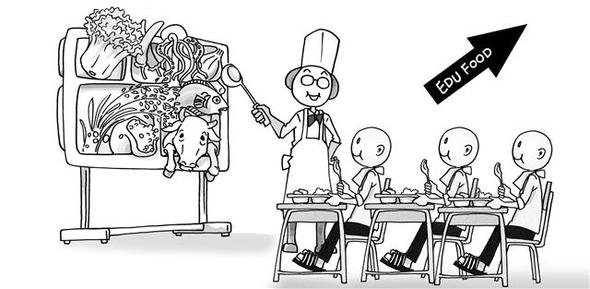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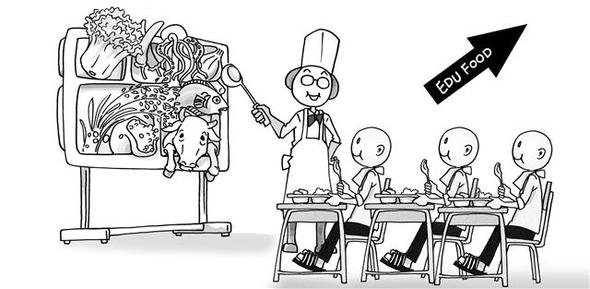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