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14 17:55
수정 : 2006.03.14 1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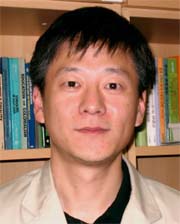 |
|
박종현 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
경제전망대
미국에서 1980년대와 90년대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시대로 기억된다.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미국인들의 복잡한 심정의 한 자락은, 마이클 더글러스가 피도 눈물도 없는 비열한 기업사냥꾼 ‘게코’로 출연한 영화 <월스트리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미국경제를 뒤흔들었던 대표적인 기업사냥꾼들로는 마이클 밀켄과 칼 아이칸이 있었다. ‘정크본드’의 황제 마이클 밀켄이 주식불공정 거래와 주가조작 혐의로 하루 아침에 월가의 영웅에서 사악한 범죄자로 전락해 버렸다면, 프린스턴 출신의 유태계 미국인 칼 아이칸은 재산을 78억달러로 불려 세계에서 53번째로 부유한 사람으로 살아남았다.
한번 노린 기업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상어’ 아이칸이 이번에는 KT&G(옛 담배인삼공사)의 경영권 인수에 나섰다. 전세계의 경제적 의제를 설정하고 여론도 주도하는 대표적 매체인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세계화’라는 시대정신과 철지난 ‘민족주의’간의 대립구도로 접근한다. 아이칸 측의 의도야 어떻든 적대적 M&A는 방만한 경영에 기강을 세움으로써 주주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반면, 자본의 국적에 집착하는 것은 국내 지배세력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줄 뿐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외국자본에 대해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자본시장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태도라거나, 경영진에게 우호적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좋은 외국자본과 나쁜 외국자본을 가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거나, 외국자본이 국내자본에 비해 더 투기적이라는 통념은 옳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그것이다. 근거도 박약한 ‘국익’이나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것은 가야할 길이 먼 재벌개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이 주장들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개방도가 높은 미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외국자본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의 주도로 아랍에미레이트 자본에 의한 항만운영권 인수를 저지시켰다. 프랑스와 룩셈부르크 정부는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미탈’이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 합작사인 ‘아르셀러’를 인수하려는 것을 공동으로 저지하고 있다. 특히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총리의 경우에는 ‘수에즈’ 등 자국기업에 대한 일련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대항할 수 있는 각종 경영권 보호장치를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경제적 민족주의가 세계화를 통해 애써 이루어놓은 진보의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대착오적인 것처럼 보이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발흥은 그동안 금융자본에 의해 진행되었던 세계화와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이 최고경영자와 금융전문가들만을 살찌우고 보통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하고 불안하게 만든 것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KT&G의 경영권 인수를 놓고 벌어지는 소란을 ‘좋은 국내자본’과 ‘나쁜 외국자본’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익’이라는 용어도 문제가 많기는 마찬가지다. 대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의식에 주목하고 싶다. 외환위기 이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금과옥조가 된 ‘주주가치 경영’을 근본적으로 되짚어 보면서, 회사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경영자인지, 주주인지, 노동자인지, 아니면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소유인지에 대해 지혜를 모아볼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이해당사자들간의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종현/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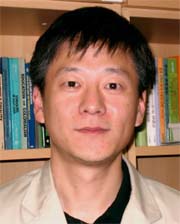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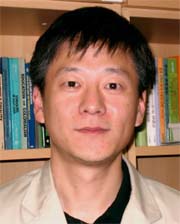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