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14 18:50
수정 : 2005.07.14 19:06
기고
근래에 ‘생태계 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야생동물을 자연으로 방사하는 일이 지자체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숲, 월드컵공원, 남산 등에 노루, 사슴, 고라니, 토끼, 개구리, 도룡뇽, 두꺼비 등을 방사하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북 순창군은 개구리를, 강원도 인제군은 사슴을, 양구군은 산양을 증식 복원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복원사업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 지자체나 동물원의 처지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사육·증식된 야생동물을 자연에 함부로 풀어놓는 일은 자칫 생태계 복원은커녕 심각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야생동물 방사에 있어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을 제정하여 각국 정부에 이를 충실히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한 방사사업은 3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는 타당성 검토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복원하고자 하는 야생동물종이 방사예정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방사할 개체들이 그 지역 환경에 오랜 세월 적응된 원래의 종 또는 아종과 유전적으로 혈통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외래종의 도입에 의하여 오히려 원래의 개체군을 유전적으로 ‘오염’시켜 멸종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방사할 개체들을 인위적으로 증식시키는 과정에서 근친번식에 의한 유전적 퇴화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두번째 실행단계에서 특히 위험한 일은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집중 사육·증식시키는 과정에서 외래성 병원체에 감염된 동물을 야생으로 풀어놓을 수 있고, 이들은 야생의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단 야생 생태계로 전파된 전염성 질병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외부에서 도입된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 생태계가 겪고 있는 혼란을 생각하면 외래성 질병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 규모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야생으로 방사할 개체들은 일정기간 철저한 검역과 질병검사를 실시하여 외래성병원체의 감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와 사스의 예에서 보듯, 야생동물 질병 중 상당수는 사람과 동물, 가축 사이에 전파될 수 있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는 단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다.
세번째 모니터링과 보고 단계에서는 방사한 동물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죽었다면 왜 죽었는지, 언제 얼마나 죽었는지, 또 생태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사후조사와 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시행될 다른 복원사업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멸절된 종을 복원시키고자 한다면,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행단계에서는 질병전파의 위험성을 고려해야 하며,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조사와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생태계 복원은커녕, 생태계 교란 또는 파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환경부는 야생동물 복원사업이 지자체나 동물원의 홍보나 단기적 업적 과시 또는 잉여동물의 처분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야생동물의 방사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적 지침을 하루속히 만들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항/서울대 수의대 교수 야생동물유전자원은행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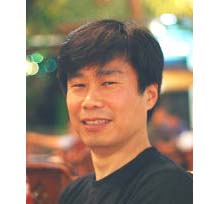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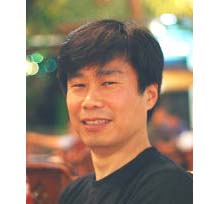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