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0 21:16
수정 : 2005.07.20 21:17
김효순칼럼
중앙 언론사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지 않는 편이었던 홍석현 주미대사는 현지 부임 뒤에도 특파원들과의 만남을 마다지 않는 것 같다. 그는 최근 일부 특파원들의 비공식 모임에서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할 의향을 밝혀 논란을 빚었다. 대사로 나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음 경력관리에 나설 생각을 하니 지나치지 않으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그는 자신의 발언이 기사화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이나, 모임의 성격이 어떠하든 언론의 생리를 아는 그가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것은 자신감의 표현인지 모르겠다.
그는 지난봄 워싱턴에서 특파원들을 만나 비보도를 전제로 지난 대선 때의 상황이나 대사직을 맡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얘기를 했다. 발언의 일부는 현지 동포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명문학교를 나오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자신을 귀족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주문하면서 초등학교 재학 중 부친이 사형선고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홍 대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가 극형을 아슬아슬하게 면한 수감자의 아들이었다는 생각을 한 순간이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홍 대사같이 남이 보기에는 부러운 게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은 지울 수 없는 상흔을 남겼겠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들었다.
홍 대사의 부친 홍진기씨의 삶은 우리 현대사를 기술할 때 빼놓을 수 없다. 일제 때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 판사를 했으며, 자유당 정권 말기에 법무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지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뒤 발포명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구형을 받았으나, 선고된 형은 징역 9개월이었다. 그는 5·16 쿠데타 이후 설치된 군사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형으로 떨어졌고 나중에 특사로 풀려났다.
정치적 격동이 심했던 이 나라에서는 권부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각해 갇히는 몸이 되는 일이 수없이 있었다.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몸으로 겪는 여파도 간단치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행세도 한번 부리지 못한 서민들이 옥에 갇혀 처형이 됐다면, 그 가족들은 어떤 고난을 거쳐야 했을까? 2차 인민혁명당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이 말하는 개별적 경험은 글로 옮겨쓰기도 괴롭다. 동네 아이들이 간첩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며 아이의 목에 새끼줄을 걸어놓고 끌고 다녔다고 하는 처절한 사연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다.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정보기관에 끌려갔다가 1년 만에 주검으로 돌아온 것을 본 40대 중반의 한 교수는 “그날 이후 나의 삶은 늘 절뚝거렸다”는 말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기록된 그날의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벌써 30년이 지났다. 오늘 인혁당 사건의 재심 여부를 따지는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하도 당하고만 살아온 사람들은 쉽사리 희망을 갖지 못한다.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한 아픔이 훨씬 크다는 것을 계속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희망을 걸어야 한다. 간첩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았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함주명씨 사례도 있다. 비록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정의는 살아있는 것이다.
에이즈를 앓는 변호사가 부당한 해고에 맞서 제기한 법정소송을 다룬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주인공 앤드루 베킷은 법의 무엇이 좋으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한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따금 정의가 실현되는 데 참여할 수 있다”고.
김효순 편집인
hyoskim@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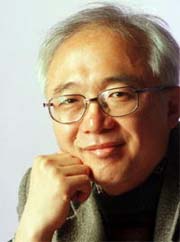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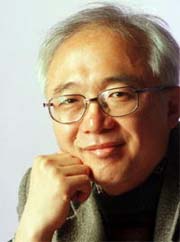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