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07.26 18:00
수정 : 2005.07.26 1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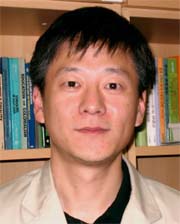 |
|
박종현 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
경제전망대
후배로부터 공선옥의 <유랑가족>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여러 달 전의 일이다. 최근에 읽은 책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독후감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신산한 삶을 소설로까지 접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었는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금은 밀린 숙제를 하는 심정으로 손에 들게 되었다.
작가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눈앞에 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난의 모습들을 일체의 감상을 배제한 채 더없이 건조하게 기록하면서도, 때로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살갑게 풀어놓는다. <유랑가족>을 읽으면서 소설 속의 인물들이 팍팍한 가난 자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서로간의 사랑과 신뢰로 그 가난을 견뎌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실낱같은 기대를 갖고는 했다. 그러나 작가는 마지막에 가서는 매번 주인공들에게 드리워진 희망의 실타래를 끊어버림으로써, 이 세상살이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을 새삼 환기시킨다.
최근 우리나라의 빈곤인구가 6백만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실태조사 결과가 제출되기도 했다. 국민 8명 중 1명이 가난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시장경쟁의 논리가 강화되는 양극화된 세상에서는 중산층도 결코 가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은 언제부턴가 타인의 가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과 귀를 닫아버리고 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젊은이들의 필독서였던 그 시절은 아득한 옛일이 되어 버린 채, 가난을 정면에서 부여안는 소설들이 오늘날에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며칠 전 경제부총리는 빈곤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재경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장논리의 본산인 재경부가 가난의 문제를 직시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말이 곧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이 곧 성과로 이어지는 것 또한 아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막지 못한다”는 옛말처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가난에 대한 실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은 공허하거나 위선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부총리를 비롯한 재경부 관리들에게 공선옥의 <유랑가족>을 꼭 권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가난이 결코 사람들의 게으름과 무책임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의 결과가 아니며, 약육강식의 논리와 배금주의만을 좇는 타락한 사회의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는 점을 직접 느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또한 가난이 사람들을 얼마나 황폐하고 난폭하며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알아볼 필요도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더라도 그러한 행동이 시장경제 속에서 행해진다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의 전제조건으로서 ‘공감’의 중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되, 타인의 처지에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만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스미스의 진정한 교훈인 것이다.
70년대와 80년대는 덜 민주화되고 더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가난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난쏘공>을 함께 읽었다는 점에서 훨씬 희망이 있었던 시대였다. 모든 사람들이 <유랑가족>을 읽는다고 해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 소설을 함께 읽는 세상이라면, 지금보다 조금은 더 살맛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박종현/국회도서관 금융담당 연구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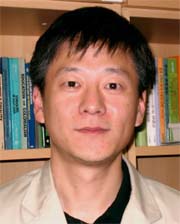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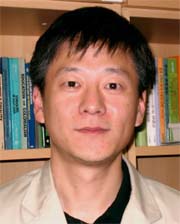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