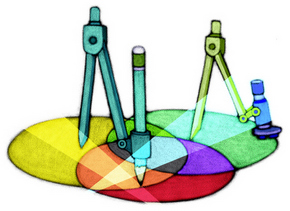 |
|
과학과 인문학, 더 넓은 세상으로. 김영훈 기자
|
2020을 보는 열 가지 시선 ⑨ 이과-문과의 간극보다 더 심각한 ‘두개의 문화들’
그동안 과학과 인문학의 간극, 이과와 문과의 간극이 빚어내는 ‘두 문화’의 문제가 자주 지적됐다. 두 문화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 보자. 두 문화의 간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혹시 두 문화 문제를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자기 울타리 너머의 세상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과 자기 학문을 연계해 생각한다면
두 문화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 ‘두 문화’는 영국의 작가이자 과학자인 찰스 퍼시 스노(1905~80)가 1959년 케임브리지대에서 했던 강연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라는 두 학문 세계의 괴리를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과 인문학 사이의 간극, 이과와 문과 사이의 간극이 빚어내는 두 문화의 문제가 자주 지적되었다. 아마 두 문화의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일반적인 명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져 보자. 두 문화 사이의 간극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혹시 두 문화 문제를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실용학문과 순수학문의 두 문화 지금 대학을 지배하는 또다른 ‘두 문화’는 ‘잘나가는’ 실용적인 학문과 ‘별 볼 일 없는’ 순수 학문 사이의 간극이다. 대학마다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고,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을지는 몰라도 자연과학 역시 형편이 좋지는 못하다. 인문대학은 공무원 시험과 법학대학원 준비를 하는 학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자연대학의 우수한 학생들은 의학·치의학·약학 전문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전문대학원 진학을 꿈꾸지 않는 학생 중에는 실용적인 학과로 전과를 노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외치고, 과학자는 연구비 증액을 요청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로 가시적인 성과도 있다. 한 학기 수강료가 1000만원이 넘는 서울대의 인문학최고과정은 문학·역사·철학에 대한 명강의를 들으려는 최고경영자(CEO)들로 북적댄다. 물리, 화학, 생물 같은 자연과학 분야는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좋은 학술지에 출판되는 논문을 주도한다. 과학 분야의 논문은 대학의 이름을 알리고, 대학의 순위를 올리는 데 효자 노릇을 한다. 또다른 두 문화, 학문과 상식의 간극 이 와중에서 발생하는 또다른 ‘두 문화’는 이해할 수 없이 복잡하고 어려운 대학의 학문과 시민들의 상식의 괴리이다. 대학교수들은 동료 학자들에게서 높이 평가받는 연구에 매진한다. 자연과학의 연구가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된 지는 수백 년이 됐는데, 지난 100년 동안에 인문학의 연구도 비슷해졌다. 19세기만 해도 인문학자들은 넓은 독자를 대상으로 책을 저술했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역사와 철학, 문학비평 분야에서 인문학 학술지가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인문학자들의 주요 출판 형태는 책에서 동료 연구자를 위한 논문으로 바뀌었다. 인문학 분야의 논문은 과학과 비슷하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문제를,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를 써서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금의 대학은 논문 공장이다. 인문학과 과학 양쪽 분야에서 학자들은 동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문을 쓰고, 그 속에서의 평가에 만족해한다. 학자들의 연구는 세상에 닻을 내리지 못한 채, 학문 공동체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변용된다. 학자들은 서로를 인용하고 서로를 만족시키는 데 즐거워하면서, 전문 분야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진다. 과학사와 과학사회학 분야에서 여러 문제작을 펴낸 과학사학자 스티븐 섀핀에 의하면, 요즘 학자들의 이런 ‘과다 전문화’(hyper-professionalism)는 자신의 연구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얘기한다는 감”(aboutness)이 상실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저마다 학문의 울타리 쌓기가 큰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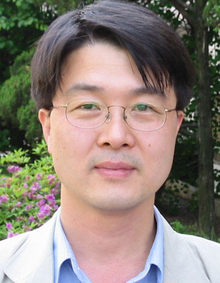 |
|
홍성욱 서울대 교수(과학기술학)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