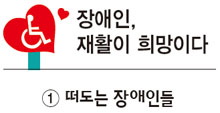 |
[장애인, 재활이 희망이다] ① 떠도는 장애인들
건보 수가 3개월 지나면 줄어 병원서 기피
“시설 좋은 재활병원은 기다리는데 수개월”
“뇌성마비 아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지방의 한 복지관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작해, 서울의 큰 병원들까지 모두 다녀 봤습니다. 오래 있으면 병원에서 퇴원을 하라고 하니까요. 지금 치료받는 병원도 마찬가지겠지요.”
3살 때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11)의 재활치료를 위해 지난 4월 전북에서 경기도의 한 재활병원으로 올라온 이아무개(56)씨는 한숨과 함께 눈물을 훔쳤다. 아들이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뒤 남편이 숨진데다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 이씨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자연히 시골의 집과 논밭을 모두 팔았고, 소득이 없어 어느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됐다. 이씨는 “아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손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말도 좀 하고 컴퓨터 자판을 누를 수 있어 의사표현에는 문제가 없다”며 “학교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해, 전교 10등 안에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
|
국내 한 재활병원에서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 병원처럼 시설이 잘 갖춰진 재활병원은 매우 적어, 치료를 받으려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한다.
|
그러나 이씨는 지금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기초생활급여로 한 달에 45만원가량 나오는데,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치료가 많아 대부분이 병원비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씨는 “아들이 수영이나 언어치료를 받으면 몸의 움직임이나 언어 표현력이 확실히 좋아진다”며 “하지만 한 번에 3만5천원씩이나 하는 언어·음악·수영치료 등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
장성석 대한재활병원행정관리자협회장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돼 있는데다 재활 의료기관마다 치료·시설·인력 등에서 질적 차이가 커 환자들이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김소연 기자 himtrain@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