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6.05 16:21
수정 : 2015.06.05 18:05
자연과 맞서 싸우는 한 인간의 광기를 묘사한 미국 소설
작가가 실제 포경선원으로 일한 경험을 그대로 옮겨놔
조개로 대충 만든 차우더, 거칠지만 진실한 뱃사람이 겹쳐져
 |
|
한스미디어 제공
|
“오 사랑하는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것은 밤톨만큼 작지만 즙이 많은 조개에다가, 건빵 가루와 소금에 절여 얇게 썬 돼지고기를 섞고, 버터를 넣어 풍미를 더한 다음, 소금과 후추를 넉넉히 간을 맞춘 요리였어. 모두 추위에 떨며 항해한 뒤라서 식욕이 왕성해져 있었고, 특히 퀴퀘그에게는 앞에 놓은 것이 제일 좋아하는 해물요리였던데다, 그 차우더는 놀랄 만큼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지...숟가락을 부지런히 그릇으로 가져가면서 나는 지금 속으로 이것이 도대체 머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나 하는 건지 생각해본다. ‘차우더 머리를 가진 사람(바보란 뜻)’이란 그 멍청한 속담은 뭐지?”
-허먼 멜빌 <모비딕>
모비딕(1851년)을 쓴 미국 소설가 허먼 멜빌은 실제 포경선의 선원으로 일했다. 포경산업은 전기가 개발되기 전까지 서구의 주요한 에너지 산업이었다. 고래기름은 전기가 발명되기전 조명등으로 널리 쓰였기 때문이다. 멜빌이 포경선에서의 경험을 어찌나 생생하게 묘사했던지 오랫동안 이 소설은 문학이 아니라 고래학 즉 생물학 책으로 분류될 정도다. 멜빌이 묘사한 포경선 선원들의 크램 차우더는 조개국물에 버터로 볶은 고기와 야채를 넣고 우유를 부어 끓인 스프로 서양식 조개탕이라고 할 수 있다.
무시무시한 흰고래 모비딕을 찾아 5대양을 미쳐 헤매던 포경선 피쿼드 호의 선원들이 바닥까지 긁어가며 먹었던 크램차우더는 우리가 해마다 봄에 바지락 된장국을 먹을 때 느끼는 것처럼 이들에게 혀가 아니라 뼈에 새기는 소울푸드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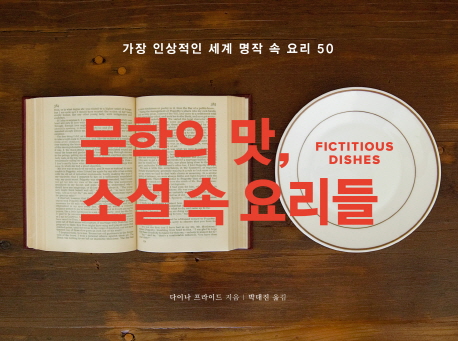 |
|
이 책은 ‘모비딕’ 등의 세계 명작 소설 50편에서 묘사한 식탁의 모습을 재현해 문학의 향기를 맛의 원소로 환치해 보여준다.
|
<문학의 맛, 소설 속 요리들>(한스미디어 펴냄)에서 여성작가인 다이나 프라이드가 재현한 <모비딕>의 차우더는 ‘여자는 뱃사람이 될 수 없다’는 당시의 뱃사람 풍습을 고려해보면 여성적으로까지 보인다. 아마 실제 그 당시 거친 뱃사람들이 먹었던 차우더는 찌그러진 주석 따위의 금속 접시에 개죽처럼 차우더가 넘칠 듯 담겼을 것이고, 물이나 차 대신 버번(옥수수로 만든 미국식 위스키)이 옆에 병째 놓여 있었을 것이다. 옆에는 갈고리나 칼 따위도 뒹굴고...하지만 모비딕이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바다와 맞서는 선원들의 초라한 한끼는 무엇을 좇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허덕이는 우리의 식탁보다 어쩐지 더 풍성해보인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section _ H : 페이스북 바로가기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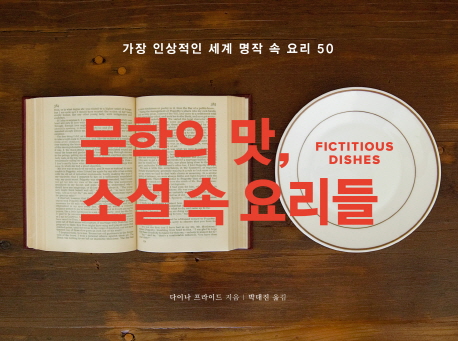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