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곤의 먹기살기/음식오행학
밤과 낮의 길이가 같은 춘분(春分)이다. 봄기운이 완연하지만 음력으로는 이제 2월의 초입이다. 농가월령가 이월령에 보면 “산채는 일렀으니 들나물 캐어 먹세. 고들빼기 씀바귀요 소로장이 물쑥이라. 달래김치 냉잇국은 비위를 깨치나니 본초를 상고하여 약재를 캐오리라.” 여기서 ‘비위를 깨친다’함은 겨우내 움츠려 있던 소화기관을 깨어나게 한다는 뜻. 비록 동면은 하지 않지만 묵은나물 밑반찬에 의존하여 겨울을 난 우리몸에 새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다. 이것은 봄의 시작을 상징하는 입춘에 다섯가지 향이 강한 오신채를 먹어 오장(五臟)을 깨우는 것과 같은 이치다. 냉이는 들이나 밭에서 흔하게 자라서 국이나 나물로 즐겨먹는 이월의 대표절식으로 나생이·나숭게라고도 불린다. 이른 봄부터 캐서 겉절이나 국 또는 전으로 먹고 4~5월이 되어 30~40센티미터로 자라 흰꽃이 피면 화전에 장식으로 사용한다. 또 다 자란 냉이줄기를 말려 가루를 내면 국수 반죽을 할 때나 양념장에 첨가하는 천연조미료가 된다. 밥과 김치가 주식인 우리민족에게 냉이는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로 겨울을 난 뒤끝을 이어주는 같은 배추과 식물. 우연이 아니다.
 |
|
냉이
|
 |
|
떡국
|
 |
|
오곡밥
|
 |
|
달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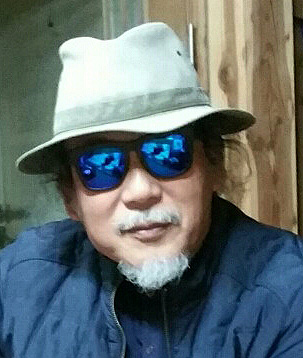 |
|
김인곤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