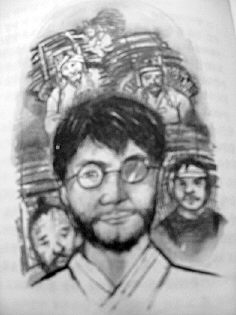 |
|
이보한 (1872~1931)
|
⑭‘거지대장’ 이보한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 전북 전주에 가면 장터 어귀에서 애꾸눈 거지대장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가 들릴 것만 같다. 늘 이 찬송을 불렀기에 거두리로 불렸던 이보한(1872~1931). 그가 죽자 거리의 걸인들이 상여를 붙들고 울부짖었고, 만장의 행렬이 무려 10리나 이어졌으며, 걸인과 나무꾼들이 한 푼 두 푼 성금을 모아 거리에 비석을 세워주었다는 전설의 인물이다. 그가 다닌 완산구 다가동3가의 ‘호남 최고’ 전주서문교회에서 서승(65) 전주문화원장과 이용엽(67) 전북역사문화학회 부회장이 한 기인의 생애를 전한다.
 |
|
지난 4일 전북 전주 서문교회 앞에서 이용엽 전북역사문화학회 부회장(왼쪽)과 서승 전주문화원장이 이거두리의 자취를 전하고 있다.
|
만세운동 체포되자 ‘주모자는 하나님이오’ 일갈 그는 총명했다. 그래서 선교사들로부터 어깨너머로 배운 영어를 미국인 못지않게 구사할 수 있었고,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정도로 교회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가 친구의 부친으로 세도가인 진사에게 예배당에 나올 것을 권했다. 진사는 거두리가 수차례 권면하자 “자네 체면을 봐서 다음주엔 나감세”라고 말했다. 그래놓고는 이웃 고을의 절로 휴양을 떠나버렸다. 거두리가 절까지 찾아가자 진사는 “이번주엔 눈이 너무 많이 쌓였으니 다음에 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거두리는 “제가 눈을 좀 쓸어놓았으니 쓸어놓은 곳까지만 가주시라”고 했다. 진사는 절 입구까지나 쓸었으려니 하고 따라나섰는데, 가도 가도 끝이 없었다. 거두리가 밤새 수십릿길의 눈을 쓸어놓았던 것이다. 그의 영혼 구원은 ‘전도’의 차원을 넘은 것이었다. 그는 고통받는 동포를 구하고, 굶주리는 민초를 구원하고자 했다.
3·1 만세운동 때는 서울에 갔다가 만세를 불러 경찰서에 끌려가고 말았다. 그런데 거두리는 태연하게 주모자를 알려주겠다고 자청했다. 마침내 특별 대접을 해주며 취조에 나선 서장이 주모자가 누구냐고 묻자 거두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서장이 화를 내며 주모자가 어디 사느냐고 묻자 “구만리장천이 모두 그분의 집”이라고 했다. 죽도록 뭇매를 맞은 거두리는 그 뒤 아무데나 오줌을 갈기고 벽에 똥칠을 해서 ‘미친놈’으로 치부돼 방면됐다. 그런데도 전주에 와선 아무도 의심치 않는 걸인들의 품에 숨겨 태극기를 장터로 옮긴 뒤 또다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그는 스스로 걸인이 되어 걸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술을 마시고, 품바타령을 하면서 그들을 돌봤다. 3·1운동 때 ‘전라도 청년회장’이자 재치와 기백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거두리를 전주의 거부와 명사들은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서자와 애꾸눈이라는 개인적 상처와 망국민이라는 민족적 상처마저 넘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치유자였다. 거두리가 군산에 가려고 배를 타는데, 사공의 한쪽 눈이 없었다. 거두리는 부채로 자기의 한쪽 눈을 가린 채 사공을 보며 “그 자식 눈도 더럽게 멀었네!”라고 말했다. 평생 눈총을 받은 것도 서러운데 욕까지 먹자 분통이 터진 사공은 낫으로 찍어버리려고 거두리에게 달려들었다. 그러자 거두리가 “자슥아, 눈이 멀려면 이렇게 멀어야지” 하면서 눈에서 부채를 확 떼는 게 아닌가. 사공은 확실히 곯아버린 거두리의 눈을 보고는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거두리와 사공, 그리고 배에 오른 모든 사람들이 배꼽이 빠지도록 웃어제꼈다. 묵은 설움과 상처를 다 날려버리려는 것일까. 전주의 하늘 아래로 거두리의 시원한 웃음 같은 하늬바람이 불고 있었다. 전주/글·사진 조연현 종교전문기자cho@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