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 사이에서 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둘러싼 다양한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싱크탱크 광장] 버스 공공성 강화 논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버스공영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발단은 경기도이지만 호남, 영남 등 여러 지역으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핵심은 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버스공영제에서 시작된 논의는 무상버스로, 시민들의 교통편의 확대를 넘어 자유로운 이동권이라는 교통복지로 지평도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교통수단 중에서도 왜 버스의 공공성인지, 버스의 공공성 확보는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무상버스는 무모한 공약인지, 아니면 좀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치적 상상력의 산물인지를 짚어본다. ■ 왜 버스 공공성인가? 버스 공공성 논의가 경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경기도 인구 중 125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지만 철도·지하철의 교통분담 비율은 9%에 불과하고, 버스가 29.8%, 승용차가 47.8%로 거의 과반에 이른다. 이에 비해 서울은 지하철, 버스, 승용차의 교통분담률이 각각 36.2%, 28.1%, 24.1%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교통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철도 및 지하철 확충 방안이 주요 내용이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는 지티엑스(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건설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경기도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일찍이 경기하나철도(G1X)를 제기했다. 그런데 원혜영 의원(민주당)이 버스공영제를 제기하고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발표하면서 버스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왜 철도가 아닌 버스인가? 버스의 공공성 확보는 왜 중요한가?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지난 28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사)생활정치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서 한국에서는 대중교통보다 자가용, 버스보다 지하철이 우선시되어왔는데 이는 토건의 논리가 작동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십조원이 드는 지하철과 철도 건설 등 토건사업은 큰 문제 없이 받아들여지면서도 이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대중교통을 개선할 수 있는 버스공영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외면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시 경전철을 만드는 데 1㎞당 약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85㎞를 건설하는 데 8조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도 G1X의 경우, 기본 건설에 5조원, 환승설비에 5조원, 10조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듯 수십조 단위의 대중교통 토건사업이 준비되고 있는데, 약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버스공영제를 위한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버스와 철도 모두 공공재로서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하지만, 버스는 이미 도로라는 인프라 위에서 추진되므로 버스공영화가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
교통편의 확대 넘어 복지 차원으로 수십조원 드는 지하철, 철도보다
기존 인프라 쓰는 버스 경제성 부각 공영제는 운영비용 문제가 걸림돌
준공영제는 버스업주에 절대 유리 경영 평가 통해 도덕적 해이 막고
시민 이동권 차원서 논의 이뤄져야 버스 노선은 사실상 버스회사의 사유재산에 가깝다. 버스사업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는 만성적 문제다. 버스회사가 ‘영생기업’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결과 원가 상승과 버스재정지원금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 준공영제가 지속가능할지도 의문시되고 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준공영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현재의 준공영제가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핵심은 노선의 공공 소유와 버스회사의 책임성 강화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행정법제실장은 “신설 노선에 대해서는 (기한이 정해진) 한정면허를 부여하고, 기존 노선의 회수를 위한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운영 적자에 대한 무한책임을 유한책임으로 전환해 버스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서비스 경영 평가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인센티브와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상버스, 어떻게 볼 것인가? 김상곤 전 교육감이 무상 대중교통 공약을 제기하면서 공영제 등 버스 운영방식을 둘러싼 논란은 무상버스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옮겨졌다. 김상곤 전 교육감이 ‘교통복지 실현’을 명분으로 버스공영제와 65살 이상 노인, 초등·중학생 등부터 단계적 무상버스 실시를 내세우자 한편에서는 ‘공짜 버스’라는 선동적 반박이, 다른 한편에서는 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쟁점을 가격논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무상버스가 경기도민에게 시급한 복지 서비스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하루 125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경기도에서는 ‘요금’보다 노선 확충, 버스 증대 등의 서비스 확대가 더 시급하고 중요한데, 그야말로 초점이 틀렸다는 얘기다. 하지만 무상버스 공약이 교통 서비스 개선 차원을 넘어 교통복지와 자유로운 이동권으로 논의를 확대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미 미국의 뉴욕, 프랑스의 오바뉴 등 외국 도시들은 물론 국내에서도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무상버스가 시도되고 있는 마당에 전혀 불가능한 기획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무상 교통은 시민적 이동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담한 상상력”이라고 평가했다. 한귀영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hgy4215@hani.co.kr [관련영상] 뜨거운 감자 ‘무상버스’공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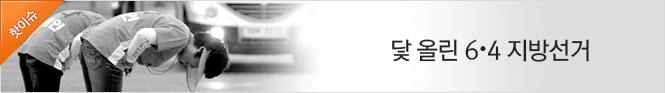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