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하늘’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해왔다. 우주기원적 사유는 무한의 전체를 인식하려는 유한한 인간이 지닌 태생적 ‘비극의 조건’일지 모른다. 한겨레 자료사진
|
그래서 설득력 있는 모델을 만든다
이는 비극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아주 드문 일 중의 하나이다” <최초의 3분>은 당시 우주 탄생의 ‘표준모델’로서 인정받기 시작한 ‘빅뱅 이론’에 “우주의 내용물에 대한 훨씬 더 상세한 처방을 보충”해서 대중들을 위한 교양과학서로서 쓰여진 것이지만, 사실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소립자물리학계에서 영향력 있는 학자였던 와인버그가 이 책을 씀으로써 그때까지만 해도 비교적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던 초기우주론이 입자물리학의 연구 주제로 부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사상사적 관점에서 보면, 빅뱅의 가설에 기초한 초기우주론은 고대철학의 전통과 현대과학의 특성이 과학적 성과 안에서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고대철학자들의 주된 관심은 ‘아르케’ 곧 세상의 ‘원리’를 탐구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아르케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을 함께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말의 일반적 쓰임새에서뿐만 아니라 철학적 의미로도 그랬다. 즉 ‘세상의 시작’을 아는 것은 ‘세상의 원리’를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도 어떤 것이 언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그것의 핵심을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현대과학은 ‘시작의 가설’을 관찰과 실험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과학적 성과로서 인정을 받는다. 와인버그도 빅뱅 이론이 표준모델로 받아들여진 것은 “철학적인 유행이나 천체물리학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 우주배경복사의 실측이라는 “실험 데이터의 압력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제 좀 더 심층으로 들어가서, 앞서 언급한 ‘시작’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왜 철학과 과학은 이 세상과 인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굳이 우주 모델을 정립하려고 노력해 왔는지 묻게 된다. 그것은 ‘전체를 한 눈에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탐구자로서 인간은 되도록 완벽한 이해를 위해 ‘전체를 보고자’ 한다. 전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우주이다. 그리고 그것을 ‘한 눈에 보고자’ 한다. 그 방식은 설득력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고대인들이 우주를 본다는 것은 지구에 발붙이고 하늘을 본다는 뜻이며, 현대과학자는 우주 모델 안에 담긴 전체를 볼뿐이다. 이는 결코 전체를 한 눈에 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과 희망 아래 탐구는 지속되며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늘’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철학적 사유와 과학적 탐구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해왔다. 하늘을 보고 사색하며 걷다가 우물에 빠졌다는 탈레스의 일화로 대표되는 ‘우주기원적 인간의 사유’는 철학자에 대한 풍자를 훨씬 넘어서는 학문의 기원에 대한 의미심장함을 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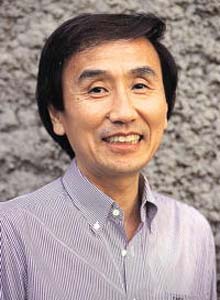 |
|
김용석/영산대 교수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