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30 17:43
수정 : 2006.07.31 18:34
하늘의 법칙을 찾아낸 조선의 과학자들
조선시대 문종 임금이. 실은 과학자였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세종 임금의 아들이자 당시 왕세자였던 이향(문종)은 동생인 이구(임영대군)와 왜구를 물리칠 새로운 무기를 고안합니다. 이 무기는 나중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큰 몫을 했지요. 그러나 문종이 정말 관심있었던 것은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기상 관측법’이었답니다. 그는 왕세자 시절부터 왕 위에 오른 뒤까지, 줄곧 ‘일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을 전국적으로 정확히 관측하고, 그 결과를 농사에 활용할 수 없을까’하는 고민에 매달렸어요. 세계 최초의 우량계인 ‘측우기’는 이렇게 만들진 것이죠. 서양이나 중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일찌감치 ‘기상학’이 발달했던 거예요.
<하늘의 법칙을 찾아낸 조선의 과학자들>에는 이 밖에도 우리가 몰랐던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있어요. 서양의 코페르니쿠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러나 변변한 망원경도 없이, 성리학의 이치를 토대로 ‘지구는 스스로 돌고 있다!’며 무릎을 쳤다는 김석문은 어떤가요. 그가 남긴 <역학도해>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행성들의 그림과 태양계 행성의 크기를 자세히 비교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뛰어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이순지는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해 우리만의 달력을 만들었고요, 우리 땅과 기후에 맞는 농사법을 조사하고 실험해 <농사직설>을 펴낸 정초는 ‘과학 영농’의 물꼬를 텄지요. 개인 천문대를 설치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낸 홍대용은 또 얼마나 위대한 과학자인가요.
이 책을 보면, 관찰과 통계, 실험을 기반으로 한 ‘과학’이 서양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농업이 국가의 근간이었던 조선에서, 하늘의 법칙과 이치를 찾아 내어 백성의 살림살이를 도왔던 과학자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이기까지 하답니다. 글을 쓴 고진숙씨는 천문기상학을 전공했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 인물이나 옛 이야기 등을 발굴해 소개하는 어린이책을 꾸준히 써 온 사람이예요. 고진숙 글·유준재 그림. 한겨레아이들/9500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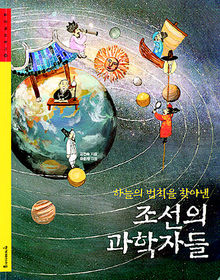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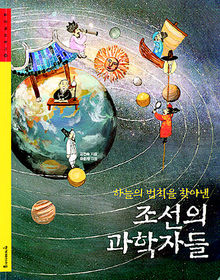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