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알듯 말듯 모호하기 짝이 없는 말로 기억되는 사람, 성철 스님. 이름의 무게가 너무 나가는 탓일까, 그를 제대로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러나 불교계의 거두 정도로만 기억하기에는 그가 남긴 감화와 정신이 한량없다. 성철 스님은 종교인이기에 앞서 진정한 성자였다. 마하트마 간디가 평생 최소한의 의식주로 살았듯이 성철 또한 근검절약에 엄격했다. 양말도 손수 기워 신었고 누더기 된 장삼도 40년간 그냥 입었다. 중생들의 보시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였다. 또한 늘 남을 생각했다. 그는 불공의 대상이 부처님이 아니라고 했다. 모든 중생이 불공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승려들이 목탁 치고 부처님 앞에서 신도들의 명과 복을 빌어주는 것이 불공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것이 참다운 불공이라고 강조했다. 민중과 중생을 위해서 그는 가족도 멀리 했다.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다 보면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진짜 진리를 찾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중이란 가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칭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머쓱하게 하는 한 마디가 아닐 수 없다. 중생을 앞서 생각하는 성철 스님은 수행에 있어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도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되지 않았는데도 참선을 시작한 지 42일만에 동정일여(앉으나 서나, 말할 때나 말하지 않을 때나 상관 없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의 경지에 들어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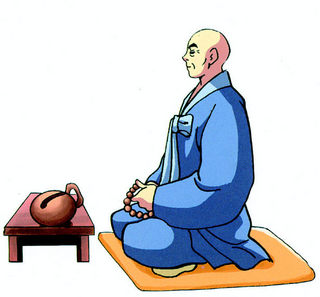 |
책을 읽다 보면 성철 스님과 함께 테레사 수녀, 마하트마 간디, 알버트 슈바이처 등의 성자들이 자꾸만 겹쳐 떠오른다. <만화 성철 큰스님> 원택 스님 글, 이태수 그림. 열린박물관/전 2권, 각 권 9800원.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