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10 16:52
수정 : 2006.09.11 13:39
‘가르치는 ’ 시는 얼마나 지겨운가
삶이 가득 한 밥 한공기 돌려 ‘읽자’
1318책세상
우리 집 밥상
요즘 시를 읽는 어른을 찾아보기 참 힘들다. 사는 게 각박해지고 바빠지면서 시를 읽는 것은 한낱 사치에 불과한 것일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시를 교과서에서나 만나고 시험 대비용으로 낱낱이 분해하여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시는 골치 아픈 존재이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시 속에는 애매한 슬픔과 그리움, 난해한 비유와 표현, 삶과는 동떨어진 이미지가 잔뜩 숨겨져 있을 뿐이다. 국어 선생님이 되어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것이 시였다. 시를 ‘가르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래서 아이들을 무조건 시의 바다에 빠뜨리기로 했다. 도서실에 데려가서 맘에 드는 시 한 편을 골라 몇 번이고 읽고 공책에 옮겨 적고 자신의 생각도 써 보게 했다. 시를 읽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시 속에 얼마나 사람과 물건들을 향한 따스한 애정이 담겨 있는지, 시를 읽으며 내가 미처 생각하거나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될 때 얼마나 즐거운지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게 하고 싶어서였다. 시가 노래로 만들어져 감미롭게 흐르는 도서실에서 아이들은 맘에 드는 시를 찾으러 이리저리 시집을 뒤적였다. <우리 집 밥상>(창비 펴냄)은 아이들이 발견해 낸 좋은 시가 많이 담긴 시집 중 하나이다.
우리 농촌과 환경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 운동을 하고 있는 시인의 ‘삶이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오롯이 담아 낸 동시 모음집이다. 그림책은 학교에 가기 전 유아들이나 읽는 것이라는 편견을 갖는 것처럼, 동시는 아이들이나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 담긴 60편 넘는 시들은 모두 어른이 읽어야 더 생각할 게 많은 시들이다. 그에게 있어 시는 어렵고 멋진 말들의 향연이 아니라 삶의 진솔함을 담아내는 그릇이다.
“산밭에서 고무마싹을 심다가 잠시 쉴 틈에 쓰기도 하고, 논에 모를 심다가 바람이 하도 시원하고 고마워서 쓰기도 하고, 잠자리에 들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쓰기도 하고, 소 팔고 난 다음날 정자나무 아래 혼자 앉아 울면서 쓰기도 하고…” 시인의 삶은 그대로 시가 되었다. 시집 속에는 우리가 잊고 사는 마을이 있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지키며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과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아간다.
정을 잃어가는 아이들, 부모 자식 사이도 예전만큼 끈끈하지 않고 이해타산적으로 변해 가는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만들어 갈 미래의 모습이 가끔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식어 가는 가슴을 따스하게 덥히는 일이 아닐까 싶다. ‘시 300편을 읽으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고 공자님도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삶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시집 한 권을 가족끼리 돌려 읽으며 부모는 아이에게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얘기하고 아이들은 ‘누가 죽어야 안 가도 되는 학원’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녁 우리 집 밥상으로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가득한 밥상 대신 “흙 냄새 풀 냄새 땀 냄새 가득하고 고마우신 분들 얼굴 떠올리는” 밥상을 아이들에게 차려 주자.
송경영/전국학교도서관담당교사서울모임 회원, 서울 관악중 교사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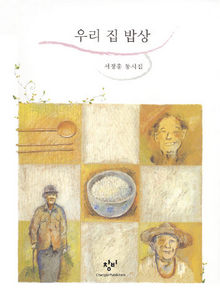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