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삶과 연결된 인문학 공부는 자신의 선택에 당당하고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준다.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제공
|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심한기 대표
현장 경험 기반으로 삶과 연결짓는 공부 해
문화적 상상력·인문적 사유 기를 수 있어
청소년문화공동체 ‘품’의 심한기(46·사진) 대표는 벌써 20년째 단체를 이끌고 있다. 서울 강북 지역을 기반으로 대안적 청소년 복지와 청소년 문화운동을 치열하게 펼쳐왔다. 10대들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년6개월간 ‘인문학교’의 교장을 맡기도 했다. <우리는 인문학교다>는 그가 같은 지역에 사는 3명의 10대들과 시작한 인문학 공부의 결과물이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인문학교는 아이들이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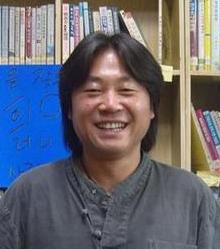 |
|
심한기(46) ‘품’ 대표
|
-인문학 전공자가 아닌데, 어렵지는 않았나? “오히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다. 수업 형식도 자유로웠다. 기존 특강사 중심의 강의에는 회의를 느꼈다. 당장 반짝하는 통합적인 지식은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삶과 연결짓는 건 힘들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현장 경험이 있었다. 커리큘럼은 없었지만 자발적 학습이 잘됐다.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다음에는 뭐를 공부해야 할지가 나오더라. 큰 틀은 역사를 중심으로 공부하되 우리의 활동과 연결짓는 것이었다.” -특별히 인문학 공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 “인문학자들이 보면 ‘무식하다’고 볼 수도 있다. 전문적인 철학이나 역사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인문학을 우리의 시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아마 어려운 이론이나 철학 등을 다뤘으면 오래가지 못했을 것이다. 인문학이 삶을 가치있게 하고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한다고 생각했다. 주로 역사 공부를 했다.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선 살아온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기 역사를 제대로 조명해 본 적이 없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처음으로 살아온 얘기들을 꺼내놓았다.”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찾는 곳이라는 편견도 강한 것 같다. “물론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책’이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언론을 통해 조금씩 알려지면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학교 수업은 소홀히 하고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 학교 교육과 분리되지 않도록 선생님과 연락도 하고 부모님의 동의도 구하고 있다. 원래 이곳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인문학교’ 수업을 계기로 하반기에는 인문학 강의도 본격적으로 할 예정이다. ‘삶을 탐구하는 인문(人文) 놀이터’라는 과정이다. 물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문화적 상상력과 인문학적 사유는 기본이다.” -청소년 시기에 인문학을 공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아이들도 공부를 했지만 나도 많은 공부를 하게 됐다. 인문학적으로 사고하고 삶을 바라보는 게 10대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자기 삶과 연결해서 하는 공부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 무엇보다 다양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 학교 교육 안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사고가 정형화되지 않으니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대학을 가든, 사회운동을 하든, 문화기획자를 꿈꾸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생긴다. 자신의 선택에 당당하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내적인 정신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것이다.” 글·사진 이란 기자 rani@hanedui.com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