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2.12.17 16:49
수정 : 2012.12.17 16:55
진명선 기자의 기사 쉽게 쓰기
나 역시 <한겨레>가 아닌 다른 신문을 읽을 때는 독자의 입장에서 읽게 되는데 제목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기사를 읽다 보면, 기사의 주제나 소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도 전에 기사가 끝날 때가 있다. 사실 그건 내가 쓴 기사도 마찬가지다. 나 역시 독자들이 진짜 궁금해할 내용, 독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내용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거나 잘 부각하지 못해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할 때가 적지 않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기자에게는 글쓰기 능력과 취재력뿐만 아니라 무엇이 독자들의 흥미를 끄느냐를 파악하는 직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즉, 왜 이 기사가 신문의 지면을 빌려 독자들에게 전달돼야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 말이다. 이 기준은 독자들의 흥미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독자들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이유가 곧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자와 후자는 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서 어느 한쪽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대전의 일반계고 학생들이 국제경영과 관련해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영어로 발표했다는 행사를 소개한 학생기자 공동기획의 경우 내 흥미를 자극한 것은, 일반계고 학생들이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반계고 학생들이 영어를 했다면 어느 정도로 유창한 것인지, 원래 영어를 잘했던 아이들이 이 행사에 참여한 것은 아닌지, 그렇지 않다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영어 실력이 얼마나 향상된 건지 등이 더 궁금했다.
또 이 기사를 쓴 기자는 대학이 직접 고등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은데, 착안을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학생들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 대학의 경우 단지 행사 장소를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교수들이 학생들을 일일이 코칭한 것 같은데, 이런 특이한 점에 대한 설명이 미진하지 않았나 싶다.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대학 주최의 행사와 다른 점이 좀 더 부각됐다면 ‘뉴스’로서의 가치가 돋보였겠다.
사실 해당 기사에 이런 내용이 빠지지 않았다.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다. 같은 내용을 언급한 단락이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표를 보면, 여기저기 배치돼 있던 문단을 한데 모을 경우 이 행사의 특징이 부각되고 메시지가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겨레> 사회부 기자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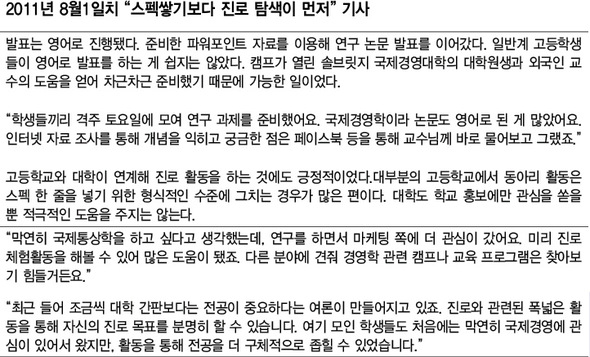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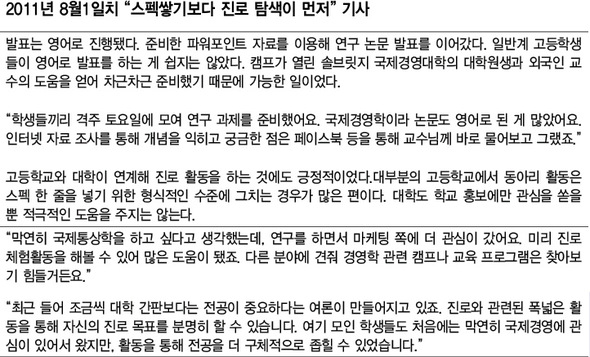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