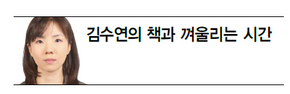 |
|
김수연의 책과 껴울리는 시간
|
[김수연의 책과 껴울리는 시간]
열쇳말 - 신(新)인간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케빈 워릭 지음, 정은영 옮김김영사 <나무>
베르나르 베르베르 지음, 이세욱 옮김, 열린책들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 오시이 마모루의 역작 <공각기동대>의 주인공 쿠사나기는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사이보그다. 인간 몸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계몸을 갖고 있지만 기계몸으로 대체되기 이전의 의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서 판단, 추론 등의 지적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보통사람과 다를 바 없이 가능하다. 비록 가상의 존재이긴 하나 쿠사나기의 탄생에는 여러 논점이 얽혀 있다. 인간 신체가 지닌 한계의 인식,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망,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이다. 상상의 산물인 쿠사나기와 달리 현실에서 사이보그가 되기를 열망하고 실제로 기계와 자신의 몸을 결합했던 사람이 있다.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의 저자 케빈 워릭이다. 케빈 워릭은 영국 레딩대학교 인공두뇌학과(사이버네틱스)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공지능, 제어, 로봇학 등을 연구하고 있다. <나는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가>는 그의 자서전적 기록으로, 인간과 기계의 결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및 동기, 결과 등을 자세히 적은 책이다. 책에는 유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자가 왜 그토록 사이보그를 열망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케빈 워릭의 아버지는 광장공포증이 있었는데, 케빈 워릭이 여덟 살 때 뇌의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나서 증상이 호전되었다. 저자는 유년기의 이 경험을 뇌를 물리적 실체로 여기고 분석적으로 접근하게 된 계기로 설명한다. 케빈 워릭은 승부욕이 강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을 즐기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교과서에 있는 지식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을 싫어했으며, 엄격한 교칙에는 암암리에 저항했다. 왜 그러한지 원인을 밝혀야 직성이 풀리고, 정해진 규칙에 얽매이는 것을 못 견디는 성격 탓이었다. 학교 공부에 흥미를 잃은 그는 대학 입학 대신 취직을 택했다. 그 후 몇 년간 순조롭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와중에도 과학 탐구에 대한 호기심은 꾸준했다. 직장에 다니는 동안 과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는 열망이 점차 커져갔고 결국 뒤늦게 대학 입시에 도전하여 22살에 대학에 입학한다. 저자의 이력은 이처럼 남다른 데가 있는데, 그런 삶의 궤적을 이끈 중요한 동력이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이다.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소설을 읽을 때도 그의 머릿속엔 ‘사이보그가 되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했다. 케빈 워릭은 사이보그를 ‘무한히 확장된 인간’으로 일컬었는데, 그 자신이 사이보그가 됨으로써 평범한 능력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기를 늘 바랐던 것이다. 그리하여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왼팔에 전자칩을 이식함으로써 스스로 사이보그가 되었다. 그의 신경망과 연결된 작은 칩은 무선신호로 컴퓨터와 교신했는데, 손가락을 움직여 신경에 자극을 주고 이로써 컴퓨터 화면의 색깔을 바꾸고 원격으로 로봇을 조종하기도 했다. 간단해 보이는 일이었지만 자판이나 원격조종장치를 손으로 누르거나 만져서 이끌어낸 결과가 아니라 단지 신경계의 변화를 통한 제어였다는 점이 혁신적이었다. 케빈 워릭은 인간이 기계와 결합함으로써 신체장애를 지닌 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새로운 소통 수단 도입으로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 또한 만만치 않다. 인간의 보편적 능력을 넘어선 성능 개선 시도는 인간성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력에 따른 불평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종교계의 비난 또한 피할 수 없다. 과연 그가 낙관하듯 인간은 기계와 결합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장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그렇다, 아니다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 연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인간 생존 조건이 확연히 변화할 것이라는 점, 케빈 워릭이 과학사의 ‘인간과 기계의 결합’이라는 장(章)에 빠지지 않고 기록될 역사적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제 케빈 워릭처럼 남다른 자유를 꿈꿨으나 전혀 다른 방식을 적용했던 다른 사람을 살펴보자. 그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에 등장한다. 작품집 <나무>에 실린 단편소설 ‘완전한 은둔자’의 귀스타브 루블레 박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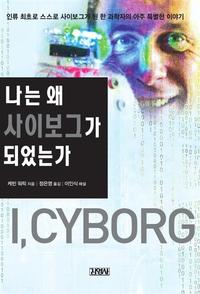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