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장룡 선생
|
63년만에 독립유공자 건국포장 받은 김장룡 선생
18살때 일제 해군서 비밀결사대 조직 체포복역중 해방맞아 석방…지금도 고문 후유증
“조국·민족 없으면 개인도 없다” 의료 봉사 “대가를 바라고 독립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항일운동 사실을 인정해 준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광복 63년만인 올해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 건국포장을 받는 생존 애국지사 김장룡(81·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선생은 13일 “할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소감을 밝혔다. 김 선생은 해방 직전인 1944년 7월 18살의 나이로 경남 진해의 일본 해군 제51항공창에 근무하면서 비밀결사대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계획하다가 일본 헌병에 체포됐다. 선생은 “당시 정치이념을 떠나 오직 나라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하숙집에서 동료들과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며 “젊은 혈기와 의지로 뭉친 동료들과 시국에 대해 논의하고 일제 군용물자 수송에 타격을 주기 위해 태업을 유도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선생은 체포 직후 재판에 회부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이듬해 해방을 맞으면서 석방됐다. 이후 세브란스 의대에 입학해 졸업한 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순천의원”을 운영해오다 2004년 은퇴하게 된다. 선생은 정부의 독립운동사 발굴작업이 본격화되던 2002년부터 친지와 동료들의 권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신청을 냈지만 복역 사실만 확인됐을 뿐 독립운동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신청이 번번이 각하됐으나 올해 독립운동 사실을 인정받아 건국포장을 받게 됐다. 63년 전 투옥 과정에서의 혹독한 고문으로 왼쪽 다리 통증에 시달려온 선생은 지팡이에 의지해 걸음을 걷고 있다.
선생은 병원을 운영할 때부터 한센병 환자치료에 관심이 많았다. 은퇴 후인 2005년부터는 일주일에 두 차례씩 경남 김해의 한 한센병 전문병원을 찾아 의료봉사활동도 벌이고 있다. 광복의 의미에 대해 선생은 “조국과 민족이 없으면 개인도 없다”며 “젊은이들이 진정한 광복의 의미를 되살려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연합뉴스
내몽골 항일운동 이자해·한인사회당 전일씨 ‘건국훈장 독립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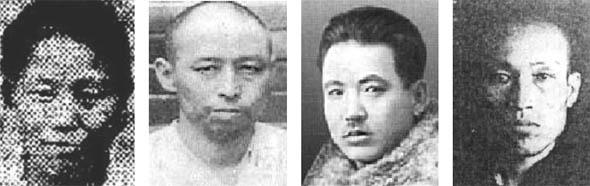 |
|
강주룡 / 박일병 / 한창길 / 민창식
|
여성 강주룡·신정균·김독실씨도 국가보훈처는 광복절 62돌을 맞아 항일 독립운동가, 순국선열, 애국지사 등 290명을 훈·포장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건국훈장 166명(독립장 2명, 애국장 26명, 애족장 138명), 건국포장 35명, 대통령 표창 89명이며, 생존자 2명과 여성 3명도 포함됐다.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이자해(1895~1967) 선생은 내몽골 지역 항일독립운동가이자 의사로, 1919년 3월 평북 중강에서 만세운동 시위를 주도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해 대한독립단에서 유격대를 훈련해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또 1926년 이후 내몽골 지역에서 국민당군 소속 군의관으로 일본군 및 친일 내몽골군과의 전투에 참가했다. 내몽골 지역에서 항일독립 운동이 확인돼 훈장이 수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역시 독립장이 서훈된 전일(1893~1938) 선생은 1919년 2월 한인사회당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9년여 옥살이를 했다. 1929년 7월 신간회와 조선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931년 평양 평원고무공장 파업을 주도하다 체포된 뒤 단식투쟁 끝에 숨진 강주룡(1901~1932, 애족장) 선생과 1920년대 이후 각종 사회단체를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한 신정균(1899~1931, 건국포장) 선생, 이화학당 교사로 서울 파고다공원 만세시위에 참가했다 옥고를 치른 김독실(1897~?) 선생 등 여성 3명도 포함됐다.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은 박일병(1893~?)·순병(1901~1926) 선생은 형제 독립운동가로, 둘 다 6·10만세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다. 형 박일병 선생은 시력을 잃어 병보석으로 출감했으며 동생 박순병 선생은 고문으로 순국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계열로 독립운동에 동참한 한창걸(1892~1938), 민창식(1899~1938)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이 각각 수여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