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아시아 지도자들에게 영어는 필수다. 2006년 5월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와 노무현 대통령의 만남. 청와대사진기자단
|
[매거진 Esc] 리처드 파월의 아시안 잉글리시7
리콴유에서 김영삼까지 아시아 지도자들의 영어 실력은
오늘날 아시아 내부의 ‘관계’는 전아시아적으로 펼쳐지기보다는 지역적으로 펼쳐진다. 이를테면 같은 아시아지만 동아시아의 불교문화권과 서아시아의 이슬람문화권은 크게 다르다. 아시아경기대회도 전대륙에 걸쳐 개최되지만, 주최국이 만든 위원회가 운영하고 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세 나라 선수단의 경쟁만이 지배할 뿐이다.
하지만 요즈음 들어 아시아의 새로운 주체성이 진화한다. 일부는 국제기구나 국가협의체를 통해서다. 아시아 58개국 등이 회원인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유엔에스갑·본부 방콕)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다.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부려쓴다. 이보다 더 지역적인 조직 유엔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UN-ESCWA·본부 베이루트)는 아랍 13국이 회원인데, 이곳의 인사 담당자들도 역시 영어 구사력을 중요한 선발 조건으로 내세운다. 8개국이 가입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의 경우, 1985년부터 영어로 정상회의를 진행한다. 이중과세에 관한 2005년 협약은 각국의 과세 서류를 모두 영어로 내도록 했을 정도다.
아세안은 유럽연합처럼 사회·경제적 통합을 지향하는 최대의 아시안 지역협의체다. 1967년 창립식 때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했다. 당시 아세안 창립 5개국 가운데 네 나라가 말레이어를 썼기 때문이다. 하지만 30년이 지나자, 말레이어는 제2언어로 내려앉았다. 지금 아세안에서 업무는 영어로 이뤄진다. 영어로는 아무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아세안+6 에너지 회담에서는 단 하나의 언어(영어)로만 문서가 작성됐다. 하나의 언어만 써야 효율적인 대화와 토론, 협상의 길을 터주고 통역으로 발생하는 각종 오해를 줄일 수 있다는 암묵적인 공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단일 언어’ 정책이 베트남 대표보다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겠지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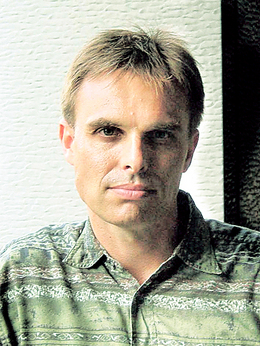 |
|
리처드 파월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