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8.03.05 18:10
수정 : 2008.03.07 16: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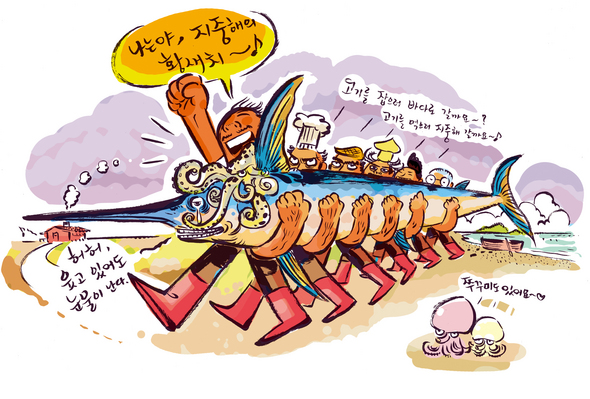 |
|
지중해의 황태자 그 낭만적 최후를 먹다. 일러스트레이션 김대중
|
[매거진 Esc] 박찬일의 ‘시칠리아 태양의 요리’
시칠리아인들의 영혼이 담겨있다는 싱싱한 생참치
부위별 해체 않고 수직으로 잘라 둥그런 스테이크 즐겨
이른 아침, 일찍 출근해서 파스타 삶을 물에 소금을 치는데 밖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주방장 주세페였다.
“로베르토오~!” 그는 어깨에 정체 모를 ‘고깃덩이’를 메고 있었다. 시커멓고 커다란 덩치의 어떤 고깃덩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물체였다. “케 코자?”(그게 뭐죠?) “논 코노쉬 톤노?”(참치도 몰라?) 거대한 황새치, 그래, 참치였다. 지중해의 황태자. 회를 먹지 않는 지중해 사람들이 거의 유일하게 먹는 횟감. 물론 구이로 더 즐기는 생선이기는 하다.
냉동참치 먹지 않고 싱싱한 생물만
참치라면 그저 깡통에 든 기름에 절인 살코기나 횟집에서 주는 붉은 살만 봤던 내게 길이가 2미터는 될 법한 참치 한 마리는 꽤 그럴싸한 볼거리였다. 가격은 꽤 비싼 편이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다. 킬로그램에 1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그것도 싱싱한 생물이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냉동 참치를 먹지 않는다. 오직 지중해에서 잡힌 짙푸른 피부의 황새치가 그들이 사랑하는 참치다. 이걸 배를 갈라 알을 꺼내 소금에 절이면 최고급 ‘보타르가’가 된다. 시칠리아 사람들이 너무도 사랑하는 요릿감이다.
시칠리아 사람들은 이 생참치를 부위별로 해체해서 먹지는 않는다. 그저 수직으로 잘라 둥그런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는다. 그러나 간혹 뱃살만 잘라 소금에 절여 횟감으로 먹기도 한다. 이게 이들이 회를 즐기는 방식이다. 올리브유를 뿌려 짭짤한 맛으로 먹는 황새치 뱃살은 꽤 먹을 만한 요리다.
시칠리아 식당 ‘파토리아 델레 토리’의 주방장 주세페는 참치야말로 시칠리아 사람들의 영혼이 담긴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눈을 치켜뜨고 제법 잘생긴 이마를 내게 들이밀듯 얘기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고는 이탈리아 사람 특유의 손동작인, 손을 연신 아래위로 흔들며 내게 대들듯이 말하곤 했다.
“시칠리아 사람들이 고기를 양껏 먹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아. 내 어렸을 때는 기껏해야 사냥한 토끼나 드물게 양고기가 고작이었지. 거의 매일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했어.” 우리네와 너무도 닮은 삶을 살았던 시칠리아 사람들. 그런 주세페가 먹을 수 있었던 ‘붉은 살코기’는 참치였다. 참치의 붉은 살이 그나마 육고기다운 고기였던 것이다.
 |
|
시칠리아 어부들이 참치를 잡는 모습. 참치잡이배는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박찬일
|
황새치는 지중해에서 아주 귀한 생선이었다. 양이 적지는 않았지만 잡는 데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참치잡이 배는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마치 <모비딕>의 숙련된 작살 기술자처럼, 참치잡이 배도 기술자가 필요했다. 요즘은 주로 주낙을 달아 잡아채지만, 과거에는 그물을 걸어 참치를 유인한 다음 재빨리 작살로 꽂아 건져 올려야 했다고 한다. 구릿빛으로 물든 사내들이 건강한 팔뚝을 휘두르며 참치를 찍어 올리는 광경을 상상해 보라. 나는 지중해, 곧 대륙 사이의 바다라는 뜻의 ‘메디테란’이란 낱말을 생각하면 늘 지중해의 참치잡이가 생각난다. 억센 시칠리아 남자들의 기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광경이 아니겠는가.
경쟁적 조업으로 씨가 마르는 형편
사들인 참치는 따로따로 해체해서 요리를 만들어 판다. 그 중 수직으로 자른 스테이크가 가장 많이 팔리는 요리다. 바쁠 때는 하루 저녁에 그 거대한 녀석을 반 마리까지 팔아봤으니까. 물론 아무 때나 있는 메뉴가 아니다. 특별히 좋은 가격에, 싱싱한 놈을 건지면 특별 메뉴로나 팔 수 있는 거다. 300그램 정도를 달아 날카로운 칼로 자르면 칼 표면에 기름기가 사악 밴다. 그만큼 싱싱하고 좋은 물건이다.
이걸 그릴에 올려 재빨리 앞뒤로 굽는다. 너무 익히면 퍽퍽해서 먹을 수 없다. 스테이크로 치면 미디엄 레어나 레어 정도로 굽는다. 속이 차가운 기운을 버릴 정도만 되면 맛있는 참치 스테이크가 된 거다. 소금을 넉넉히 치고 최상급의 올리브유를 뿌려 내면 된다. 어떤 장식도, 곁들임도 없다. 수직으로 잘랐기에 부위별로 각각 다른 맛과 영양을 즐기는 것이다. 맛을 더하려면 시칠리아 원산의 어른 주먹만한 레몬을 잘라 즙을 뿌려 먹는다.
이 지역의 참치도 요즘은 씨가 마르고 있다. 지중해를 둘러싼 나라가 어디 이탈리아뿐이냔 말이다. 가까이 프랑스와 스페인, 포르투갈과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기에 북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 고급 기술로 무장하고 참치잡이에 나서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었다. 수요가 많기도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사람들이 워낙 참치를 좋아해서 수출용으로들 많이 잡는다고 한다.
참치 말고도 시칠리아의 멋진 재료로 오징어가 있다. 오징어뿐이랴. 낙지·주꾸미·문어·꼴뚜기·갑오징어·한치 …. 두족류와 연체류가 모두 있다. 이탈리아와 한국 요리의 공통점은 이런 요릿감에서 더 빨리 찾을 수 있다. 요리법은 사뭇 다르지만 재료의 유사성은 두 나라의 친근함을 발견하게 되는 동기가 되곤 한다.
오징어가 들어오면 주세페는 오징어 순대를 만든다. 함경도식은 아니지만, 빵가루와 채소를 채워 넣고 오븐에 구워 순대를 만든다. 작은 오징어 한 마리에 15유로를 받는다. 한국 오징어 순대가 얼마나 맛있고 값싼 요리인지, 감사하게 먹어야 할 게다. 시칠리아에 오징어가 흔하지만 결코 값싼 재료는 아니기 때문이다. 킬로그램에 1만5천원은 줘야 싱싱하고 질 좋은 놈을 살 수 있다. 한국은 고작 2천원이면 살 수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가 말이다.
오징어 순대에 주꾸미·문어도
주꾸미가 흔한 재료는 아니다. 한 마리를 요리해서 10유로 정도를 받는다. 만만찮은 값이다. 그래도 귀한 재료이니 맛있게들 먹는데, 사실 한국 주꾸미의 야들야들한 맛은 없다. 좀 질기고 연한 맛이 적다. 누군가 오징어나 주꾸미를 한국에서 수출하면 아마도 큰돈을 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시칠리아를 여행하다가 참치나 오징어 요리를 발견한다면 그 진한 바다의 맛을 즐겨보시라. 여기에 시칠리아산 화이트 와인 한 잔을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자글자글한 태양빛을 듬뿍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는 시칠리아 화이트 와인은 세계적인 명품이다.
박찬일 뚜또베네 주방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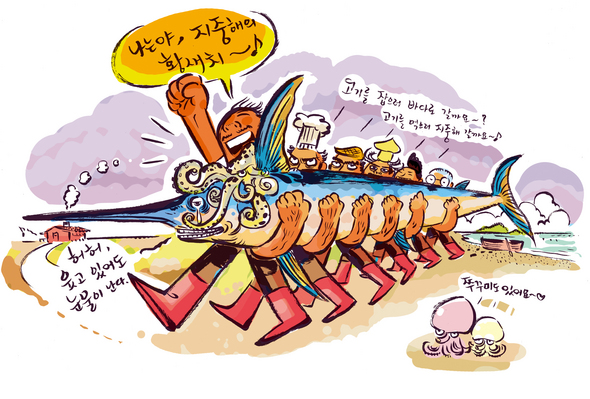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