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2008)
|
[매거진 esc] 김중혁의 액션시대
올림픽이 며칠 남지 않았다. 시작 전부터 이래저래 말이 많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설렌다. 올림픽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시절이 있다. 1996년의 애틀랜타 올림픽 때였다. 내 나이 26살이었고, 군에서 막 제대한 후였고, 집에서 밥이나 축내던, 이른바 백수 시절이었다. 무언가 열심히 시도하지만 되는 것은 별로 없던 시절이었다. 나는 올림픽 기간을 휴가로 생각했다. 올림픽 기간 동안은 아무 생각 하지 않고 열심히 놀기로 했다. 밤에는 열심히 경기를 보았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있으면 목이 터질 만큼 큰 소리를 치는 심정으로 혼자서 조용히 응원했고, 한국 선수들의 경기가 없으면 아무 팀이나 응원했다. 낮에는 주로 잤다. 초저녁에는 하이라이트나 재방송을 보았다. 내 기억에 그해 여름은 꽤 더웠다. 에어컨도 없는 방에서 열을 내며 올림픽을 보기가 힘들었다. 우리 집 2층에는 작은 마당이 하나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조였다. 나는 방에 있던 대형 텔레비전을 마당으로 들고 나왔다. 그리고 돗자리를 깔고 모기장을 쳤다. 제법 시원했다. 1층에서 몰래 들고 올라온 수박도 먹었다. 부모님들은 1층에 있었고, 주로 나 혼자 2층에서 밤새 올림픽을 보았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경기는 육상이었다. 100미터, 200미터, 400미터, 1만미터, 110미터 허들, 이어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장대높이뛰기, 창던지기, 마라톤 같은 경기를 보고 있으면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과 근육과 표정을 보고 있기만 해도 재미있었다. 마지막 코너를 달리는 선수의 휘어진 몸, 부러질 것 같은 장대를 딛고 하늘로 높이 솟구쳐 오르던 선수의 종아리, 도약대를 밟고 하늘로 날아오른 넓이뛰기 선수의 튀어나올 듯 벌어진 가슴, 스치듯 허들을 지나가는 선수의 뒤꿈치, 마지막 5킬로미터를 남겨둔 마라톤 선수의 두 손…. 올림픽이 끝나고 기억 속에 남은 건 이런 장면들이었다. 선수들의 몸이 올림픽의 이야기였다. 머릿속을 텅 비우고, 근심 없이 선수들의 몸을 보면서 나는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젠 밤새도록 경기를 볼 시간도 체력도 없지만 여전히 올림픽이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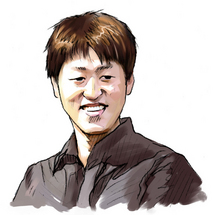 |
|
김중혁의 액션시대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