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지난 6일 오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연구실에서 만난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자신의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설에 대해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청와대 안에선 그의 복귀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뉴스 쏙]
청와대 일각, 미래기획위원장 내정설에 ‘떨떠름’
실세 귀환 견제심리…정작 본인은 “급할 것 없다”
‘이명박의 남자’ 곽승준(48)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돌아온다. 오는 11월 말이나 연말·연초로 예상되는 개각 국면에서 청와대로 재입성하리라고 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만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안병만 미래기획위원장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옮기면서, “이런 건 젊은 사람이 해야 한다”며 곽 전 수석을 후임 미래기획위원장으로 점찍고,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통해 본인에게 통보까지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저런 사정이 겹치면서 임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곽 전 수석은 고려대 경제학과의 가을학기 강의를 맡았다.
하지만 광화문 케이티빌딩 12층에 있는 미래기획위원장 책상은 석달째 얌전히 비어 있다. 자리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때마침 곽 교수는 내년 1년간의 안식년에 들어간다.
기자는 곽 전 수석을 만나 대놓고 물었다. 그는 “급할 것 없다”며 청와대 복귀에 손사래를 친다. “밤낮 없는 생활을 접고 2년 만에 밀린 책도 보고, 골프도 치면서 자유를 즐기고 있다. 일단 학교 강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에서 나온 뒤, 2~3년 후 한국을 업그레이드할 방법이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려 놔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곽 전 수석의 복귀가 가까와지면서, 청와대에서는 권력다툼 예고편 성격의 미묘한 기류들이 벌써부터 감지된다.
청와대 사람들 상당수는 그를 두고 “능력있고 미래기획위원장에 적임자”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다는 이가 많다. 속마음을 캐묻자 한 관계자는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복귀해서 또다시 무리한 정책 드라이브로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지 않겠냐”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일단 복귀시켰다가 나중에 천천히 승진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떨떠름하게 말했다.
이런 부정적 기류의 이면에는 곽 전 수석이 다시 ‘실세’의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 하는 견제심리가 깔려 있다. 이 대통령과 함께 지낸 기간으로만 따져보면 그는 대통령실장 이하 수석비서관들 가운데 최고참이 된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01년부터 돕기 시작해,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연구원(GSI) 정책기획실장을 맡아 대선 공약을 총괄했다. 경선 때는 캠프 정책본부장, 본선 때 선대위 정책기획팀장을 맡아 한반도 대운하,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등 핵심 공약을 주도해, 이 대통령의 철학과 정책을 가장 잘 꿰는 인물로 꼽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집 나갔던 주인집 아들이 돌아온다는데 반길 사람이 많겠냐”며 “곽 전 수석으로 인해 자기 권한이나 지위가 좁아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가 오는 것은 싫고, 복귀를 막을 수는 없고, 한마디로 떨떠름해 하는 분위기”라고 전하면서 “그가 돌아오면 관전 포인트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고위인사는 곽 전 수석의 복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며 말을 돌렸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대화’ 5년 후 그때 검사들 “노 너무 몰아 붙였다” “MB 마음 놓인다”
▶ 일본 노벨상 떠들썩, 한국 논문 표절 국제망신
▶ 여의도가 살빠졌나? ‘크기’가 왜 줄었지
▶ 서울보다 비싼 베이징 한국산 라면
▶ “미국 못믿어” 금융불안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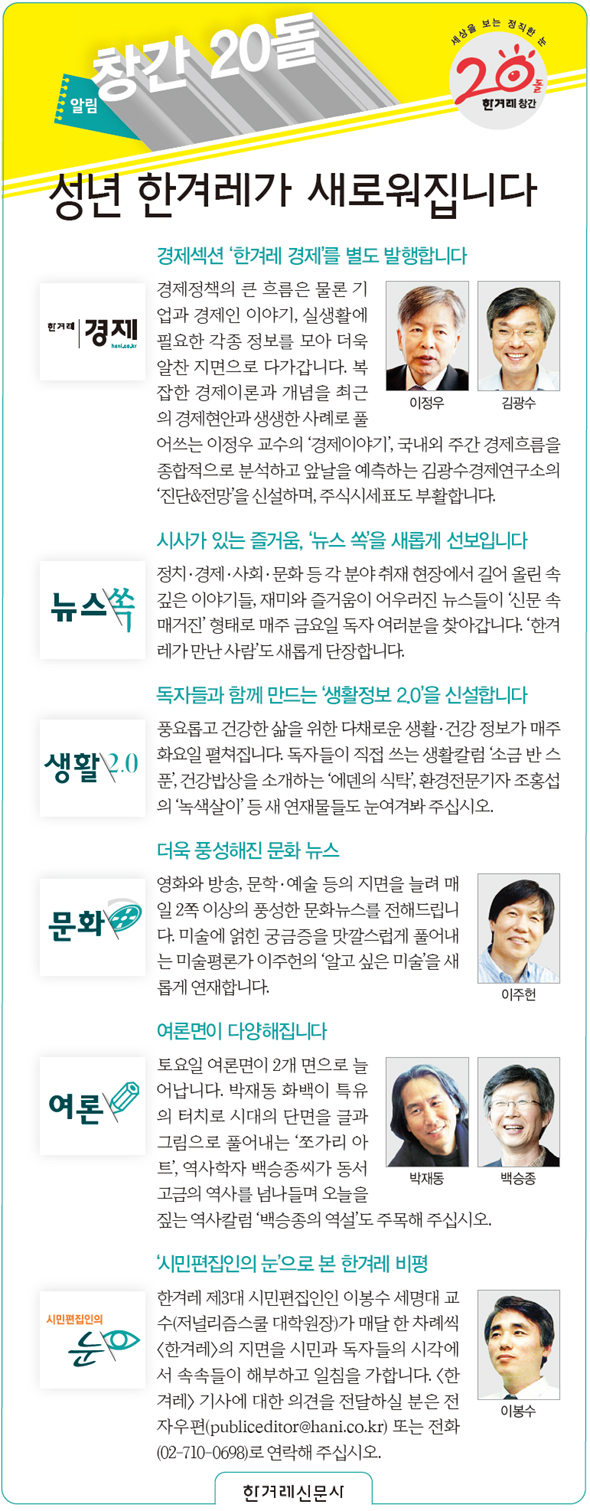 |
|
한겨레가 새로워집니다
|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