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여름 콩밭, 안 매봤음 말을 말어
|
[건강한 세상]
마을이야기 변산공동체 ⑥ 윤구병 선생님이 공동체를 만들면서 세운 농사원칙이 몇 가지 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다.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이 들어간 사료를 먹인 축사에서 나온 퇴비를 쓰지 않는다. 비닐을 쓰지 않는다. 고추·양파·배추 등 돈이 되는 작물보다는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쌀·보리·밀·콩 등 식량작물 중심으로 농사를 짓는다. 모내기도 끝났고, 보리·밀도 식구들이 낫으로 베어서 요즘은 보기 힘든 옛날 탈곡기로 탈곡까지 끝냈다. 이제 밭매기를 할 때다. 풀밭이 아닌 땅에 씨를 뿌리고 자랐으면 소먹이도 되고, 나름 아름다운 풍경을 뽐내며 사랑받았을 텐데 밭으로 들어온 순간 눈엣가시요, 있어서는 안 될 미운털이 잔뜩 박힌 잡초가 되고 만다. 마을 어른들은 풀을 징그럽다고 하고 원수 보듯이 한다. 눈에 띄는 대로 바로 뽑아내거나 농약을 쳐서 풀이 얼씬도 못하게 만든다. 공동체는 어떨까? 어떤 이는 <잡초는 없다>는 책을 내서 쏠쏠하게 재미를 봤지만 잡초가 없긴 왜 없나? 밭 여기저기에 널린 게 온통 잡초인데. 공동체 초기에는 밭농사가 잡초농사였다. 밭은 넓고 농사일은 처음이라 풀을 잡는 법을 몰랐다. 작물과 풀이 함께 자랐고, 콩이나 고추보다 풀이 더 커버려 콩밭인지 풀밭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공동체에 일손 도우러 온 손님한테 점심때 먹을 고추를 따 오라고 했는데 고추밭을 찾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었다. 밭매기는 웬만한 인내심이 아니면 견디기 힘든 일이다. 특히 골반 미발달로 쪼그려앉기에 젬병인 남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공동체 젊은 총각들. 처음에는 ‘이까짓 거 뭐’ 하며 달라붙어 열심히 맨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리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고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자주 쉰다. 담배 피우는 횟수도 늘어난다. 두어 시간 지나면 무릎과 허리는 점점 더 아파 오지, 한여름 땅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숨 막히게 만들지, 땀은 뚝뚝 떨어지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이때부터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서서 매는 편한 방법은 없을까? 다른 할 일 없나? 밭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딸깍이’ ‘풀밀어’라고 서서 풀을 매는 유럽에서 들어온 농기구가 있는데 딸깍이는 풀이 커버리면 별 쓸모가 없다. 풀밀어는 큰 풀도 맬 수 있지만 이 또한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나 우리 조상의 지혜가 듬뿍 담긴 호미가 최고다.콩밭은 넓기도 하다. 땀을 뻘뻘 흘려가며 죽어라고 매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려면 아직 멀었다. 대충 하다가 공동체에서 밭 잘 매고 엄하기로 소문난 우리 마누라한테 걸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는다. 이제 아예 땅바닥에 주저앉아 밭을 맨다. 어떤 남자 손님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드러누워 일하다가 혼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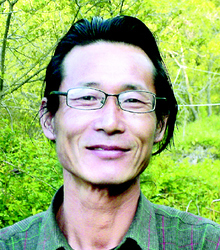 |
|
김희정 변산공동체 대표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