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0.11.30 08:59
수정 : 2010.11.30 08: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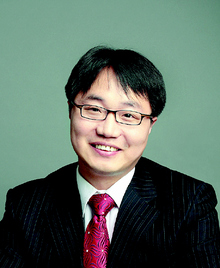 |
|
서천석 소아정신과 전문의·서울신경정신과 원장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전에 끝났다. 아직 시험을 치기에는 십수년이 남았을 부모에게도 수능이란 중요한 관심사다. 엄마들은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에게조차 힘들어도 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 아이에게 자세를 잡게 하고, 학습지와 책을 들이민다. 어떤 아이는 엄마의 말투를 흉내 내서 ‘세상에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고생 안 하고 살려면 해야죠’ 하고 고개를 숙인다. 그런 아이를 대견하게 보는 엄마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마음이 아득해진다.
공부는 정말 괴로운 것일까?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힘이 들 수는 있다. 그렇지만 힘든 것과 괴로운 것은 다르다. 괴로움을 이겨야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의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를 돌아볼 때 공부가 괴롭지만은 않았다. 물론 암기가 힘들고 짜증날 때가 많았고 시험을 앞두고는 한정된 머리에 뭔가 욱여넣는 느낌에 질리곤 했다. 과도한 긴장감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뭔가 더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전에는 안 되던 것을 하게 될 때 쾌감도 있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성장을 인정받는다는 뿌듯함도 좋았다.
우리 사회에는 수능은 이미 오래전에 끝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어른들도 많다. 공부를 업으로 삼는 분들도 있고, 자기 분야에서 발전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분들은 더 많다. 이들은 공부의 괴로움을 참는 보상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일까? 과문한 탓인지 별로 그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름 즐겁게 책을 읽고 연구를 한다.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해진 시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놓지 못하는 분들이다.
내가 만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은 공부를 싫어하지 않는다. 강요되는 분위기가 싫을 뿐이고,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싫을 뿐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발전을 원한다. 못하던 것을 하기를 원하고, 모르는 것을 알기 원한다. 아이들은 호기심과 도전의식에서는 어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이처럼 발전을 원하는 아이들을 대개는 어른들이 망가뜨린다. 우선 어른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아이가 발전하기를 요구한다. 만만하게 느껴져야 도전하는 아이의 본성을 모르고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한다. 시범도 보이지 않고, 모방할 기회도 주지 않고 알아서 잘하라고 요구한다. 완벽한 부모의 시범으로 아이를 기죽이기도 한다. 어른들이 계획한 대로 안 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돌려준다. 전반적으로 잘해낸 것은 원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고, 조금 부족한 세부 사항에 대해 지적한다. 더 잘하라고 하는 질책이지만 아이는 그 순간 공부의 괴로움을 배운다.
공부는 첫 기억이 중요하다. 첫 기억이 괴로울 때 오래 즐겁게 하기는 어렵다. 공부를 시작한 지 1~2년이 지나면 공부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쉽지 않다. 요즘 자기주도학습이 유행이다. 그러나 자기주도학습의 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을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한다.
소아정신과 전문의·서울신경정신과 원장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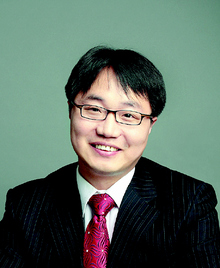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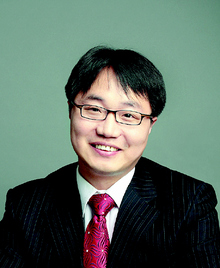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