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C+Y의 자전거 타고 핀란드 한바퀴
|
[esc] C+Y의 자전거 타고 핀란드 한바퀴
④ 12시간 술냄새 진동하는 기차 타고 북극권의 케미예르비에 들어섰다
우리는 자전거 여행 대신 12시간의 기차 여행으로 훌쩍 북극권을 넘기로 했다. 기차는 이위베스퀼레에서 탐페레를 거쳐 북극권 이북의 종착역인 케미예르비로 향한다. 긴 여정이지만 우리는 젊음의 용기(혹은 가난)로 침대칸이 아닌 좌석을 예약했다. 자전거를 싣고 앉자마자 피곤이 몰려든다. 하지만 기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왠지 들떠 있다. 모두들 커다란 꾸러미에서 주섬주섬 자신이 준비한 비장의 총알을 꺼내 들었다. 기차가 출발함과 동시에 그들의 파티도 출발한다.파티의 1막. 노을 지는 풍경이 아름답다. 아주 늦은 시간에 출발한 야간열차지만 밖은 이제야 노을이 지려 한다. 금빛 호수를 바라보는 여행자를 뒤로하고 그들은 준비한 술과 함께 축제를 벌인다. 한바탕 노을 축제가 벌어진다. 해는 질듯 말듯 한 채 붉은빛을 뽐낸다. 또다시 여행자는 지지 않는 해를 바라보다 잠이 든다.
 |
|
케미예르비 외곽에 위치한 트레킹 코스에서 만난 호수. 호수가 되려다 만 웅덩이들 사이로 발판이 놓여 있다.
|
2막. 새벽 2시. 대낮처럼 밝은 기차 안을 누비는 쉬 마려운 핀란드인들의 발소리에 잠이 깬다. 이곳에서 야간열차를 타는 승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침대칸 이용 승객: 야간열차에서 잠을 자려는 사람
좌석칸 이용 승객: 야간열차에서 술을 마시려는 사람
그렇다. 우리가 잠을 자고자 했다면 실수도 보통 실수가 아니다. 눈을 뜨자 맞은편 승객과 눈이 마주친다. 우리가 곯아떨어진 틈을 타 동양인 여행자가 신기해 뚫어져라 쳐다보는 핀란드 젊은이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것 같지만 브래드 핏이 울고 갈 외모에 다시 눈을 감아 준다. 마음껏 보세요.
3막. 한풀 꺾인 듯한 소리에 눈을 떠 보니 파티장은 폐허로 변했다. 좌석 아래 비치된 휴지통에는 핀란드의 술병이란 술병은 다 꽂혀 있는 듯하다. 라플란드의 유명 도시인 산타마을 로바니에미를 지나는 동안 많은 승객들이 내렸나 보다. 출출해진 속을 달래러 식당칸으로 향한다. 식당칸의 문을 열자 이상한 기운이 돈다. 이런… 맙소사… 여기 다 모여 있었구먼. 식당칸에는 얼굴이 발그레한 승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스낵과 맥주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3막의 끝이 보인다. 오전 10시, 기차는 종착역인 케미예르비에 도착한다.
밤새 마신 사람들 어디 갔나 했더니, 식당칸에서 또 마셔
일요일 오전의 케미예르비의 시내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를 방불케 한다. 핀란드 야간기차클럽에서 12시간 동안 앉아 온 것이 많이 피곤했는지 만사 제치고 숙소부터 찾았지만 가이드북에 소개된 몇몇의 숙소는 예상대로 문이 굳게 닫혀 있다.(핀란드에서는 서비스업도 주말에는 쉬거나 영업시간을 축소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며 호텔리(Hotelli)라는 글귀만 보고 찾아간 호텔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케미예르비를 대표할 것만 같은 이름의 호텔(Hotelli Kemij<00E4>rvi)에 도착한다. 영어에 전혀 관심이 없으신 할아버지와 손짓, 발짓 곁들인 끝에 80유로와 방 열쇠를 교환한다. 방으로 들어가 묵은 피로를 씻어내고 곧바로 잠이 들었다.
 |
반나절 만에 작은 시내를 둘러보고 숲과 호수의 나라의 절반을 맛보기 위해 트레킹에 나섰다. 가장 가까운 트레킹 코스는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 거리에 있다. 입구에 위치한 안내판을 보니 넉넉히 2시간 정도면 천천히 돌아볼 수 있는 길이다. 빼곡하지만 황량한 느낌의 숲길은 이곳을 오고간 사람들의 은근한 흔적을 따라 이어진다. 트레킹 코스를 표시하는 별도의 시설물은 없다. 왠지 ‘길을 잃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쯤 나무에 묶인 오렌지색 리본이 나타난다. 케미예르비가, 아니 어쩌면 아직 미처 돌아보지 못한 라플란드 전체가 이렇게 고요한 곳일까. 숲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이상한 나라로 빠져드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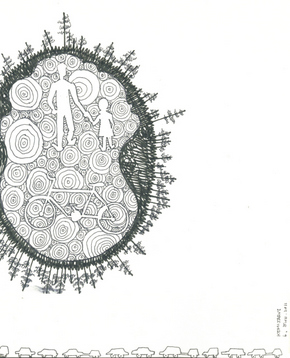 |
결국 그리워 찾는 것은 변하는 것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하지만 이내 나는 이 고요한 숲에 엄청난 훼방꾼이 있음을 깨닫는다. 모기떼. 핀란드의 숲은 호수가 되려다 미처 꿈을 이루지 못한 많은 웅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웅덩이들이 모기들이 번식하기에 안락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기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하다. 수직으로 뻗은 빼곡한 나무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귓가에 맴도는 모깃소리. 이 아름다운 숲의 주인은 모기인 듯하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호수를 만났다. 온통 붉은빛의 풀들과 이끼가 호수 주변을 뒤덮고 있다. 호수 위를 불어온 바람은 감상의 훼방꾼, 모기들을 쫓아준다. 찰랑이는 물결과 함께 잠시 동안의 평화가 찾아온다. 숲에서 만나는 호수는 이렇게 여행자의 도피처가 된다. 빠르게 흘러가는 핀란드의 구름처럼 숲 밖의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찾는 것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이 숲이 관광지로 변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숲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시내의 공공도서관에 들렀다. 아직도 한창인 햇빛이 도서관 복도에 스며든다. 언제부터인가 어느 동네를 가든지 항상 그곳의 도서관을 들르게 된다. 핀란드의 도서관 자체의 분위기가 나를 이곳으로 이끄는 것 같다. 어떤 이유에선지 모르겠지만 핀란드의 도서관들은 느낌이 굉장히 상쾌하다. 넓은 창과 목조 건축 특유의 따뜻함일까. 계속 머무르고 싶은 느낌, 한참을 머무르며 몇 권의 책이라도 읽어내고 싶은 느낌이다. 호텔로 돌아가는 밤 11시, 해가 지려고 하는 느낌이다. 아직 밝은 거리에 사람들은 또다시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여전히 낮이지만 이곳은 다시 깊은 잠에 빠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글·사진 윤나리/디자이너·그림 조성형/디자이너
| |














![[카드뉴스] ‘떡볶이’ <br> 여기가 최고](http://img.hani.co.kr/imgdb/main2arti/2014/1128/1427370861_141714014683_20141128.jpg)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