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9 19:28
수정 : 2018.06.18 1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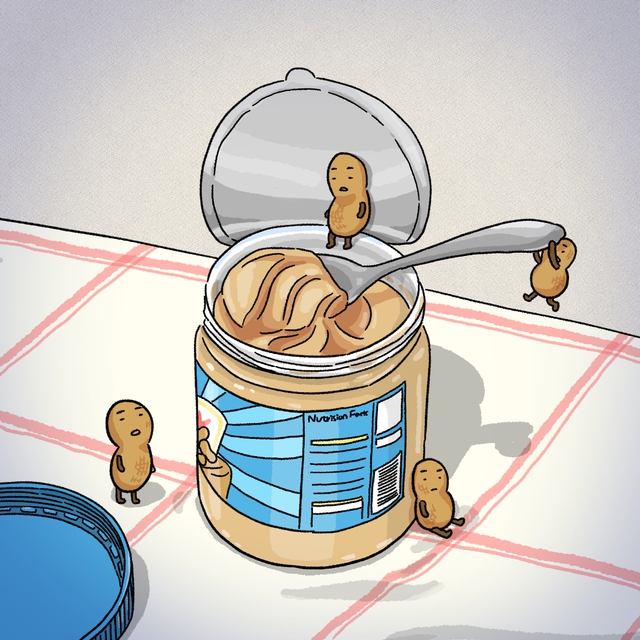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
|
김보통 그림
|
[ESC] 보통의 디저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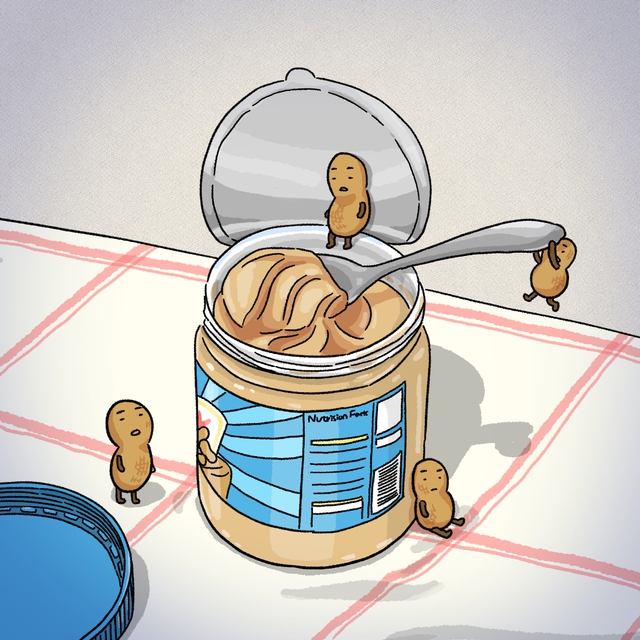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
|
김보통 그림
|
“큰아빠 집에 가서 살래?”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다. 일곱 살쯤이었다. “돼지고기, 매일 먹을 수 있고, 컴퓨터에 새 옷도 사 줄 거야.” 경찰관인 큰아버지는 큰어머니와 누나 셋과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 집은 아들만 둘이니 양자로 가라는 얘기였다. 그것이 아버지 혼자만의 생각인지, 큰아버지와 논의가 된 것인지는 모른다. “네 방도 생길 거야.” 큰아버지 댁은 차고와 마당이 딸린 이층 단독주택이었다. 누나들은 모두 각자의 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고도 안 쓰는 방이 남아 있었다. 우리 네 가족이 창문도 없는 골방에서 더부살이하던 때였다.
“땅콩버터도?”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큰집엔 언제나 땅콩버터가 있었다. 숟가락으로 떠먹어도 혼내지 않았다. 입안 가득 퍼지는 꾸덕꾸덕한 고소함이 좋았다. 우리 집엔 땅콩버터는커녕 흰 버터도 없었기에 더욱 그랬다. “응. 땅콩버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아버지는 큰아버지를 미워했다.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아버지 대신이었던 형이 자신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았다며 원망했다. 그래서 자신이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고, 제대로 직장을 얻지 못했으며, 때문에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여겼다.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스스로도 ‘어리석었다’고 회상했지만 그랬다. 혼자 마음속으로 의절한 채 오래도록 교류 없이 지낸 것은 그런 이유다. 다시 큰집을 오가게 된 것은 내가 태어난 뒤라고 어머니를 통해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형제의 관계는 서먹해 웃으며 대화를 나누거나 하진 않았다.
큰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언제나 반겼다. 내색을 하지는 않았지만 퇴근길에 비닐봉투 가득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같은 것을 잔뜩 사들고 왔기에 알 수 있었다. 반찬으론 늘 갈비가 나왔다. 배가 터지게 밥을 먹고, 아이스크림을 까먹으며 큰누나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면 큰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는 척 바라보았다. 항상 그랬다. 내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밥을 먹을 때, 큰누나 방에 들어가 피아노를 치거나 하는 동안 큰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보지 않는 척 보고 있었다. 특별한 말을 하진 않았다. 간혹 옆에 앉아 있노라면 말없이 손을 들어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큰아빠는 아들이 없어서 너희가 보고 싶은 거야”라고 아버지는 종종 말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아버지가 내심 우쭐한 것처럼 보였다. 그토록 미워하던 형이 가지지 못한 것을 둘이나 갖고 있음에(실제 형이 그것을 원했는지 어땠는지와 별개로)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나를 큰집에 양자로 보내려던 생각 역시 그런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집에도 올 수 있고?” 나는 가는 쪽으로 살짝 마음이 기울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지. 어때? 큰아빠네서 살 거야?” “그러지 뭐” 나는 답했다. 워낙 어렸기에 별생각은 없었다. 그저 땅콩버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나쁘지 않다 싶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해 양자로 가진 않았다. 내심 아쉽기도 했다. 가끔 내 방에서 새 옷을 입고 땅콩버터를 먹는 삶에 대해 때때로 상상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큰아버지가 임종을 맞이하던 날. 아버지는 짐승처럼 울었다. 비명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다. “아직 화해를 못했는데”라며 아버지는 아쉬워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오해로, 혼자 미워하고 있었을 뿐 큰아버지는 아버지를 용서한 지 이미 오래였다. 아버지는 내내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긴 시간 큰아버지가 물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던 것은, 때때로 손을 들어 어색하게 쓰다듬던 것은, 다 먹지도 못할 아이스크림을 잔뜩 사들고 맞이한 것은 내가 아니었다. 당신이 가지지 못한 아들이 아니었다. 그건 어린 시절 원하는 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그래서 오래도록 형을 원망하며 살아왔던, 끝내 웃으며 마주하지 못했던 동생이라는 것을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김보통(만화가)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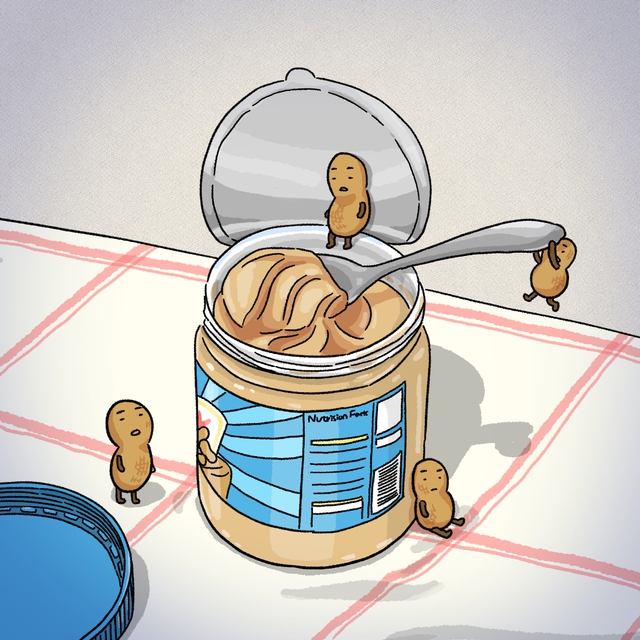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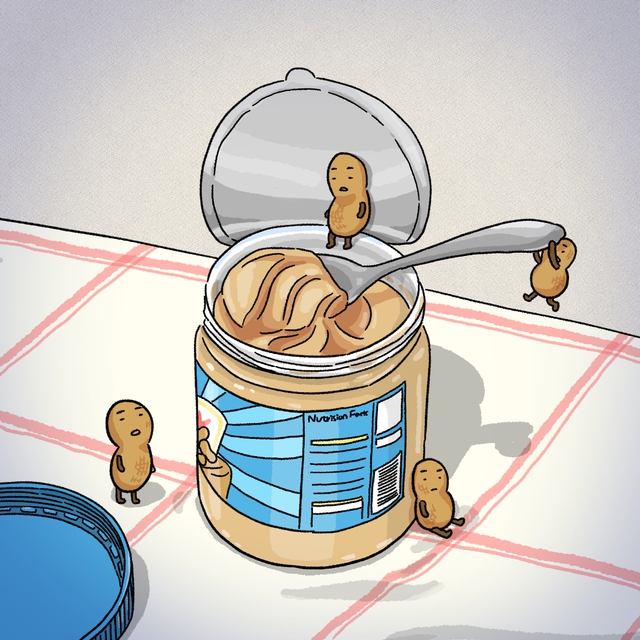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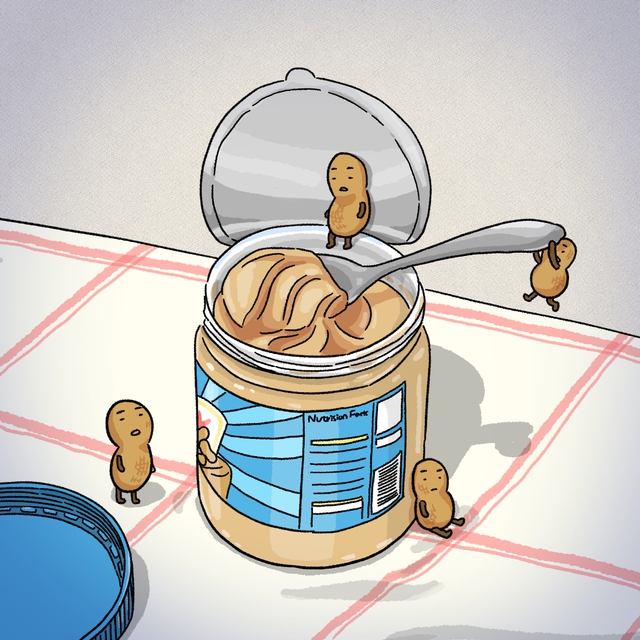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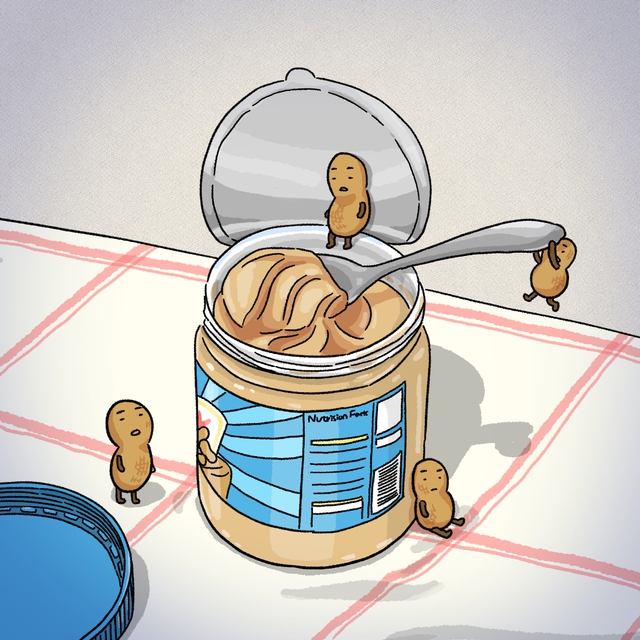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