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5.07.29 18:35
수정 : 2015.07.29 20:49
윤형중 기자의 풀카운트
어제는 트로이 툴로위츠키, 오늘은 조너선 패펄본이 옮겼다. 로키산맥에서 호령하던 최고 타자 툴로위츠키가 28일(한국시각) 콜로라도에서 토론토로 트레이드됐고, 통산 337세이브를 기록한 최고의 마무리투수 패펄본은 29일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으로 갔다. 지난해 클레이턴 커쇼와 사이영상을 다퉜던 조니 쿠에토는 지난 27일 신시내티를 떠나 캔자스시티에 둥지를 틀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트레이드 마감시한인 7월31일을 앞두고 선수 맞교환이 한창이다.
한국 프로야구의 트레이드 마감시한도 7월31일이다. 올해 한국 프로야구는 시즌 중 선수간 트레이드가 6번 있었다. 34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팀에서 방출(웨이버 공시)한 선수가 다른 팀으로 옮기는 ‘웨이버 트레이드’를 제외하면, 올해 시즌 중 트레이드가 가장 많았다. 2001년과 2003년에 올해와 마찬가지로 6번의 트레이드가 있었다. 올해 마감시한을 앞두고 추가 트레이드가 나온다면 역대 최다 트레이드 기록을 세운다.
한국 프로야구는 그동안 트레이드가 활발한 리그가 아니었다. 1980년대 최동원-김시진, 1990년대 양준혁-임창용 등 대형 트레이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간판급 스타들의 트레이드에는 대개 모기업의 재정 악화나 선수협 활동으로 밉보인 선수 방출 등의 다른 배경이 있었다. 구단들이 트레이드를 주저하는 이유도 여러가지다. 팀의 간판선수를 내보내면 팬들이 외면할 수 있다. 어렵사리 양 팀이 조건을 맞춰 트레이드가 성사되더라도, 내보낸 선수가 나중에 큰 활약을 펼치면 두고두고 비난의 대상이 된다. 엘지 구단은 박병호, 김상현, 이용규, 서건창 등을 트레이드하거나 방출해 아직도 ‘탈지효과’(탈엘지의 뜻)라는 조롱 섞인 비난을 팬들로부터 받고 있다.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선 각 구단이 더 적극적으로 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간 신생팀 엔씨와 케이티가 보여준 행보만 봐도 그 이유는 분명하다. 꽤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던 엔씨와 케이티는 빠르게 1군 무대에 적응했다. 특히 케이티는 올 시즌 3건의 트레이드로 팀 전력을 크게 강화했다. 활발한 트레이드는 선수들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화의 이성열과 허도환, 이종환, 케이티의 오정복, 하준호, 장성우 등은 트레이드 이후 경기 출전 기회가 늘었다.
현금이 오고가 부정적으로 비치는 트레이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과거 우리 히어로즈가 장원삼, 이현승, 이택근 등을 현금만 받고 팔았던 형태의 ‘현금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트레이드 카드를 맞추다가 손해를 보는 쪽에 현금을 보조하는 것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지금은 한쪽이 불리하면 바로 협상이 결렬되는데, 교환 조건의 여지를 넓혀야 한다. 트레이드가 활성화되면 에프에이(FA) 계약금액이 치솟거나, 검증이 되지 않은 외국인 선수를 큰돈을 들여 영입하는 일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윤형중 기자
hjyoon@hani.co.kr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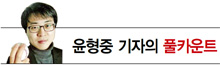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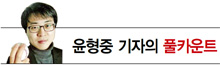
기사공유하기